중국건축
다른 표기 언어 Chinese architecture , 中國建築목차
펼치기-
궁전 본위 중국건축
-
목조 본위 중국건축
-
평면 구성
-
배치방식
-
구조형식
-
지붕형태
-
세부 수법
-
채색장식
-
역사
- ┗ 기원
- ┗ 가장 오래된 주거지
- ┗ 은대(殷代)의 비약
- ┗ 서주시대(西周時代)의 공헌
- ┗ 춘추전국시대의 경쟁
- ┗ 진(秦) 시황제(始皇帝)의 통일
- ┗ 한대의 진보
- ┗ 육조시대
- ┗ 수·당 시대
- ┗ 5대와 송 이후
중국건축은 주로 목조 본위이고, 평면은 직4각형이나 정4각형으로 단순하며, 기둥은 바둑판처럼 질서있게 세운다. 건물들은 남쪽에서 북쪽까지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중심축을 설정하여 배치하는데, 주요건축물은 이 축 위에 남향으로 세운다. 부차적 건축물은 주요건축물의 앞뜰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에 대칭으로 세운다.
중국건축은 지반 위에 기단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주춧돌을 놓으며,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형태가 많다. 기단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전통이다. 기둥 사이에 벽이나 문 등을 만드는 경우에도 기둥 위쪽에 기둥 사이를 가로로 연결하는 목재를 두른다. 그 위에는 두공(枓)이라고 하는 지붕 무게를 떠받치는 골조를 놓는다.
중국건축은 세부 장식이 매우 발달했는데, 그중 뛰어난 것이 두공이다. 두공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재료나 짜맞추는 법도 달랐다. 두공만이 아니라 난간 형태, 지붕 장식, 창문의 종류 등도 천차만별이었다. 중국건축에서 지붕은 맞배·우진각·팔작 지붕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개개의 건축물마다 독립된 지붕을 씌웠다.
궁전 본위 중국건축
다른 나라의 건축이 종교건축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반면, 중국건축은 궁전건축을 중심과제로 발달해왔다. 베이징[北京]의 쯔진청[紫禁城]으로 대표되는 궁전건축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개개의 건축형식에서나 전체의 배치상태에서나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며 가장 완벽하다(→ 쯔진청).
종교건축을 비롯한 그밖의 건축물은 대부분 궁전건축을 모방·생략·축소한 것들이다.
중국이 놓여 있는 지리적 조건도 건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중국은 '천자'라는 칭호가 보여주듯 하늘의 아들이 하늘의 명령을 받아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고방식이 옛날부터 철저하여 천자가 최고의 권위를 누렸다. 따라서 그 천자가 거처하는 궁전을 그 권위에 걸맞게 만드는 것이 건축의 중심과제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건축기술을 개발해야 했고, 그결과 매우 일찍 건축양식을 완성하여 어떠한 요구에도 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유교가 생겨나고 도교가 조직화되어 필요한 전당을 지으려 할 때도, 새로운 건축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외래 종교가 필요로 하는 건축물도 모두 중국건축기법을 응용할 수 있었다.
목조 본위 중국건축
중국건축을 목조 본위라고 말하면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넓은 의미로 보면 유명한 만리장성이나 도시와 촌락을 둘러싼 성벽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이런 건축물은 흙이나 벽돌이나 석재를 주요 건축자재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런 이질적인 재료로 지은 건축물도 대부분 목조 건축양식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건축은 목조 본위라고 말할 수 있다.
평면 구성
중국건축의 평면 구성은 매우 단순하다. 대부분 직4각형이나 정4각형이고, 그밖의 복잡한 형태를 갖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기둥을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게 세운다. 기둥의 간격은 정면과 측면을 통일하는 것이 구조상으로도 편리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
정면과 측면을 다르게 하거나 기둥 사이의 간격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주로 구조상의 편의보다는 사용 목적이나 기호를 우선하여, 기술적인 해결을 촉구한 결과이다. 주위의 기둥 사이에는 두꺼운 벽을 쌓는다.
이 경우 앞면만은 벽이 없이 기둥 한 줄을 따로 세우고, 벽은 기둥 안쪽의 기둥선에 쌓는다. 벽은 전(塼)이라고 부르는 검은 벽돌로 쌓는 것이 보통이지만, 흙이나 햇볕에 말린 벽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와처럼 얇고 평평한 전으로 속이 빈 벽을 쌓아올리는 지방도 있으며, 삼림이 풍부한 변두리 지역에서는 널빤지로 벽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창문과 출입구는 앞면에 만든다. 뒤에 창문과 문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측면에 내는 경우는 드물다. 그 배치도 좌우대칭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출입구를 중앙부에 모으고 그 좌우에 창문을 내는 경우가 많다. 내부의 기둥은 경우에 따라 일부나 전부를 생략한다. 내부의 칸막이는 거의 발달하지 않아서, 방의 독립성이 매우 약하다. 건물 한 채가 하나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치방식
중국건축은 개개의 건축물을 보면 지극히 단순 명쾌하고, 원시적이다. 그런데 이 단순한 단위 건축을 몇 채씩 질서정연하게 늘어놓아 건물군을 구성하여 생활의 복잡한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런 방법도 독특하지만, 중국건축을 특징 짓는 것은 이런 건물들의 배치 방식이다.
우선 남쪽에서 북쪽까지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중심축을 설정하고, 주요건축물은 모두 이 중심축 위에 남향으로 세운다. 주요건축물과 관련된 부차적 건축물은 각각 주요한 건축물의 앞뜰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에 대칭으로 세운다. 이것을 배전 또는 상방으로 부르며,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관련을 가진 건축물들은 모두 복도로 연결된다.
개개의 건축물이 각각 좌우대칭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체의 배치도 역시 좌우대칭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배치 방식의 전형적 건물이 베이징의 쯔진청이다. 그러나 이것은 쯔진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일반 관청, 공자를 모신 문묘, 사원, 일반 주택도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구조형식
중국건축은 지반 위에 기단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주춧돌을 놓으며,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운다. 기단을 쌓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인데,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다. 기단은 흙으로 쌓지만, 주위는 대개 벽돌이나 돌로 둘러싼다.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기단은 쯔진청의 태화전(太和展)에서 볼 수 있다. 변두리의 초라한 민가도 반드시 밑에 기단을 쌓는다. 그리고 그 기단 윗면을 직접 생활공간의 바닥면으로 삼고,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은 채 생활한다. 이 점에서는 귀천의 구별이 없다. 나무기둥 사이에 벽이나 출입구, 창문 따위를 만드는 경우에도 기둥 윗부분에는 반드시 기둥 사이를 가로로 연결하는 목재를 두른다. 그 위에는 지붕의 무게를 떠받치기 위한 골조를 놓는데, 그 사이에 중국건축의 가장 큰 특징인 복잡한 구조의 목재를 끼운다. 이것을 두공이라고 부른다.
궁전건축을 비롯하여 문묘나 도관(도교사원)처럼 격조 높은 건축물에는 모두 이 두공을 사용한다. 일반 주택이나 점포 따위의 건축물에는 두공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두공을 사용한 건축물을 대식(大式),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을 소식(小式)이라고 한다.
지붕을 떠받치는 골조는 주로 들보와 동자기둥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간단한 경우에는 앞뒤 기둥 사이에 들보를 가로질러놓고, 그 한가운데에 동자기둥을 세워 마룻대를 받친다. 그리고 마룻대에서 들보 양쪽 끝에 얹힌 처마 도리까지 비스듬히 서까래를 늘어놓고, 그 위에 판을 얹어 지붕을 만든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마룻대에서 처마 끝까지를 서까래 하나로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앞뒤 길이가 긴 건축물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간에 받침대를 만들어 서까래의 길이를 적당히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 마룻대와 처마 도리 사이에 외목도리를 넣어 중간 받침대로 삼는다. 물론 실내의 기둥을 적당히 이용하여 들보의 길이를 줄이거나 겹치는 수를 줄이기 때문에 지붕을 받치는 골조의 구조가 반드시 똑같지는 않지만, 외목 도리를 들보 끝에 얹는다는 원칙은 항상 지켜진다. 이 원칙과는 별도로, 옛날에는 마룻대를 받치는 동자기둥을 2개로 나누어 들보 양쪽 끝과 가까운 곳에서 비스듬히 떠받치는 차수(叉手)라는 수법도 사용되었다.
차수는 버팀목에서 꽤 오랫동안 그 흔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서까래는 통나무를 이용한다. 목재가 풍부하지 않은 곳에서는 통나무가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서까래 끝은 기둥선에서 밖으로 튀어나와 깊은 처마를 만든다. 처마를 깊게 만드는 것은 목조 건물의 경우 기둥이나 벽을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처마를 서까래의 기울기대로 너무 깊이 내면 처마 끝이 너무 아래로 내려와 채광에 지장을 초래하고 외관도 볼품 없이 느껴진다. 그래서 서까래를 도중에 자르고, 기울기가 완만한 서까래를 그 끝에 잇대어, 처마 끝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한다. 이처럼 번쩍 들린 처마를 비첨(飛檐)이라 부르고, 따로 잇댄 서까래를 며느리서까래 또는 부연이라고 부른다. 이 며느리서까래에는 각재를 사용한다.
지붕형태
중국건축은 직4각형이나 정4각형의 단순한 평면 건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개의 단위 건축물에는 각각 독립된 지붕을 씌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 지붕의 형태에는 맞배·우진각·팔작 지붕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맞배 지붕이란 앞뒤 두 방향으로 비탈진 가장 간단한 형식이고, 우진각 지붕은 사방으로 비탈진 형식이다.
팔작 지붕이란 맞배 지붕 아래쪽에 사방으로 차양을 이어댄 형태라고 생각해도 좋고, 우진각 지붕 위쪽을 잘라 그 위에 맞배 지붕을 얹었다고 생각해도 좋다. 중국건축에서는 이 3종류의 지붕 밑에 따로 차양을 이어달아 2층 또는 3층 건물로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2층이나 3층, 또는 그 이상의 고층 누각 건축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은 단층인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는 단층인 건축물을 2층 또는 3층 건물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건축물을 멀리서 바라볼 때 건축물과 하늘이 맞닿는 윤곽선에 활기찬 변화를 주기 위해서인 것 같다.
중국건축의 지붕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지붕이 휘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휘어짐은 지붕의 물매가 휜 경우와 처마 끝이 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물매가 휜 경우에는 지붕의 용마루에서 처마 끝까지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고, 처음에는 가파르게 내려가다가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져 처마 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지붕을 웅대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처마 끝이 휜 경우는 처마가 깊은 커다란 지붕을 경쾌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2가지 휘어짐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조하여 오늘날과 같은 중국건축의 독특한 양식을 만들고 있다.
세부 수법
중국건축의 커다란 특징은 세부의 장식적 수법이 이상할 만큼 발달했다는 것인데, 세부 가운데 건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마를 떠받치는 두공이다. 두공은 들보나 도리에 걸리는 상부의 하중을 집중하여 기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 구조물로서, 그리스·로마 시대 건축이나 그밖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기둥머리 장식과 비슷하다.
두공의 종류는 매우 풍부하고, 시대에 따른 변천이나 부속 재료의 형태 변화 및 짜맞추는 법도 매우 다양하다. 두공만이 아니라 창문의 격자 종류, 격자를 짜맞추는 법, 고란이라고 부르는 난간 형태, 합각 머리에 붙이는 장식인 현어, 박공, 지붕의 용마루 장식 등이 문자 그대로 천차만별이어서, 건축물마다 다르다고 해도 좋을 만큼 종류가 많다. 그래도 전체적인 조화는 잃지 않는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도 계통적으로 분류해보면 근본적인 차이는 의외로 적고, 옛날의 전통적 형태를 약간 수정한 것이 많다.
채색장식
중국건축은 목조 본위여서 실내외에 목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이런 노출 부위에는 대개 색칠을 한다. 게다가 채색에는 빨강이나 파랑 같은 강렬한 원색을 사용한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음양오행설이라는 사상이 있어서, 천지 만물은 모두 목·화·수·토·금의 5개 원소에서 생겼다고 생각하며, 방위나 계절뿐만 아니라 색깔도 모두 이 5개 원소와 결부지어 해석한다.
따라서 파랑·빨강·노랑·하양·검정의 다섯 색깔을 각각 5개 원소와 방위 및 계절에 할당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즉 파랑은 평화, 빨강은 기쁨, 노랑은 힘, 하양은 슬픔, 검정은 파괴를 각각 나타낸다. 그때문에 하양과 검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노랑은 힘의 상징으로서 제왕과 결부되기 때문에, 궁전과 관계 없는 곳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중국건축물이 주로 빨강과 파랑의 원색으로 칠해지고, 중간색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역사
기원
중국건축은 원시시대의 혈거(穴居)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허난 성[河南省]과 산시 성[陝西省] 및 산시 성[山西省] 지역에는 두꺼운 황토층에 옆으로 굴을 파고, 그 안에서 혈거생활을 하는 주민이 많다. 1914년에 중국에 초빙된 스웨덴의 지질학자 안데르손(1874~1960)은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50㎞밖에 떨어지지 않은 저우커우뎬[周口占]이라는 곳에서 고대 인류의 생활터였던 곳으로 여겨지는 유적을 발견했다. 이곳에서는 나중에 '베이징 원인'이라는 원시인의 유골이 발견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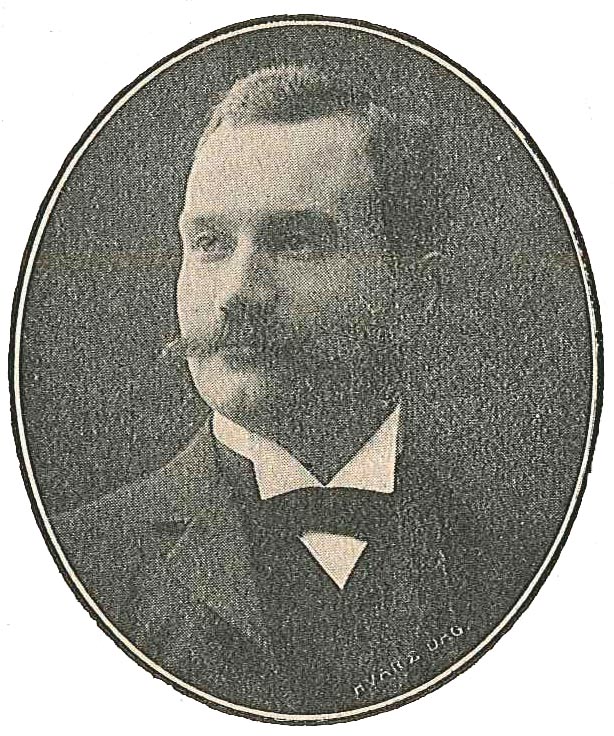
이곳은 석회암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천연동굴이었다. 원시인들은 여기에서 문자 그대로 혈거생활을 했다. 그들이 거기에서 살았던 세월은 매우 길어서, 구석기시대 초기부터 말기에 걸쳐 있다. 발견되는 석기의 종류도 풍부하여, 말기에는 장신구로 여겨지는 물건이나 뼈로 만든 바늘까지 사용했다.
원시인들이 천연동굴을 이용하여 생활했다는 것은 저우커우뎬 유적의 발견으로 입증되었지만, 그밖에도 그와 비슷한 동굴 유적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천연동굴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굴이 아닌 곳에서 생활터를 찾아야 할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간단한 오두막을 짓고 살다가, 점점 견고한 건축물을 짓는 기술을 배웠을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전혀 알 수 없지만, 동굴이 아닌 곳에서도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근처에 동굴이 전혀 없는 넓은 들판에서도 석기가 발견되는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주거지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건축 유적은 신석기시대 말기에 비로소 발견된다.
건축 유적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주거지이며, 그밖에 곳간으로 여겨지는 것과 토기를 구운 가마터도 있고, 무덤도 많이 발견되었다. 면적이 30㎢나 되는 유적도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큰 촌락을 이루고 살았던 것 같다. 주거 형식을 살펴보면, 바닥 모양은 원형인 것도 있고 4각형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모두 지반은 50~60㎝쯤 파내려간 구덩식[竪穴式] 주거이고, 지름이나 한 변의 길이는 4~7m, 입구 부분은 계단이나 경사로로 되어 있고, 실내에는 4~6개 정도의 기둥 구멍이 있다. 또한 주위에도 60~70㎝의 간격을 두고 실내의 기둥구멍보다 약간 작은 기둥구멍들이 수직으로 뚫려 있다.
실내 중앙이나 입구 근처에는 화덕의 흔적이 남아 있다. 개중에는 화덕 대신 흙으로 만든 아궁이가 있는 구덩식 주거도 있다고 한다.
은대(殷代)의 비약
중국에서 거북 등딱지와 짐승뼈 따위에 새겨진 갑골문자라는 고대문자가 발견되고 해독됨으로써, 그때까지 실재가 의심스러웠던 중국의 세 고대왕조인 하(夏)·은(殷)·주(周) 가운데 은의 역사가 확실한 것으로 밝혀져, 역사시대의 영역이 크게 넓어졌다.
그리고 그 문자 자료의 발굴작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결과, 뜻밖에도 은대의 건축이 비약적으로 진보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도시 둘레에 성벽을 쌓았다는 점, 둘째, 기단을 쌓고 주춧돌을 놓은 다음 다시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집을 짓는 중국의 전통적 건축양식이 그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 셋째, 놀랄 만큼 규모가 큰 능묘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은대의 성벽은 허난 성 중부의 정저우[鄭州]에서 발견되었는데, 현재 시가지의 2배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축성법은 판축(版築)이라 하여, 흙을 층층이 쌓아 다지는 방법을 사용했다(램드어스). 성벽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보아 중요한 도시였던 것은 틀림없고, 은의 초기 도읍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도읍이라면 왕궁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까지 보고된 건축 유적은 일반 주거지가 대부분이고, 그밖에 창고터와 연장(뼈연장·석기·동기) 제작소, 토기를 굽던 가마터와 무덤 따위가 있다.

주거는 신석기시대 말기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구덩식 주거가 많지만, 평지 주거나 땅 위에 기단을 쌓고 그위에 흙벽을 두른 경우도 있다. 흙벽 안에는 수직으로 기둥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기둥을 세워 지붕을 떠받치는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바닥이나 벽에는 석회를 발랐다. 그중에는 칠이 벗겨져 몇 번이나 새로 덧칠한 흔적이 남아 있는 곳도 있다.
갑골문자의 발견으로 유명해진 허난 성 북부의 안양 현[安陽縣] 샤오툰[小屯]에 있는 은허(殷墟)에서 아직 성벽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은허). 그러나 그 땅은 반경(盤庚)부터 주왕(紂王)에 이르는 은 후기의 왕들이 도읍으로 삼은 땅으로서, 왕궁터와 왕묘 등이 발굴 조사되어 은의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발견되었다.
그런 유적 가운데 왕궁터로 여겨지는 건축 유적은 모두 판축 기법으로 흙단을 쌓고, 그 위에 주춧돌을 놓아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는 역시 판축 기법으로 흙벽을 쌓은 듯, 크고 작은 10개의 흙단과 주춧돌 및 흙벽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서주시대(西周時代)의 공헌
은에 뒤이은 서주시대의 건축에 관해서는 정저우의 성벽이나 은허 같은 집중적인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시대에 발명된 지붕 기와는 중국건축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가장 오래 된 지붕 기와는 주나라의 발상지와 가까운 산시 성 서부의 메이 현[眉縣]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네모 기와인데, 약간 구부러져 있고 기와 면에는 줄무늬가 새겨져 있다. 기와의 모양은 오늘날에도 사찰 지붕 따위에 사용하는 암키와와 같은 계통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암키와와 암키와 사이에 엎어놓는 반원통 모양의 수키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키와에도 암키와와 같은 모양의 기와를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형태의 기와 가운데 돌기가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구부러진 기와의 볼록한 면만이 아니라 오목한 면에 돌기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돌기는 지붕에 기와를 얹을 때 기와 밑에 까는 흙에 꽂아서 기와를 지붕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인데, 오목한 면에 돌기가 난 기와는 수키와처럼 오목한 면이 밑으로 가도록 엎어서 암키와와 암키와 사이의 틈을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돌기는 없지만 같은 형태의 암키와만으로 지붕을 이는 수법은 오늘날에도 중국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다. 지붕을 기와로 이는 것이 일반화한 오늘날에는 간과해버리기 쉽지만, 인공적으로 기와를 구워서 그것으로 지붕을 인다는 발상과 오늘날까지 활용되는 훌륭한 양식을 설정한 것은 인류의 발명사상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용마루에 사용하는 산 모양의 기와도 만들었는데, 이것은 안쪽에 돌기가 나 있다. 기와로 지붕을 이는 수법은 서주시대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경쟁
서주시대에 발명된 기와는 궁전을 호화롭게 하는 데 알맞은 건축 자재로서 각지에 널리 퍼졌다.
춘추전국시대의 제후들이 쌓은 성의 유적에서 많은 기와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 점은 분명하다. 이런 기와를 보면 제후들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모양의 기와를 만들거나 기와를 이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머리를 짜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중 하나로, 암키와와 암키와 사이의 틈을 메우는 수키와가 고안되었다. 암키와와 수키와로 지붕을 이는 수법이 이때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마 끝에 사용하기 위해 수키와의 한쪽 끝을 막은 막새도 이때 만들어졌다. 수키와는 반원통 모양이기 때문에 막새의 마구리도 처음에는 반원형이었다. 이것을 반원 와당(瓦當)이라고 한다. 반원 와당에서 원형 와당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이다.

이리하여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는 수법이 차츰 완성되었다. 이런 과정은 당시의 성터를 발굴 조사한 결과 완전히 입증되었다. 수키와 끝을 막게 되면,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막새의 와당이 가장 눈에 잘 뜨인다. 그래서 와당에 무늬를 넣어 장식하는 수법이 고안되었다. 이것이 바로 와당무늬이다. 그런데 이 무늬가 한결같지 않고, 제후에 따라 각각 독특한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이 사실은 제후들이 자신들의 궁전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서로 경쟁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키와 표면에 무늬를 넣은 것도 발견된다. 처마 끝에 사용하는 암키와의 끝을 두껍게 하여 거기에 무늬를 넣은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암키와의 볼록한 면에 무늬를 넣은 것은 발견되었다.
허베이 성[河北省] 남부의 한단[邯鄲]에서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왕궁터로 여겨지는 건축 유적이 발굴되었다.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아니어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사방에 복도 같은 좁은 건물이 뻗어 있고 그 중간은 크고 높은 흙단으로 메워져 있다.
흙단 위의 건물은 허물어져서 원래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기와가 많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흙단 위에 건물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복도를 둘러치고 그 안에 따로 높은 건물이 서 있었던 것이다. 각각의 지붕을 기와로 잇는다면, 멀리서 바라볼 경우 웅장한 2층 누각처럼 보일 것이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 3층이나 그 이상의 누각처럼 보이는 겉모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베이징의 쯔진청을 비롯하여 중국 각지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중국건축의 독특한 양식이다. 그후의 건축 유적을 발굴 조사한 결과, 중심의 흙단이 없어지기까지는 뜻밖에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秦) 시황제(始皇帝)의 통일
진의 시황제가 BC 210년에 5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벌인 건설공사는 중국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유명한 만리장성을 비롯하여 치도(馳道)라고 부르는 대규모 도로 건설, 그 치도로 이어진 전국 각지의 별궁과 궁전은 모두 700여 개에 이른다. 그 가운데 수도 셴양[咸陽]에서 70㎞ 이내에 있던 270개의 별궁과 궁전은 모두 복도(復道)나 용도(甬道)로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황제의 모습이 남의 눈에 띄면 안 된다고 진언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 복도는 2층 회랑(回廊)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용도는 돌이나 벽돌로 덮은 굴 같은 통로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궁전건축에는 위층에 1만 명 규모의 좌석이 있고 아래층에는 15m 높이의 깃발을 세울 수 있었다고 전해지는 아방궁(阿房宮)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궁전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아방궁). 또한 시황제는 생전에 리산 산[驢山] 기슭에 자기가 묻힐 묘를 만들게 했는데, 그 규모와 구조에 관해서는 〈사기〉를 비롯한 여러 책에 자세히 전해지고 있다(→ 진시황릉)(진시황릉). 이 능은 규모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기술이 크게 발전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시황제는 정치적으로 중국을 통일한 동시에 건축술도 통합했다. 셴양은 중국건축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것은 한대로 이어졌다.
한대의 진보
BC 206년 진이 멸망할 때, 시황제가 전국의 건축술을 통합하여 만든 궁전과 별궁도 모두 파괴되어 버렸다.
그러나 한의 고조가 시국을 수습하여 한 제국을 확립(BC 202)할 때까지의 혼란기는 매우 짧았기 때문에 기술의 단절은 없었다. 고조가 도성을 셴양 맞은편의 장안(長安)으로 결정한 것은 시국 수습에 가닥이 잡힌 BC 202년 5월이고, 그로부터 2년 뒤인 BC 200년 2월에는 장락궁(長樂宮)이 완성되어 그곳으로 도읍을 옮겼다. 같은 성 안에 있는 미앙궁(未央宮)도 같은 시기에 건설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BC 198년에는 제후와 신하들을 모아 성대한 낙성 축하연을 벌였다. 미앙궁은 고조가 감탄을 금하지 못할 만큼 훌륭했다. 게다가 그 공사 기간을 생각하면, 당시의 건축기술이 대단히 진보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조가 죽은 뒤에는 어린 황제들이 잇달아 제위에 올라 내분이 끊이지 않았지만, 무제시대(武帝時代:BC 141~87)에는 시국이 안정되어 유례 없는 발전기를 맞았다. 무제는 장안 성 서쪽에 건장궁(建章宮)을 지었는데, 지붕에는 구리로 만든 봉황을 올리고 건물을 모두 극채색으로 장식했다고 한다.
한나라는 후한의 헌제(獻帝)가 220년에 위(魏)의 조비(曹丕)에게 제위를 넘겨주어 멸망할 때까지, 전한과 후한을 통틀어 422년 동안 지속되었다. 태평성대가 계속되면서 한조의 건축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함과 화려함을 추구하여, 세부가 발달하고 장식이 지나친 바로크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쓰촨 성[四川省]에 남아 있는 풍환(馮煥)이나 평양(平楊)의 석궐(石闕)을 보면, 그 경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육조시대
후한이 멸망한 뒤, 중국은 오랜 혼란기에 빠졌다.
그리고 황허 강[黃河] 유역은 북방 민족에게 유린되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불교가 점점 민중 사이에 뿌리를 내렸다. 불교의 침투와 함께 중국건축에 석굴과 탑이 새로 추가되었다. 석굴은 바위산 절벽에 옆으로 굴을 파고 불상 따위를 조각한 일종의 절이다. 그 발상지는 인도인데, 불교와 함께 서역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 3대 석굴로 유명한 둔황[敦煌]·윈강[雲崗]·룽먼[龍門]을 비롯하여 마이지 산[麥積山], 톈룽 산[天龍山], 샹탕 산[響堂山], 치샤 산[樓霞山] 등에 있는 많은 석굴은 대부분 이 시대에 만들어졌다.
탑은 석가모니의 무덤에서부터 생긴 것이지만, 그 의미와 형태는 불교가 널리 퍼지는 과정에서 점점 바뀌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건축기법으로 처리한 층탑 형식의 탑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 들어온 불교가 그 상징인 탑을 지을 때 중국에서 발달한 누각 건축기법을 차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교 사찰도 역시 중국건축양식을 따랐다.
중국에서는 한대에 이미 석조건축이 만들어졌으며, 그 형태는 목조건축양식을 돌로 충실히 나타내려고 애쓴 것이다. 또한 전곽(塼槨)이라는 벽돌로 지은 묘실도 많이 발견되었다. 이것들은 완전한 조적(組積) 구조이고, 아치와 둥근 천장을 만든 수법도 훌륭하다. 그러나 모두 지하에 설치된 묘실이고, 그 내부에 필요한 생활공간을 만든다는 착상은 불교와 함께 서역에서 들어온 것이다.
중국은 두꺼운 황토층 덕분에 판축 기법으로 튼튼한 벽을 쉽게 만들 수 있었고, 이때문에 석재나 벽돌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당 시대
수대(隋代:581~618)에는 흔히 진의 시황제와 비교되는 제2대 황제 양제(煬帝)가 도성과 궁전 건설 및 대운하 건설 같은 토목공사를 활발하게 일으켰다.

그러나 수는 불과 30여 년 만에 멸망하고, 당(唐)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수·당 시대는 진·한 시대보다 더 문화가 융성한 시대로,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유적은 아주 적다. 당의 장안성과 그 안의 궁전, 귀족의 저택과 사찰 등에 관한 기록이나 돌에 조각된 그림은 꽤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최근에야 일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전(塼) 및 석조건축은 재료가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조건축보다 많이 남아 있다. 무덤 앞에 늘어놓은 조각을 제외하면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탑인데, 전을 쌓아올린 탑에는 규모가 큰 것도 많다. 같은 전탑이라도 형식은 크게 2종류로 나뉜다. 맨 아래층은 높지만 2층 이상은 낮고, 탑신을 거의 만들지 않은 채 처마만 층층이 겹쳐놓은 형태의 것을 첨탑(詹塔)이라 한다. 반면에 층마다 탑신을 만들고 창문이나 출입구를 낸 누각 형식의 것을 층탑(層塔)이라 한다.
평면은 대부분 사각형이지만, 당 말기에는 팔각형 탑도 나타났다. 전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벽면에 기둥 모양이나 가로대를 만들고 두공을 늘어놓아 처마를 받치게 한 형태의 탑이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적 목조건축양식을 전탑에 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조적 구조가 서역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서역의 건축 기법을 중국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석탑에는 육조시대의 유물인 단층탑과 7층탑 또는 9층탑이 있지만, 각 층과 처마를 하나의 돌로 깎아 만든 소규모의 것이 대부분이다.
5대와 송 이후
907년 당이 멸망한 뒤, 중국은 5대시대(五代時代), 송(宋), 여진족의 금(金), 몽골족의 원(元), 다시 한족의 명(明), 만주족(옛 이름은 여진족)이 세운 청대로 이어졌다.
5대에서 송대까지 북쪽에는 거란족이 세운 요(遼)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일어나고 쓰러지는 동안, 각 시대에 애써 만든 도성이나 궁궐은 모두 파괴되었다. 다만 명의 영락제(永樂帝)가 1407년 연경(燕京:지금의 베이징)에 새로 지은 대규모 도성과 궁궐은 이자성(李自成)의 난 때 일부가 불탔을 뿐, 청대에 복구되어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다.
이 베이징 성 이외에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현재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 목조건축으로는 허베이 성 정딩 현[正定縣]에 있는 공자묘 대성전(大成殿)이 건축양식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부류에 속한다. 요는 북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목조건축물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북송 초기의 건축도 당의 가장 발달한 건축양식을 이어받았다.
따라서 처음에는 요의 건축과 비슷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도성 건설과 궁전이나 관청 같은 커다란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축술도 차차 발전했다. 그 발전 방향은 그후의 일관된 건축양식의 추이로 미루어보아, 목재의 축소와 건축의 규격화 및 공업화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 과정을 확실히 보여주는 북송 초기와 중기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실례를 들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북송 말기(1100)에 이명중(李明仲)이 지은 〈영조법식 營造法式〉이라는 건축술 전문서가 전해내려오고 있어서, 북송 말기의 건축양식은 당과 요의 건축에 비해 목재가 축소되고, 규격화와 공업화가 두드러지게 진전되어 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요의 뒤를 이어 진출한 금의 건축물도 몇 채 발견되었는데, 그 건축양식은 요와 뚜렷이 구별되어 〈영조법식〉과의 관련을 생각할 수 있다. 〈영조법식〉에서 베이징의 쯔진청에 이르는 건축의 흐름은 관련 서적으로도 쉽게 추적할 수 있으며, 유물들도 많다. 전·석조건축의 유물은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많다. 이것은 대부분 탑이지만, 명 이후에는 무량전(無梁殿)이라 하여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전과 돌만 쌓아올린 조적 구조의 커다란 건축물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건축물의 두드러진 공통점은 목조건축으로 완성된 건축양식의 답습이다.
탑은 중국건축에서 가장 다채로운 변화를 보이는 분야로서, 육조시대와 수·당 시대에도 그 편린이 엿보였지만, 5대 이후에 본령을 발휘하게 된다. 순수한 전탑은 북쪽에 많은데, 특히 요와 금의 탑에는 팔각형 13층 첨탑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흔히 이런 유형의 탑을 요금탑이라고 부른다. 같은 북쪽지방이라도 북송이 다스렸던 지역에는 층탑만 남아 있는데, 벽면에 기둥 모양을 만들지 않고 맨 꼭대기 층의 천장을 둥글게 만들어 철저히 조적 구조로 지은 탑이 많다. 또한 유약을 칠한 전으로 바깥 벽을 완전히 덮은 탑도 있다. 이런 종류의 탑을 흔히 유리탑(琉璃塔)이라고 부르며, 명·청대에 활발하게 건립되었다. 원대에는 티베트를 회유하기 위해 티베트 불교(라마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평면이 원형이고 위쪽이 불룩한 특수한 형태의 이른바 라마 탑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또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탑의 형태는 점점 더 다양해졌다. 남쪽에는 5대 초기부터 순수한 전탑은 드물었고, 중심부에만 전을 쌓고 처마를 나무로 만든 층탑이 많다. 석탑은 북쪽에는 매우 드물다. 유명한 쥐융관[居庸關]은 원래 라마 탑의 대좌로 세워진 것으로 석탑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는 상부 구조물이 없어진 상태이다. 명대에 인도 부드가야의 대탑(大塔)을 모방한 금강보좌탑(金剛寶座塔)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탑이 만들어졌고 청나라도 이것을 본받았지만, 네모난 하얀 대리석의 높은 대좌 위에 5개의 탑을 세운 색다른 형식의 탑으로 이채를 띤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에 남쪽에는 아름다운 석탑이 적지 않다. 대부분 돌을 다듬은 조각품인데, 조각 기법도 발달했고 규모도 거대하다. 그러나 전체를 석재로 쌓아올린 본격적인 석탑도 남아 있다. 이런 종류의 탑은 조적 구조의 중국화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 중국건축이 석조화하는 첫걸음이다. 나무와 전 및 돌로 만든 탑 이외에 쇠로 만든 철탑도 5대시대 이후로 몇 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