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와
다른 표기 언어요약 점토를 재료로 하여 모양을 만든 뒤 800~1,000℃의 가마에서 구워낸 것이다. 목조건물의 지붕을 덮어 눈과 빗물의 침수와 이로 인한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물의 외관을 장식하는 기능을 갖는다.
점토제 기와의 기원은 바빌론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목조건물에 기와를 덮는 풍습은 고대 동양건축의 특색 중의 하나로 중국 주대부터 시작되었다. 실제로 서주 초기(BC 11세기말) 섬서성 궁전터에서 마루용기와[棟瓦]가 출토되었고 단편적이나마 문헌기록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춘추시대말 수키와[圓瓦]와 암키와[平瓦]가 형성되었고, 전국시대에는 타원형의 막새기와[瓦當]를 붙이기 시작하였으며, 진(秦)·한대(漢代)에는 원형 와당이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 기와 전래의 시기는 한사군설치 이후인 BC 2~1세기로 보이며 한 계통의 문자와당과 고사리무늬 와당이 실제로 낙랑군지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이 4세기초까지 사용되다가 삼국시대에 불교전래와 함께 연꽃무늬가 새겨진 숫막새가 제작되는 등 우리나라 고유의 와당이 성립되었다. 백제는 고구려 영향 아래 있다가 공주천도 이후에는 유연한 단잎의 원형 연꽃무늬가 특색인 중국 남조 기와의 영향을 받아 우아한 백제 특유의 양식이 성립되었고, 이것이 와박사라는 전문 기와기술자를 통해 고신라와 일본 아스카 시대[飛鳥時代]까지 파급되었다. 신라는 가장 늦게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6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 통일신라시대에는 완성기에 이른다.
삼국시대까지는 수키와·암키와·막새기와·치미 등에 국한되었던 것이 통일신라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장식기와와 특수기와가 활발히 제작되고 문양도 화려해져 건축의장으로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귀면와도 성행했고, 유약을 입힌 녹유기와[綠釉瓦]도 출현했다(→ 한국의 건축). 고려·조선시대는 퇴조기로 볼 수 있는데, 문양도 거칠고 조잡해지며 단순히 형식화되는 경향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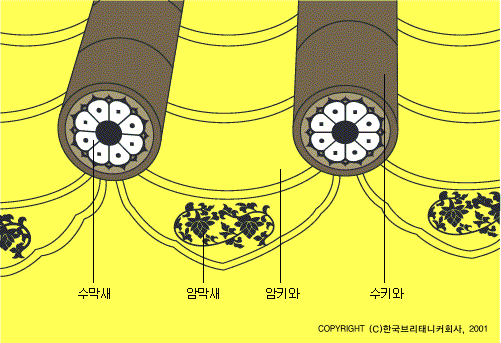
그 문양과 명칭이 다양한데 크게 평기와·막새기와·망새기와로 나눈다.
평기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키와와 암키와를 말한다.
막새기와는 목부재 끝을 마감하는 치장용 기와로 수막새기와, 암막새기와, 서까래·부연·추녀에 붙이는 초가리기와로 다시 분류된다. 여기에는 대부분 장식적인 문양이 새겨지는데 연꽃무늬·당초무늬·모란무늬가 많으며 때로는 문자나 명문이 쓰이기도 한다.
망새기와에는 치미·용두·취두 등 용마루 좌우를 장식하는 용마루용과 도깨비 형상이 새겨진 귀면와·곱새기와·바래기·잡상 등 내림마루용이 있는데 장식적인 기능 외에 잡귀와 화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벽사의 의미가 크다. 그밖에도 지붕 세부에 따른 다양한 특수기와들이 있다.→ 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