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
다른 표기 언어 義湘 동의어 해동화엄시조원교국사, 海東華嚴始祖圓敎國師| 출생 | 625(진평왕 47) |
|---|---|
| 사망 | 702(성덕왕 1) |
| 국적 | 신라, 한국 |
요약
한국에 화엄종을 최초로 일으켰다. 8세 위인 원효를 만나 친교를 맺고 그와 함께 고구려 보덕 화상에게 〈열반경〉을 배우기도 했다. 661년 원효와 함께 해로를 통하여 중국에 가던 중 원효는 한 고분에서 깨친 바가 있어 발길을 돌리고 의상은 중국 화엄종의 제조였던 지엄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귀국후 부석사 등 많은 사찰을 세우고 교화 활동을 폈다. 원효가 저술에 힘쓰고 개인적인 교화활동을 편 데 반해, 의상은 교단 조직에 의한 교화와 제자들의 교육을 중시했다.

해동(海東)의 화엄초조(華嚴初祖)라고도 한다.
문헌에 따라 '義相'·'義想' 등으로도 표기되고 보통 '義湘'으로 통용되지만, 의상의 법손(法孫)들은 거의가 '義相'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의 저술에도 '義相'으로 표기된 것이 많다.
의상의 전기(傳記)를 싣고 있는 문헌은 〈삼국유사〉·〈송고승전〉·〈백화도량발원문약해〉 등인데 그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속성은 김씨(金氏) 또는 박씨(朴氏)이며 아버지는 한신(韓信)이다. 어려서 경주 황복사(皇福寺)에서 출가했다고 한다.
8세 위인 원효(元曉)를 만나 친교를 맺고 그와 함께 고구려 보덕(普德) 화상에게 〈열반경 涅槃經〉을 배우기도 했다. 650년 당나라 유학을 결심하고 원효와 함께 중국으로 가던 길에 요동(遼東) 변방에서 고구려 군사에게 첩자로 오인되어 잡혀 있다가 겨우 빠져 나왔다. 육로를 통한 첫번째 입당의 시도는 실패하고, 661년 다시 원효와 함께 해로를 통하여 중국에 가던 중 원효는 한 고분에서 깨친 바가 있어 발길을 돌리고 의상 혼자만이 귀국하던 당나라 사신의 배를 타고 중국에 도착했다.
의상은 양주(揚州)에 이르러 그곳의 주장(州將) 유지인(劉至仁)을 만나 관아에 머물면서 성대한 대접을 받고, 다음해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로 지엄(智儼)을 찾아갔다. 당시 지엄은 중국 화엄종의 제2조로서 새로운 화엄학풍을 일으켜 문하에 법장(法藏) 등의 제자를 두고 있었다. 지엄은 특별한 예(禮)로써 의상을 맞이하며 전날 꿈에 그가 올 징조를 보았다며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후 의상은 지엄의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더욱 새로운 이치를 탐구하여 깊은 것을 끌어내고 숨은 뜻을 찾아내어 나중에는 스승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에 머물면서 남산율종(南山律宗)의 개조인 도선율사(道宣律師)와 교유했으며, 동문수학한 19세 연하의 법장과도 각별한 교분을 맺었다. 법장은 지엄의 뒤를 이어 화엄종의 제3조로서 중국 화엄종을 교리적으로 완성했던 인물로 항상 의상의 학식과 덕망을 흠모했다. 법장은 의상이 귀국한 후에도 그를 극찬하는 서신과 함께 자신의 저서 7부 29권을 신라 승려 승전(勝詮) 편으로 의상에게 보내어 상세히 검토하고 부족한 점을 깨우쳐주기를 청하기도 했다.
의상은 668년 지엄이 입적하기 3개월 전에 〈화엄일승법계도 華嚴一乘法界圖〉를 지어 스승의 인가를 받고 670년 귀국했는데, 〈삼국유사〉에 의하면 그의 귀국 동기는 당 고종의 신라 침공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는 신라로 돌아온 후 적극적인 교화활동을 펼쳤다.
귀국 직후 낙산사(洛山寺)에서 〈백화도량발원문〉을 지어 관세음보살에 기도하고 그를 친견(親見)했다고 한다(〈백화도량발원문〉). 그후 전국을 유람하다가 676년 태백산에 화엄의 근본도량이 된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한 것을 비롯해 많은 사찰을 세우고 각처에서 교화활동을 폈다. 원효가 저술에 힘쓰고 개인적인 교화활동을 편 데 반해, 의상은 교단 조직에 의한 교화와 제자들의 교육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문헌에 따르면, 의상은 부석사에서 40일간 일승십지(一乘十地)에 대해 문답하고, 황복사에서 〈화엄일승법계도〉, 태백산 대로방(大盧房)에서 행경십불(行境十佛), 소백산 추동(錐洞)에서 90일간 〈화엄경 華嚴經〉 등을 강의했는데, 추동에서 강의할 때는 3,000여 명의 제자가 운집했다고 한다. 제자들 가운데 특히 뛰어난 1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오진(悟眞)·지통(智通)·표훈(表訓)·진정(眞定)·진장(眞藏)·도융(道融)·양원(良圓)·상원(相源)·능인(能仁)·의적(義寂)으로 당시 아성(亞聖)이라 불리며 존경받았다고 한다.
그외에 범체(梵體)·도신(道身)·신림(神琳)·법융(法融)·진수(眞秀) 등도 의상의 법계(法系)에서 나온 훌륭한 제자들이다. 이처럼 제자들을 육성하고 사찰을 건립하는 등 실천수행을 통하여 화엄의 선양에 전념했다.
사상
법장이 저술을 통해 이론적으로 화엄의 일승교의를 건립함을 목표로 했던 것과는 달리 의상은 실천수행을 근본으로 삼았다.
일찍이 지엄은 법장에게 글귀에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문지라는 호를, 의상에게는 근본 뜻에 통달했다는 의미에서 의지라는 호를 주었다는 일화를 통해 의상의 사상적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특성은 그가 서민불교적인 아미타정토 신앙을 중시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부석사에 무량수불을 모신 것이라든지 낙산에 관음진신주처의 도량을 개설하는 등 화엄사상의 근본인 원융무애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아미타신앙·관음신앙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는 스승 지엄의 학설을 대체로 받아들였으나 육상원융설을 보다 정교하게 확립했고, 이이무애법계라는 독창적인 학설을 세웠다. 화엄종에서는 세계의 원융무애함을 설명하기 위해 이무애·사무애·이사무애·사사무애의 4가지 무애를 말하는데, 의상은 이치(理)와 현상계(事)의 궁극적인 일치라는 관점에서 이치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차별화의 원리를 이이무애법계로 고양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사물과 사물의 차별, 즉 현상계의 다양성이 원융무애하다는 사사무애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치, 즉 본체론적인 차별의 원융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처의 경지를 지혜, 즉 이론적 측면에서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해경십불설보다는 수행의 관점에서 논하는 행경십불설을 강조했는데, 이는 해경십불을 강조한 법장의 설과는 대조적인 불신론이다. 법계연기를 설명하는 '일즉다 다즉일'의 논리를 동전 10개를 세는 십전법의 비유를 들어 전개한 것도 의상이 최초이다.
현전하는 저술로는 〈화엄일승법계도〉·〈백화도량발원문〉·〈화엄일승발원문 華嚴一乘發願文〉·〈투사례 投師禮〉 등이 있으며, 〈입법계품초기 入法界品抄記〉·〈화엄십문간법관 華嚴十門看法觀〉·〈아미타경의기 阿彌陀經義記〉 등은 있었다고 하나 현전하지 않는다. 의상은 실천수행을 중시하여 저술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이 "온 솥의 고기맛을 알려면 한 점의 살코기로도 충분하다"라고 평했던 것처럼, 의상의 대표작인 〈화엄일승법계도〉는 방대한 〈화엄경〉의 세계를 210자로 이루어진 간결한 도인에 압축시킨, 불교사상 가장 탁월한 저술 가운데 하나로 후세의 화엄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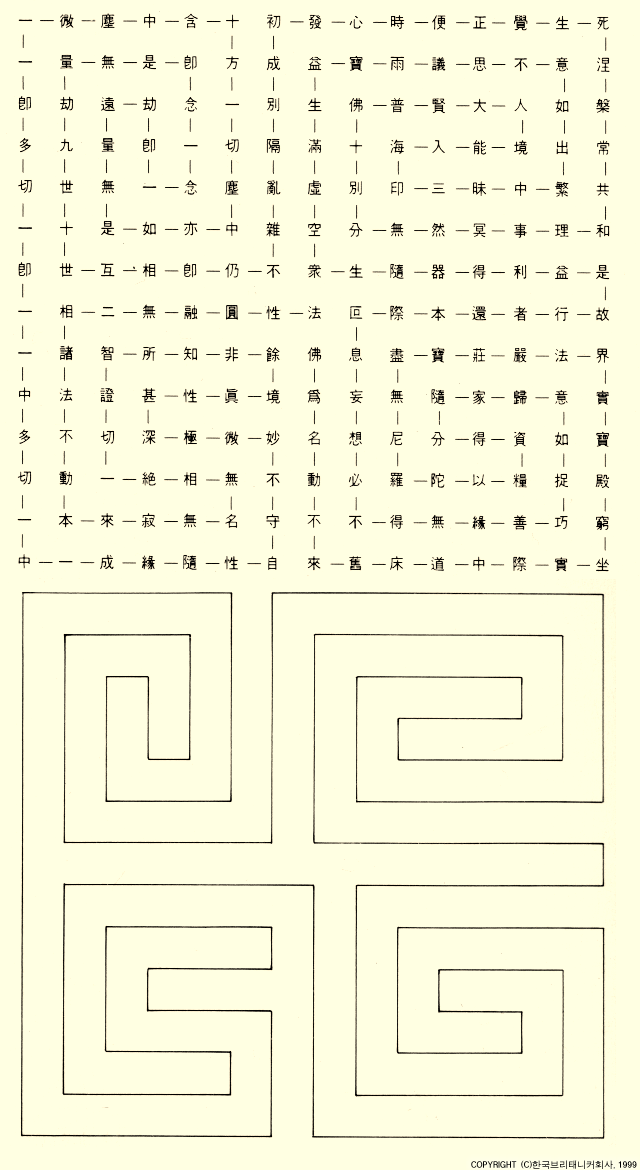
한국 화엄학의 주류를 이룬 의상의 법손들은 〈화엄일승법계도〉의 연구와 주석에 힘을 기울여, 지통의 〈추동기 錐洞記〉, 도신의 〈도신장 道身章〉, 법융의 〈법융대덕기 法融大德記〉, 진수의 〈진수대덕기 眞秀大德記〉·〈법계도기총수록 法界圖記叢髓錄〉, 균여(均如)의 〈일승법계도원통기 一乘法界圖圓通記〉, 김시습(金時習)의 〈대화엄일승법계도주 大華嚴一乘法界圖註〉, 유문의 〈법성게과주 法性偈科註〉 등의 해석서가 신라·고려·조선을 통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