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운
다른 표기 언어 phoneme , 音韻요약 말을 이루는 낱낱의 소리.
음운이라는 용어는 음소라는 용어와 함께 쓰이기도 하고 구별되어 쓰이기도 한다.
음운과 음소를 구별해서 쓰는 학자들은 음소와 운소를 합쳐 음운이라고 한다. 이때 음소에는 자음과 모음이 포함되고 운소에는 음장(길이)·성조(높낮이)·강세(세기)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각각 음운론·음소론·운소론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 언어학에서는 운소까지도 phoneme이라고 지칭해왔으므로 국어의 음운은 이런 의미의 phoneme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음운과 음소를 같은 뜻으로 쓰는 학자들은 자음과 모음을 분절음소, 음장과 성조와 강세 등을 초분절음소라고 한다. 학문에 대한 명칭도 각각 음운론(또는 음소론)·분절음운론·초분절음운론이 된다.
음운 또는 음소는 개별 언어에 쓰이는 말소리 중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소리를 말한다. '물'과 '불'은 'ㅁ'과 'ㅂ'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단어로 쓰인다. 'ㅁ'과 'ㅂ'이 구별되어 쓰이므로 이들이 서로 다른 음운임을 알 수 있다. '물·불'과 같이 1가지 소리만 차이 나는 단어들을 최소대립어라고 한다.
또 영어에서 'light'와 'right'는 첫 소리가 각각 [l] 과 [r] 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어로 쓰인다. 영어에서는 이 두 소리가 서로 다른 음운이다. 그러나 우리말에서 '라면'의 'ㄹ'을 [l] 로 발음하든 [r] 로 발음하든 마찬가지이다. 즉 [l] 과 [r] 이 구별되어 쓰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소리가 우리말에서는 /ㄹ/이라는 한 음운에 속한다(음운은 빗금으로 표시함).
한글이나 알파벳과 같은 자모문자를 쓰는 언어에서는 각각의 자모가 대체로 음운과 일치한다.
한글에 [l] 이나 [r] 를 적는 글자가 'ㄹ' 1개뿐인 것도 우리말에서 한 음운인 'ㄹ'에 대해 글자가 2개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영어에서 서로 다른 음운으로 쓰이고, 서로 다른 글자로 적히는 무성음 [p] 와 유성음 [b] 는 우리말에서 구별되어 쓰이는 일이 없으므로 'ㅂ' 1가지로만 적게 되는데, 음운으로도 'ㅂ' 하나이다. 그러나 글자와 음운이 반드시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ㅃ'은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음운을 나타낸다.
또 첫소리 'ㅇ'과 받침 'ㅇ'은 글자로는 하나이지만 뒤의 것만 [ŋ] 이라는 한 음운이 되고 앞의 것은 아무 음가도 없어 음운이 되지 못한다. 'ㅑ'는 한 글자이지만 [ja] 와 같이 두 음운이 이어진 것이고, 'ㅔ'는 두 글자의 결합이지만 [e] 라는 한 음운을 나타낸다.
음운의 성격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왔다.
E. 사피어는 음운을 심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음 성 [l] 과 [r] 는 우리 머리 속에 /ㄹ/이라는 음운관념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운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듣는 사람의 인상과 일치하는 단위가 되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든 인간의 머리 속에 음운과 같은 언어 단위가 기억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L. 블룸필드와 D. 존스는 음운을 물리적인 존재로 보아 음성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 했다.
음성학적으로 비슷한 음성들이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일이 없을 때 그러한 음성들의 집합이 음운이라는 것이다. 한 음운으로 묶이는 음성들 각각을 이음(異音)이라고 하는데, 이음들끼리는 같은 자리에서 서로 대치되어 쓰일 수 없을 때가 많다. 같은 자리에 나타날 수 있어야 서로 구별되어 쓰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리밥' [poribap°] 에서 무성음 [p] 는 단어 첫머리에만 나타나고, 유성 음 [b] 는 유성음 사이에만 나타나며, 파열과정이 생략된 불파음 [P°] 는 음절의 끝소리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ㅂ/에 속하는 3개의 이음 [p]·[b]·[p°] 는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구별되어 쓰일 기회가 없다. 이러한 상태를 상보적 분포 또는 배타적 분포라 한다.
한편 '라면'의 'ㄹ'은 [l] 로도 나고 [r] 로도 나므로, 이 경우에는 두 이음이 같은 자리에 나타날 수 있어 상보적 분포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한 음소의 이음들끼리는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N. S. 트루베츠코이와 R. 야콥슨은 /ㅁ/과 /ㅂ/의 음운의 차이가 단어를 구별해주는 기능, 즉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변별적 기능을 가지는 음성 특징들을 변별적 자질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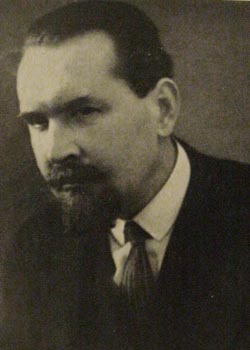

/ㅁ/과 /ㅂ/의 경우 변별적 자질은 숨이 코 안을 지나는지(ㅁ) 지나지 않는지(ㅂ)를 결정하는 '비음성'이다. /ㅁ/은 비음성이 있고('+비음성') /ㅂ/은 비음성이 없다('-비음성'). 모든 음운은 변별적 자질에 의해 서로 구별되며, 변별적 자질에 의한 대립의 총체가 음운체계가 된다. 따라서 한 음운은 음운체계 속에서 다른 음운과의 대립을 통해 존재하는 기능적인 단위이다. 그리고 음운은 변별적 자질들이 동시에 결합한 단위로 규정된다.
음운을 심리적인 단위로 보든 물리적인 단위로 보든 기능적인 단위로 보든 음성보다 더 추상적인 단위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l] 이니 [r] 등의 음성도 사실은 추상적인 단위이다. 똑같은 음성기호 [l] 로 적히는 소리라도 사람에 따라서, 또 같은 사람이라도 순간순간 발음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물'은 [mul] 이라고 적히지만 [m] 과 [u] , [u] 와 [l] 의 경계가 음성학적으로 분명한 것은 아니다. [m] 의 발음이 시작될 때 이미 [u] 를 발음하기 위해 입술이 둥글게 되어 있고, 그 모양은 [l] 을 발음하는 동안에도 유지된다.
중간에 경계가 없이 연속된 소리를 적당한 곳에서 끊어 인식한 것이 음성표기 [mul] 이다. 음운은 이러한 음성보다 더 추상적인 단위이다. /ㅂ/은 입술에서 나는 소리이면서 비음성을 가지지 않은 어떤 추상적인 소리이다. 그것이 무성음 [p] 이든 유성음 [b] 이든 불파 음 [P°] 이든 관계가 없다. '집만'에서 /ㅂ/은 /ㅁ/으로 실현되고 '집이'에서는 /ㅂ/으로 실현되는데, 형태소 '집'의 기본형(基本形)을 잡을 때 /ㅂ/ 쪽인 '집'을 택한다. 이때 기본형에 나타나는 /ㅂ/은 일반적인 음운과 구별하여 형태음운 또는 형태음소라고 부른다.
그러나 음운이론 중의 하나인 생성음운론에서는 형태음운도 음운이라고 해서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다. 또 생성음운론에서는 음운과 음성을 구별없이 가리키는 분절음(segment)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분절음소(segmental phoneme)와는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