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무덤
다른 표기 언어 동의어 토광묘, 土壙墓
요약
토광묘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선사시대부터 등장하여 청동기시대말과 초기 철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 때 일반화되었다. 구덩이의 모습은 묻힌 사람의 머리 쪽이 넓고 아래가 좁은 긴 네모꼴이며, 묻는 방법은 홑무덤과 어울무덤의 2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네모꼴로 판 구덩이에 주검을 직접 묻기(바로움무덤) 시작했는데, 이 방식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뒤 초기 철기시대에는 나무널을 만들어 그 속에 주검을 넣고 구덩이에 묻는 방법(나무널움무덤)이 사용되다가, 차츰 모가 진 나무로 상자 모양의 나무덧널을 만들어 그 안에 1기 또는 2기의 나무널을 놓은 다음 흙을 덮어 봉토를 올리는 형식(나무덧널움무덤)이 쓰였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대동강유역의 부조예군묘·고상 현묘와 경주 조양동, 화순 대곡리 무덤 등이 있다.
토광묘(土壙墓)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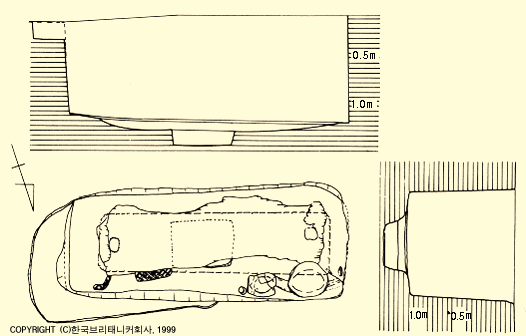
한국에서는 선사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청동기시대말과 이른 철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러 일반화되었지만, 앞시기의 것은 봉토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서 우연하게 찾는 경우가 많다. 구덩이의 모습은 거의가 묻힌 사람의 머리쪽이 넓고 아래가 좁은 긴 네모꼴이며, 묻는 방법은 홑무덤[單葬]과 어울무덤[合葬] 2가지가 있다. 묻은 방법과 서로 관련시켜보면 시기에 따라 크게 3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네모꼴로 판 구덩이에 주검을 직접 묻기(바로움무덤) 시작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그뒤 이른 철기시대가 되면 나무널[木棺]을 만들어 그 속에 주검을 넣고 구덩이에 묻는 방법(나무널움무덤)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다가, 차츰 모가 진 나무로 상자 모양의 나무덧널[木廓]을 만들어 그 안에 1기(基) 또는 2기의 나무널을 놓은 다음 흙을 덮어 봉토를 올리는 형식(나무덧널움무덤)이 쓰였다. 나무덧널움무덤은 움무덤의 발달과정으로 볼 때 짜임새나 모습에서 중요한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중국의 무덤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동강유역의 부조예군묘(夫租濊君墓)·고상 현묘(高常賢墓)와 경주 조양동, 화순 대곡리 무덤 등이 있다. 부조예군묘에서는 "夫租濊君"이라고 새겨진 은도장[銀印]이 나왔는데, 이는 옥저(沃沮)의 족장무덤으로 여겨져 우리 역사의 초기 국가에 관한 실체를 알려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다른 껴묻거리는 세형동검을 비롯한 늦은 시기의 청동기와 쇠검[鐵劍]·철로 만들어진 말갖춤 등 청동기와 철기가 섞여 나와 이 시기의 문화전통에 관한 것은 물론, 한반도와 중국과의 교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경주 조양동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진 비교적 많은 무덤이 조사되었는데 나무덧널움무덤에서 고신라(古新羅)의 대표적인 무덤 모습인 돌무지나무덧널무덤[積石木廓墳]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두드러지며, 이른바 옛 와질토기라는 것과 중국의 전한 때 만들어진 청동거울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와 삼국 초기의 역사발달을 살펴보는 데 중요하다. 삼국시대의 움무덤은 초기에 널리 만들어졌는데 비교적 문헌자료가 없는 고대사를 이해할 때 중요하며, 서울 가락동무덤처럼 한 묘역 안에 독널[甕棺]을 곁들여 만든 다음 봉토에는 표토 가까이에 돌이나 기와를 1겹 깐 점이 돋보인다(→ 조양동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