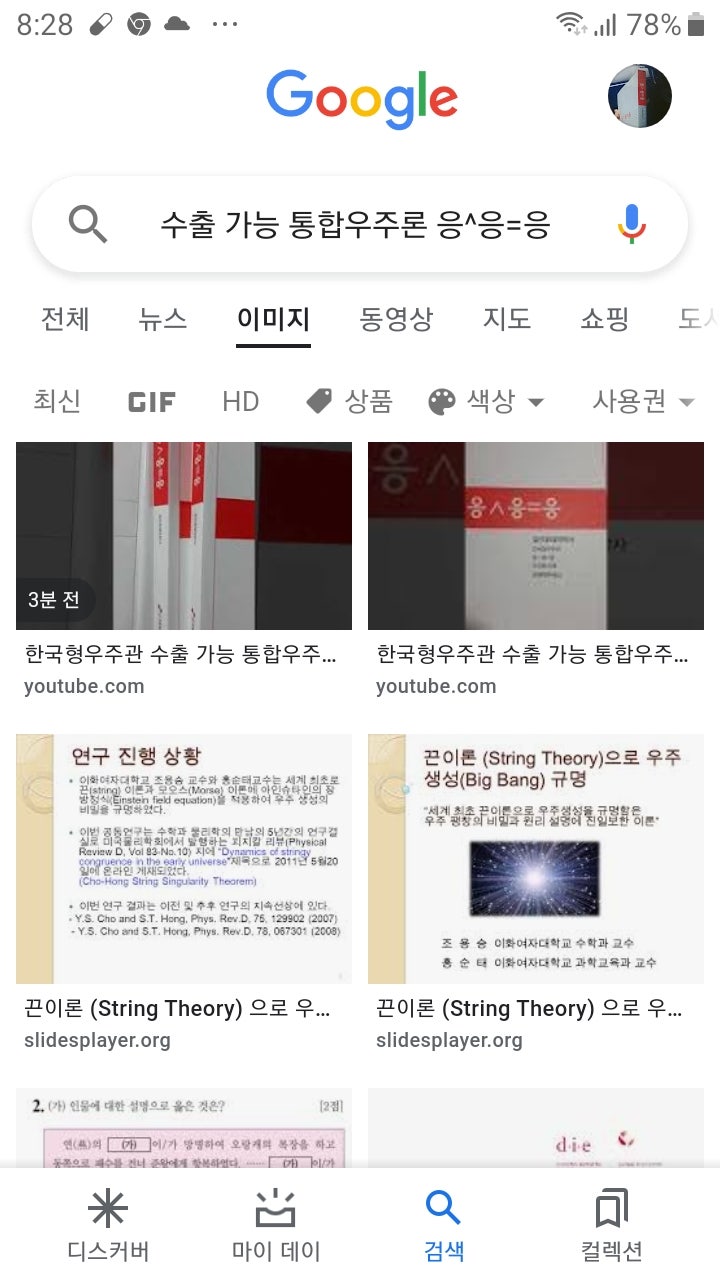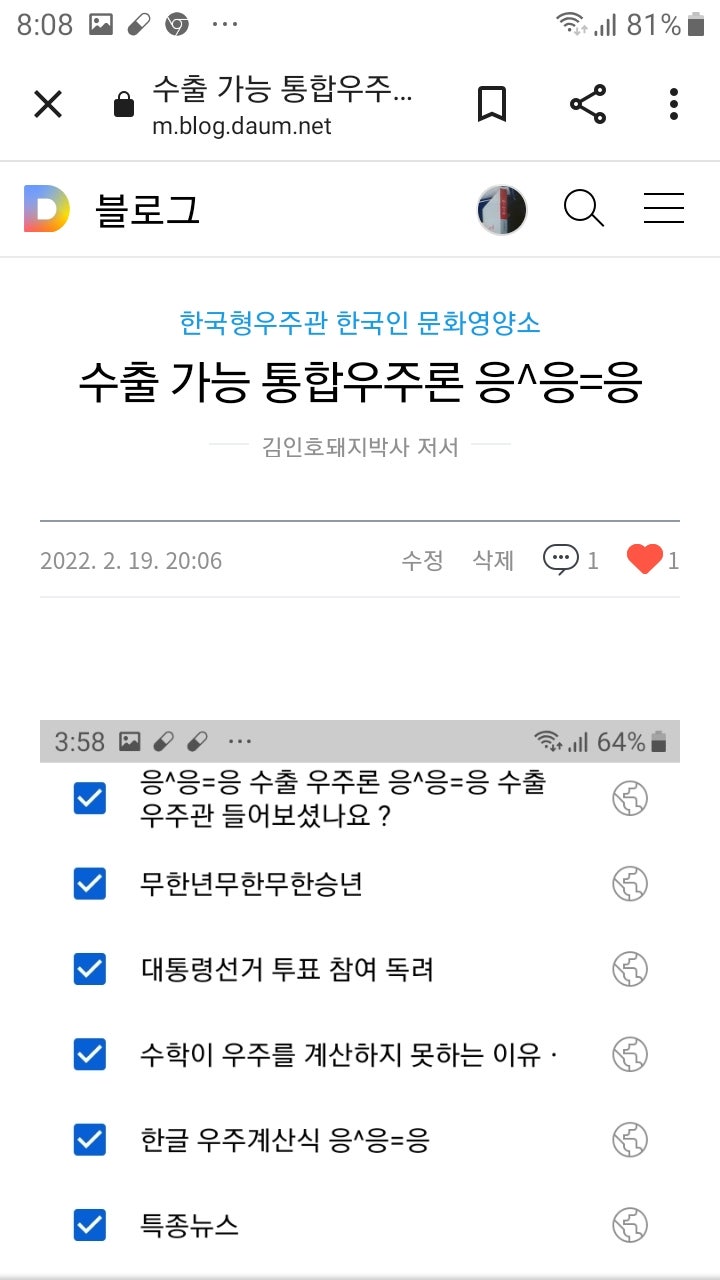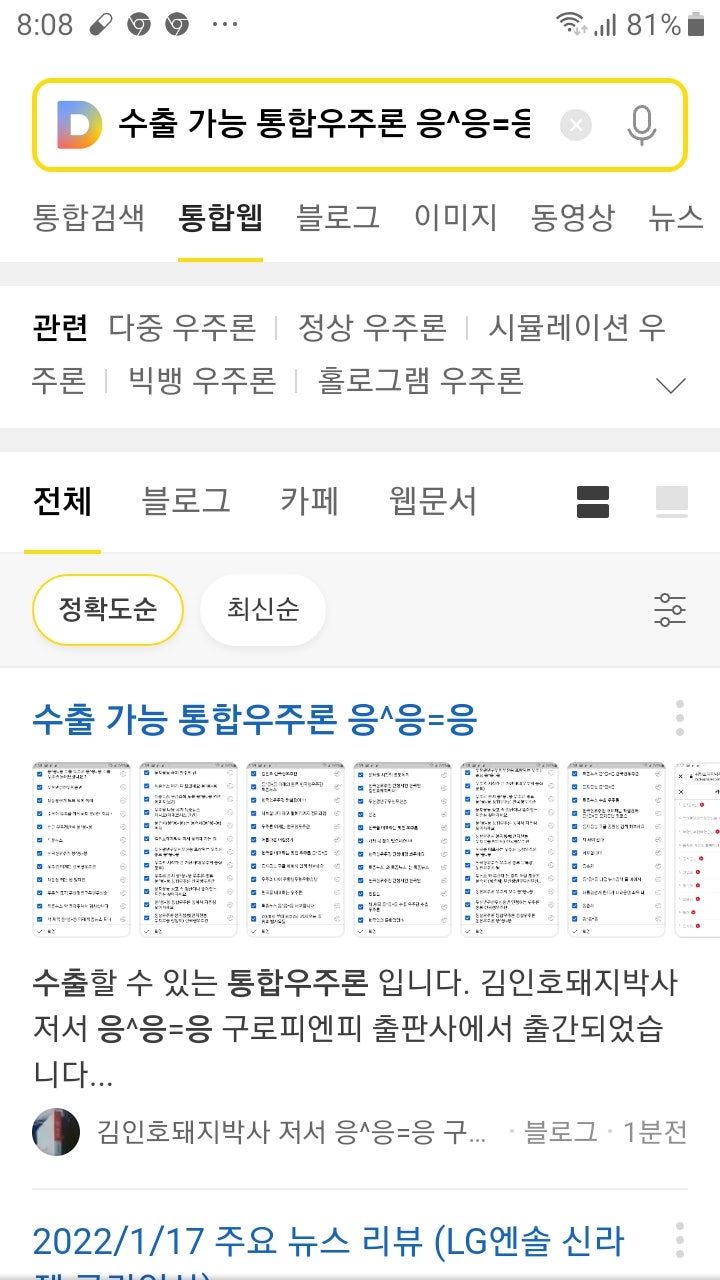제국주의의 이론
Wolfgang J. Mommsen 지음
백영미 옮김
지난 백 년 동안 제국주의에 대한 이론과 실천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킨 문제는 별로 없다. 그리고 오늘날 '제국주의적 imperialist'이란 단어보다 더 무차별하게 마구 사용되는 용어 또한 별로 없다. 이 책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아주 다양하게 서로 다른 제국주의 이론의 입문서가 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1900년이래 제국주의의 역사적 발전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둘째로는 그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다. 몸젠 교수는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주의 이론을 논의하고 최근의 서구 이론을 다룬 다음 마지막으로 신식민주의와 저개발 이론을 논의한다. 그는 논쟁에 상당히 기여한 영국 역사학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종속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변부학파 peripheral school'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자는 흔히 전체 과정을 단일한 하나의 원인으로 간추려 설명하는 이전의 서구 중심적인 제국주의 이론이 현재는 별로 유용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연구와 이론들은 대단히 귀중한 가치가 있으며, 오늘날 산업화된 서구 사회와 제3세계 국가들간의 예각화된 관계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볼프강 J. 몸젠은 1968년부터 뒤셀도르프 대학에서 현대사 교수로 재직해 왔고, 1977년부터는 런던에 있는 독일 역사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근세 정치사, 특히 19세기 및 20세기의 유럽사와 막스 베버의 정치 사상에 관해 몇 권의 책과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책 중에는 제국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Imperialismus in Agypten(1961);
Das Zeitalter des Imperialismus(1969);
(ed.), Der moderne Imperialismus(1971);
The Age of Bureaucracy: Perspectives on the Political Sociology of Max Weber(1974);
Der Imperialismus. Seine geistfigen, ideologischen und wirtschaftlichen Grunglagen(1977).
서문
...이 책에서 이루어진 논평은 그 목적이 제한되어 있다. 첫째 목적은 제국주의 이론에 관한 혼란스러운 관점과 견해들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기술된 견해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부차적인 목적이어서 극히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분석하였다. 현재의 제국주의 연구는 근대제국주의를 그 나름의 특성을 가진 주요한 역사적 현상으로서 고찰하지 않고, 제국주의 일반에 관한 이론적 공식만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는 제국주의 이론의 역사적 차원을 밝히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제국주의 이론들과 처음으로 명확하게 주변부 지역에 주목해 온 이론들의 관계를 조화시키는 일이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후자에 비하면 전자는 지나치게 유럽 중심적이었다. 근대의 제국주의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관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서구 신마르크스주의 이론들의 다양한 흐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전통적인 공식들이 주문처럼 되풀이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분석적인 제국주의 이론을 손상시키는 감이 있다. 이것은 후기 자본주의 단계에서의 자본주의적 세계체제 이론의 단순한 중복에 지나지 않는다. 신마르크스주의적 비평은 산업화된 국가와 제3세계 사이의 현재적 관련에 관한 핵심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서구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하다. 공식적인 경우이든 비공식적인 경우이든 간에 이것은 신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처럼 이 문제들을 제국주의 그 자체의 탓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사실상 특정 산업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국유 사이의 차이에 의해서, 혹은 제국주의적 종속 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든지 와는 관계없이 해당된다..
1976년 7월, 뒤셀도르프에서
"제국주의의 이론" 차례
서문
제1장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
1. 고전적 정치이론
2. 고전적 경제이론
제2장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
1.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2.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의 모택동주의적 변형
제3장 잠정적 평가
제4장 현대 서구의 해석들
1. 극단적 민족주의와 권력정치 현상으로서의 제국주의
2. 객관주의적 이론
3. 사회경제적 이론
4. 자유무역 제국주의 이론
5. 사회적 제국주의 이론
6. 주변부 제국주의 이론
제5장 신식민주의 이론과 저개발 이론
1. 국가독점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
2. 거대독점 지배로서의 제국주의
3. 제국주의의 산물로서의 저개발
4. 구조적 폭력에 기반을 둔 종속으로서의 제국주의
제6장 요약과 전망
옮긴이 후기
제1장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
1. 고전적 정치이론
초기의 제국주의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세기 후반에 발전되어 하인리히 프리드융 Heinrich Friedjung의 "제국주의의 시대 1884-1914 Das Zeitalter des Imperialismus 1884-1914"에 의해 독일 학계에 도입된 고전적인 정치적 해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국주의'란 본래 근대 산업국가가 식민지나 종속지역을 직접 간접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통치자가 유럽이나 해외의 수많은 영토에 대하여 사적으로 종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했다. 사실 나폴레옹 3세 치하의 제2제국은 과감하게 식민지 개척을 시도했다. 이 모험은 실패로 끝났으며 어쨌든 황제의 권위나 실제적 권력을 거의 향상시키지 못했다. 디즈레일리 Disraeli는 1872년 수정궁 Crystal Palace에서 야심적인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을 발표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국내 소비를 의식한 것이었다. 즉, 해외 진출 정책은 왕권을 신장시키고 보수당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선언되고 추구되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의 여제'라는 지위에 취임함으로써 이 정책은 화려하게 마무리되었다. 국내의 動因에 의해 고취된 디즈레일리의 해외 침략 정책을 표현하기 위해 '제국주의'라는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그의 반대자들, 특히 글래드스턴 Gladstone이었다. 제국주의라는 개념은 나중에야 오늘날과 같이 비교적 객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탁월한 제국주의 통치자에 토대를 둔 체제라는 함축적 의미를 잃고, 일반적으로 민족국가가 해외의 속국을 획득하고 가능하다면 그 속국들을 범세계적인 제국으로 통합시키기 위하여 국경 너머로 팽창하는 것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이러한 고전적인 정치적 정의를 현대 학문의 어휘 속에 도입하기 위해 힘쓴 프리드융에게는 제국주의란 특정 민족국가의 지배를 확대하는 데 바쳐지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뜻하는 동시에, 여러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체제를 구성한 강대국간의 끊임없는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을 의미했다. "중단하지 않는 정신은 신생 혹은 기존의 민족국가를 발전시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열에 휩싸였다. 그들은 모국으로부터 지구의 끝까지 퍼져나갔으며, 항상 존재해 왔으나 그다지 강력하지는 못했던 충동으로서 '제국주의'라는 이름을 고안해냈다." 독일뿐 아니라 서구의 다른 지역에서도 제국주의는 원래 권력 정치 power politics 현상으로서 유럽 강대국이 지구의 모든 지역에 지배를 확대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개념으로서 국가를 역사의 결정적 動因으로 보고, 지배계층에 팽배했던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에는 단지 2차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국주의는 피정복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체로 저개발 지역에 강제적으로 정치적 지배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식민제국을 획득하는 목적은 대개 자국의 권위를 높이고, 이상적으로는 그것을 세계 강대국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그 한 예로 하인리히 폰 트라이치케 Heinrich von Treitschke는 19세기말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현재까지 독일은 서구 강대국간의 비서구지역 분할에서 너무 적은 몫만을 차지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일등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해외에서 세력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렇지 못할 때엔 영국과 러시아가 세계를 양분하는 불길한 사태가 예상되며, 그런 경우 러시아나 영국 중에 어느 쪽이 더 부도덕하고 두려운 상대가 될지 말하기가 힘이 들 것이다.
1907년에 오토 힌쩨 Otto Hintze는 똑같은 문제를 보다 온건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지적했다.
경제 정치 문제에 쏟는 에너지의 양이 누가 미래의 세계 체제에서 강대국이 되는가를 결정할 것이다. 강대국의 지위를 얻기 위한 싸움은 현대 세계에서 제국주의 운동의 참된 본질이다. 그것은 고대에서처럼 한 강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국가들이 선별되는 문제이다.
당시의 영국과 프랑스의 사상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피력했다. 죠셉 챔벌린 Joseph Chamberlain과 폴 르로이-볼리외 Paul Leroy-Beaulieu는 유럽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거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았다. 즉, 미래의 세계는 대제국들에 의해 지배될 것이며, 그 대열에 끼지 못하는 민족 국가들은 열등한 지위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본 것이다. 챔벌린은 1897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시대의 추세는 모든 세력을 보다 강대한 제국의 손아귀에 던져 넣고 있으며, 진취적이지 못한 약소국들은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위치로 떨어질 운명인 것처럼 보인다."
1914년 이전에 독일에서는 막스 렌쯔 Max Lenz와 에리히 마르크스 Erich Marcks가 유럽적인 정치 체제로부터 세계 국가체제로의 필연적인 이행이라는 이론에서 같은 생각을 피력했는데, 그것은 독일이 2등국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이었다. 유럽의 세력 균형을 세계의 균형상태로 변환시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영국과의 심각한 갈등을 수반할지라도 독일이 지닌 역사적 사명이었다. 앵글로색슨 국가들 안에서도 비슷한말들이 나오고 있었다. 예를 들면 존 실리 John Seeley 경은 영국의 팽창을 대체로 대영 제국을 건설하고 영국 민족의 통일을 영원히 보존하는 데 바쳐지는 국가적 책임으로 보았다. 미국에서는 존 윌리암 버제스 John William Burges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헤겔의 국가 개념을 기초로 하여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이 되는 것을 불가피하게 여겼다.
이처럼 국가 지향적인 제국주의 이론은 거의 전적으로 영토적인 견지에서 생각되었는데, 민족주의라는 관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것은 제국주의가 대체로 민족국가 건설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자료들은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한 폭넓은 민족주의적 주장들을 제공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힘에 의해서라도 민족국가의 영토를 확장하고 해외 제국을 건설하려는 강력한 정책을, 일부에서는 민족 정신을 보존 강화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활력의 원천으로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1880년대의 초기 제국주의자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독일 사상가들 중에서 막스 베버는 1894년 프라이브르크 Freiburg대학에서의 취임사에서 이것을 가장 예리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이 과거에 국가가 수행한 초기의 공적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독일을 세계의 강대국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었다면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면서 통일을 할 필요는 없었다." 죠셉 챔벌린은 제국주의적 팽창이나 대영 제국의 유지 또는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주로 경제적인 논의를 해왔지만, 때로는 제국주의를 민족주의의 확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제국주의라는 정치적 관념의 민족주의적 변형은 주요한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극도로 중요하였다. 그러나 민족적 필요로서의 제국주의라는 공식은 극히 유동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관념은 현재에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31년에 아르투르 잘쯔 Arthur Salz는 민족의 관념을 "국가 제국주의의 가장 강력한 추진력"으로 보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근대의 제국주의는 경제적 기초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 또는 감정적 기초에 의존해 있었다. 즉, 그는 제국주의를 "근대 유럽의 새로운 심리구조"라 칭하고, 그 최고의 표현을 근대 민족주의에서 찾았다. 마찬가지로 발터 슐쯔바하 Walther Sulzbach도 제국주의라는 현상을 민족주의의 표현으로서 설명하려고 했다.
우리는 지난 19세기 후반에 점차적으로 대두한 민족주의적 제국주의 개념이 인종적 생물학적으로 변형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제국주의에 따르면, 백인들은 선천적으로 다른 유색 인종들보다 우월하므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백인들의 사명이며 또한 의무였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적 진화론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그것에 따르면 인종들간의 생존경쟁은 역사의 기본 법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14년 이전의 영국과 독일의 제국주의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벤자민 키드 Benjamin Kidd와 칼 피어슨 Karl Pearson의 저작에서,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Friedrich Naumann, 특히 프리드리히 폰 베른하르디 Friedrich von Bernhardi와 하우스턴 스튜어트 챔벌린 Houston Stewart Chamberlain의 저서에서 그러한 경향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제국주의를 인종적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치 못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한 사고방식의 잔재가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누구도 섣불리 그것을 공공연하게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특수한 형태의 제국주의는 과거의 유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2. 고전적 경제이론
마르크스주의자들뿐 아니라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이론가들도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체제를 처녀지 또는 오늘날 말하는 저개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진 않더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견해는 헤겔의 "법철학 Rechtsphilosophie"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경제에는 해외 시장과 투자 기회가 필요하며 제국주의적 수단으로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1879년 이전의 부르주아 사상에 거의 항상 포함되어 있는 요소임을 알게 된다. 보다 이전의 자유주의 이론은 문명, 교역과 산업을 전 지구상에 전파하는 일은 하나의 사명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공식적으로 정치적 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국제 무역과 수출 증대에 입각한 경제 질서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은 보다 좁은 의미에서의 제국주의에 오랫동안 반대했었다. 그들은 몇몇 기업들이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서 그 사회를 희생시켜 가면서 독점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에, 그 결과로 경제 성정의 과정을 왜곡시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자유진영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각 국가에 의한 해외 영토 획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것은 많은 산업 국가들이 점차로 보호 관세 정책으로 바꾼 뒤 - 독일은 1879년에, 프랑스는 약간의 식민지를 획득한 1890년대에, 그리고 미국은 세기의 전환기에 - 였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널리 퍼지기는 했지만, 부르주아 진영에서 그런 견해를 실제로 체계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예컨대, 1914년 이전의 독일 좌파 자유주의의 대표자였던 테오도르 바르트 Theodor Barth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제국주의는 국력의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다소 폭력적으로 세계 경제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그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분명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르주아 진영에서는 공식적인 제국주의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경제적 팽창으로 충분한지에 대해 대단히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 제국주의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국민 경제에 새로운 원료원과 시장 및 수익성 있는 해외 투자분야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데는 비교적 분명한 의견 일치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873년 이래로 국제 경제의 발전 속도가 늦춰지기 시작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대체로 가격의 하락과 상당한 이윤의 감소가 있었던 것이다. 모든 산업국가의 부르주아 계급들은 국민 경제에 식민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대체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것은 단순히 직접 관련된 기업들이 로비활동을 한 결과는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이 철저하게 검토된 적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그것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찬반 논쟁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상대자로 기능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경제적 이익과 제국적 팽창의 연관성은 대체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으며, 단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비판적으로 검토되었을 뿐이다. 영국의 급진주의 잡지에 기고했던 미국인 찰스 코난트 Charles A. Conant와 홉슨 J. A. Hobson이 그들이었다. 특히 홉슨은 20세기초에 근대 제국주의 이론에 관한 책을 펴냈다. 현재에 와서는 그것의 거의 모든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긴 하였지만, 그 분야에서는 하나의 고전이며 당시에는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존 앳킨스 홉슨(1858-1940)은 영국 자유당의 좌파에 속하는 정치 평론가로서, 항상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주의가 노동계급에게 친화력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맨체스터 가디언 Manchester Guardian 지의 특파원으로 직접 목격한 보어 전쟁 Boer War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제국주의를 해석하고 있다.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영국 급진주의의 전통에 입각해 있는데, 그는 항상 침략적 대외 정책을 날카롭게 반대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 제한 없는 자유무역이라는 이상을 갖고 있었다. 홉슨은 1902년에 출판된 "제국주의 Imperialism"에서 보어 전쟁 초기에 영국에 만연된 호전적인 분위기를 비난했으며, 그것을 자본가의 이익이라는 입장에 서 있던 언론의 구속받지 않은 선전 탓으로 돌렸다. 그의 주요한 목표는 제국주의 정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주의를 보호하고 항구적인 사회 개혁 정책의 길을 닦는 것이었다. 그의 이론의 근원이 영국의 주요 산업 도시에서의 대중의 빈곤이라는 문제에 대한 연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많은 통계를 통해 홉슨은 당시 수십년 사이에 대영 제국이 팽창한 것은 해외 투자의 막대한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그는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경제계가 국내 시장의 침식을 고려하여 해외에서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추리했다. 제국주의 정책의 주요 동기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경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내에서의 이윤 체감을 보충하기 위한 수익성 있는 투자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남아프리카에서 이것의 고전적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홉슨이 모든 상황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제국주의 정책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막대한 군사적 정치적 희생을 치러야 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 비인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근대 제국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가져오는 것은 자본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하층 계급에게 국내 생산 종에서 정당한 몫이 돌려지는 것을 거부하는 영국 사회의 금권적 구조였다. 노동자 대중은 국민 생산 중에서 얼마 안되는 몫만을 할당받고 있고, 그리하여 사회의 부는 소수의 상류 계급에게 집중되므로 한편으로는 고질적인 과저축, 즉 투자를 모색하는 과도한 자본 축적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비, 즉 국내 시장에서의 불충분한 수요가 존재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적 잠재력과 대중의 불충분한 구매력 사이의 모순을 야기시키며, 그 결과 수익성 있는 투자를 위해 점점 첨예한 경쟁이 늘게 되고, 불가피하게 이윤은 감소된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점점 더 해외로 투자를 하게 되고, 특히 아직 경제적으로 개방되지 않은 식민지역에 투자하게 되는데, 그것은 해외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국내 시장에서 낮은 자본 이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상류계급은 대중의 호전성을 자극하여 정부에 압력을 넣는 정책을 점차 답변확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해외 영토를 획득하고 자본 투자가들, 특히 본국의 투자가들에게 그 영토를 개방시키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 노력, 필요하다면 군사력조차 이용될 수 있다. 홉슨의 견해로는 막대한 영국의 해외투자의 증대와 1880년 이후의 놀랄만한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의 획득 또는 확장 추세는 상대적인 경제적 침체와 영국 내에서의 노동자 대중의 낮은 생활 수준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는 대중의 구매력이 향상될 수 있다면 국내에서 투자를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길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결국은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하는 폭력적 수단에 의한 해외 팽창정책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홉슨은 사회 전체의 보다 폭넓은 경제적 이익이란 관점에서 제국주의는 이윤의 원천이 아니라 손실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산업이 계속 팽창하기 위해선 해외로 배출구를 터야 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날 입증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통계를 들어 영국이 1870년 이후 획득한 식민지와의 교역은 유럽의 다른 산업 국가들과의 교역에 비교할 때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죠셉 챔벌린과 그 추종자들이 제국주의적 선호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옹호하면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럽의 무역에 대한 식민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어떠한 경우든 저개발 지역과의 무역수지는 거대한 해외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군사, 행정의 막대한 배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홉슨에 의하면 배후에서 강대국의 식민지 획득경쟁을 획책하는 주요한 인물은 무역업자와 사업가가 아니라 투자가, 엄밀히 말해 자본가이다.
납세자들에게 비싼 비용을 부담시키고, 제조업자와 무역업자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많은 위험이 따르는 침략적 제국주의는, 국내에서는 자본을 가지고 있으나 이윤을 얻기 힘들어 정부가 해외투자를 보장하고 이윤을 얻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투자가들에게는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원천인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제국주의는 국내 시장에서 이윤을 얻지 못한 잉여자본이 첨예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것이다.
보어 전쟁의 경우에 자명한 것 같은 이러한 이론은 금세기의 전환기에 나타난 영국 경제상황의 주요한 여러 특징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 국내에서의 이익률은 2%-4%로 현재의 기준에서 볼 때 극히 낮은 반면, 해외에서의 사본의 수익성은 큰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높다. 국내 경제가 명백한 침체의 징조를 보이고, 실질임금 상승률은 사실상 정체상태에 빠졌지만, 영국의 해외 투자는 극적인 증가를 보였다. 1880년에 총 해외투자는 약 2조 파운드였는데 1913년에는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 자본의 거의 전부였다. 홉슨은 이러한 상황을 세이 Say의 저소비 이론에 비추어 해석했다. 소수의 상류 계급에 의한 초과 저축은 대중의 저소비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내시장의 침체를 가져오고 투자를 모색하는 과잉자본을 낳는다. 그 결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의 경제 발전에 해롭지만 소수의 자본가 집단에게는 이로운 제국주의의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제국주의 정책이 대중의 물질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모순되는데도 어떻게 대중이 제국을 위한 민족주의적 광신주의에 도취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홉슨은 그것이 해외 투자에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소수의 지배계층이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족주의적 열정을 고취하기 위해 대중 언론을 이용함으로써 지배계층은 대중에게 제국주의의 이념을 납득시킬 수 있었으며, 그들이 자본주의에서 얻어지는 한정된 이익을 지지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이처럼 제국주의에 대한 홉슨의 경제적 분석은 대중 행태에 대한 사회-정치적 Socio-political 분석에 의해 보완되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전적인 설득력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대체로 홉슨은 자본주의 그 자체의 반대자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아담 스미스나 콥던 Cobden과 더불어 자본주의 진영의 산업발전이 원칙적으로 새롭고 보다 인간적인 세계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유 무역의 신봉자였다. 그의 결론은, "새로운 시장과 투자 지역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국내에서 상품과 자본의 흡수를 막는 소비력의 불균등한 분배"라는 것이다. 근대 경제 이론의 입장으로부터 확실히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러한 견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1) 홉슨의 견해는 대중의 구매력이 충분히 증대된다면 국내 시장은 거의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본의 해외로의 배출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2) 그는 국가가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를 조정하고 대중의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체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결국 케인즈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홉슨이 그의 분석에서 얻어낸 결론은 결코 급진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경제체제내의 불균형은 대중의 구매력을 높이고, 특히 폭넓은 기반을 가진 사회 정책에 의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영국 사회의 위계적 구조를 완화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었다. 또한 제국주의는 "모든 경제적 이해에 적당하게 똑같이 비중을 두는 바람직한 자유 방임적 민주주의"에 의해 곧 폐기되어야 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원리에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를 상류 계급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대중을 경제 발전 상태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만큼의 낮은 생활수준에 묶어 두면서도 대중의 욕망을 자극하여 대중 심리를 조작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치기구로부터 생겨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국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질서의 결과로 생겨난 독점구조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홉슨을 제국주의에 대한 급진적 자유주의 비평가, 완전경쟁의 경제를 회복함으로써 진보적 형태의 급진적 자유주의의 승리를 가져오고자 했던 아담 스미스와 콥던의 자유주의적 견해를 지지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제국주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치적으로 시대 착오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수한 현상이었다. 즉, 그것은 결코 자본주의 그 자체의 필연적 산물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제국주의를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자본가 집단에 의해 주장된 운동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적인 국민들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사회라는 대안에 대립시켰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로는 이처럼 민주적인 국민들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사회야말로, 경제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자제의 덕분으로, 미래의 자유로운 국가들의 범세계적인 연방을 이루는 데 적합한 것이었다.
홉슨의 제국주의론이 미친 영향은 다양하고 광범위했다. 레닌이 그의 유명한 저서인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단계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에서 홉슨의 자료와 주장을 확대하여 이용했다는 사실이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한편, 힐퍼딩 Hilferding은 홉슨의 견해가 사실상 자기의 견해와 매우 흡사한데도 홉슨의 견해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다. 홉슨의 생각이 레닌의 저서에 가장 직접적이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그가 레닌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리 홉슨은 자본주의가 그 약탈적인 면을 제거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미래의 자본주의 질서가 정통적인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각 세력들 간의 상호 작용에 맡겨질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즉, 그는 자본주의가 권력의 일방적인 특권과 지위를 배제하고 모든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민주적 감독 아래 항상 통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홉슨의 이론은 자본 투자와 제국주의 정책을 연결시켰다는 점뿐 아니라,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대중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계층이 사회에 대해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강요할 수 있었던 정치적 상황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특히 인상적이다. 뒤에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는 호전주의 jingoism에 대한 홉슨의 사회심리학적 설명을 받아들여 제국주의를 대중 운동으로서의 파시즘과 연결시켜 보다 넓은 맥락으로 발전시켰는데, 그 두 가지는 근대사회가 자유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질서의 원리로부터 분리될 때, 또 그럴 때에 한해서만 생겨났던 것이다. 한편 홉슨이 주장하는 자본 수출과 식민지 획득 사이의 직접적 상관관계는 통계적 자료로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은행이 특정한 산업부문보다 제국주의적 정복에는 훨씬 관심이 적다는 것도 역시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홉슨은 자본가의 이익에 의해 여론이 효과적으로 조작된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국주의와 사회구조, 제국주의와 경제적 요인들과의 연계성을 지적한 최초의 인물로 평가받을 만하다.
전문적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홉슨의 이론이 경제체제의 분화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아마추어적인 것이라고 무시했다. 그러나 특히 케인즈가 홉슨의 견해를 재발견하고, 약점이 있긴 하지만 그의 과소 소비 이론을 재생해 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마도 부르주아 제국주의 이론에 대해 홉슨이 미친 가장 지대한 영향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해 응답하고자 의식적으로 쓰여져 1919년에 출판된 슘페터 Schumpeter의 "제국주의의 사회학 The Sociology of Imperialism"이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자본주의의 전성기에 있던 영국 사회의 위계적 구조에 있지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홉슨의 견해는, 지배 계급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민족적인 명예나 위신과 같은 관념들이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호전적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슘페터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슘페터의 이론을 살펴보기에 앞서 1914년 이전의 제국주의의 이론적 개념들의 발전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체로 그것들은 그리 광범위하지는 못하다. 이 시기에 부르주아 계급 내에서 자본주의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려는 시도는 별로 없거나 혹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막스 베버 Max Weber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제국주의에 대해 일관성 있는 이론을 발전시키지는 못했어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이론의 중요한 요소들을 짜맞추었기 때문이다. 베버는 강대국들이 해외 팽창에 참여하게끔 하는 위세 prestige의 측면에 대하여 언급하고, 국가 통치권의 확대가 당연히 지배계급의 사회적 권위를 높이고 특권적 지위와 정치적 우월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제국주의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세계를 정상적으로 위압하는 모든 성공적인 제국주의 정책은 - 혹은 적어도 처음에는 - 국내에서의 특권을 강화하고 그와 더불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지도력을 갖고 있는 특권 계급이나 집단, 정당들의 영향력과 권력을 강화하게 된다."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한 이처럼 현저히 사회학적인 동기는 특히 지배 엘리트의 구미를 당겼다. 그리고 베버의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대개 특수한 경제적 이익, 특히 공식적인 자유 시장에서 상품의 생산, 교환에 만족하는 대신에 독점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모든 종류의 독점적 이권은 특히 제국주의 정책의 맥락에서 발생하기 쉽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기회에 금융단체나 기업들 - 그들 중에 무기 제조업자들이 가장 중요하다 - 은 발벗고 나서서 제국주의적 팽창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베버는 이러한 형태의 '약탈적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사실 그것은 시장의 틀 속에서 상품의 생산과 합리적 교환에 기초한 경제체제로서의 순수한 자본주의의 기생적 형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막스 베버는 민족 문화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들의 특수한 이익을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민족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의 근저에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며, 1914년 이전의 시기에 과 부르주아에게 특히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 보았다.
한 국가 안에서 일반인의 행위를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모든 집단들이 권위라는 이상주의적인 열기에 가장 심하게 휩싸여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국가를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제국주의적 권력 구조라고 생각하는 특수하고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제국주의적 이익 외에도, 하나의 국가 안에서 여러모로 특권을 부여받고 또 실로 존재 그 자체에 의해 특권이 보장된 계층의 이념적 이익 및 간접적으로 물질적인 이익도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공동체 성원 사이에 확산된 특정한 '문화'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거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베버의 관찰은 이전의 정치적 제국주의 이론과 근대의 사회학적 제국주의 이론의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이미 체계적인 이론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아주 일방적인 형태이긴 했지만 특히 슘페터에 의해 답변확정되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슘페터의 견해는 세부적인 면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다시피 근대 서구 이론의 중요한 원천을 이루고 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홉슨의 해석과 비교해 볼 때 슘페터는 보다 확실한 이론적 근거에 입각해 있다. 게다가 그의 해석은 세계사에 대한 웅대하고 광범위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동시에 두 사람은 출발점이나 이념적 전제에 있어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홉슨과 마찬가지로 슘페터는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급진적 자유주의자이지만 마르크스주의적 도식에는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 또한 그는 홉슨과 마찬가지로 고전적 자유무역론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범세계적인 참여의 기회를 개방한 영국 자본주의 경제모델을 자신의 지침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대한 슘페터의 분석은 힐퍼딩과 로자 룩셈부르크 Rosa Luxemburg의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거기에 맞서 극히 최근뿐 아니라 B.C. 3천년 전으로부터 예를 끌어내면서 모든 시대의 제국주의 현상을 폭넓게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슘페터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산업화 이전 시대의 정치 구조로부터 '격세 유전'의 한 형태로서 자본주의 시대에로 이전된 잔존물이라고 결론지었다.
슘페터는 제국주의를 "국가가 무제한의 무력팽창을 하려고 하는 무목적적인 성향"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제국주의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경향의 결과가 아니고 전제적인 지배자의 심리적 태도의 결과이다. 즉, 보다 엄밀히 말해 제국주의는 지배 계급이 역사의 과정에서 호전적 열정이나 성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사회적 보상과 결합시킨 결과의 산물인 셈이다. 합리적 이익이 아니라 일정한 공리적인 한계가 없는 무력 팽창으로서의 '무목적적'인 경향 - 즉, 비합리적이고 무합리적이며 순전히 전쟁과 정복을 지향하는 본능적인 성향 - 이 바로 제국주의의 진짜 동기인 것이다. 이런 명제는 역사상의 풍부한 실례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예컨대 상층 지배계급이 이념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제국주의가 대중을 즐겁게 해주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페르시아 제국이나 고대 로마가 그러하다. 또한 루이 14세 치하의 프랑스에서 무력한 군주는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가장 잘 정당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슘페터는 전쟁과 침략이 봉건적인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프러시아 군국주의의 전쟁 지향적 성향에 관한 통념의 형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간단히 말해서 슘페터는 근대의 제국주의를 절대 군주시대로부터 내려온 정치구조의 잔재로 보았다. 그는 근대의 민족주의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군국주의와 절대주의의 사회적 전통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보고 민족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민족주의는 침략적인 우월감을 의미함과 동시에 민족성에 대한 긍정적 안식을 뜻한다."
슘페터는 이러한 전통적인 정치구조를 근대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사회의 직접적 대립물로서 생각했다. 후자는 원칙적으로 세계주의적이며 자유로운 경제적 문화적 지적 교환의 체제 내에서 평화적인 타협을 지향한다. 강대국의 민족주의와 대중의 호전적인 열정 속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구시대 사회구조의 잔재와는 대조적으로, 근대의 시장 지향적인 산업자본주의는 평화적인 새로운 인간형을 낳고 전반적으로 아주 다른 유형의 성격을 가져올 전적으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대표한다. "순수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한때 전쟁을 위한 에너지였던 것이 단순히 모든 종류의 노동을 위한 에너지로 된다." 역설적으로 슘페터는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 노동자야말로 새로운 질서를 대표하며, 어디서 생겨나든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라고 찬양했다. 이러한 사회 정치적 가설로부터 그는 "순수한 자본주의 사회는 결코 제국주의적 충동을 위한 토양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反제국주의적"이며, "따라서 자본주의로부터 실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제국주의적 경향을 끌어낼 수 없으며, 제국주의적 경향은 외부로부터 자본주의적 요인들에 의해 유지되는 자본주의와 무관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
이리하여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발전도상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구사회의 구조가 잔존한 결과이며,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가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의 전환기적 현상이다. 슘페터는 미래에는 자본주의의 발달이 제국주의의 심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 정책이 수행될 여지를 점점 더 적게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원칙적으로 그는 경쟁과 자유시장에 토대를 둔 적어도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일체의 귀족적인 사회형태들의 대안이며, 그것들에 고유한 모든 종류의 폭력이나 '무목적적인' 팽창에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필연적 단계로 보거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계의 길은 제국주의와 같은 심리적 태도에 호의적이지도 않고, 자본주의 경제의 이익이나 그 상층 계급조차도 제국주의 정책을 명확하게 지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슘페터는 독점자본주의가 인위적인 관세 장벽, 카르텔 및 모든 종류의 결합을 통해 시장을 조작하고자 함으로써 경쟁의 원칙이 어느 정도 실행될 수 없었던 1914년 이전의 조건 속에서는 사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 독점자본주의라는 조건 속에서는 기업들이나 고도의 재력은 실로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슘페터에 의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유력한 집단 내에서는 보호관세와 카르텔, 독점 가격, 강제 수출(덤핑), 침략적 경제정책, 침략적 대외 정책 및 전형적으로 제국주의적 특성을 지닌 팽창 전쟁을 포함한 전쟁 등을 통해서 강력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일단 이익의 제휴가 존재하면 다소 다른 동기에 의한 팽창에서 얻어지는 보다 강력한 이익이 부가된다. 즉, 자기 만족적인 전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원료와 식료품을 생산하는 영토를 정복하여 얻어지는 이익이다. 또 다른 이익은 전시의 소비 증가에서 얻어진다. 서로 경쟁하는 조직화되지 않은 많은 자본가들은 그런 경우에 기껏해야 미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이지만, 조직화된 자본은 분명히 막대한 이윤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쟁과 국제적인 적대를 통한 정치적 이익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층의 불안정한 지위로부터 생겨난다. 지도층은 소수이며 극히 비대중적이다. 그들이 취하는 정책의 본질은 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하찮다는 것을 안다. 모든 형태의 소유에 대한 공격은 혁명적인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카르텔 유력자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공격은 비교적 위험도 적고,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지도 않으며,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일정한 상황하에서 그것은 모든 정치 집단을 결속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한 위협의 존재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전략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고도의 보호주의적 경제에서 자본주의, 혹은 보다 엄밀히 말해 상품과 자본의 수출은 일정하게 '침략적'일 수 있고, 제국주의적 행위와 제국주의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슘페터는 이러한 현상들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독점 구조는 정치 체제가 그것을 특히 조장할 때 - 예컨대 고율 관세정책에 의해 - 생겨날 뿐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것도 경제체제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사회의 민주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슘페터는 당시의 독점 자본주의를 자유 민주적인 정치체제하에서 경쟁하는 독립적인 기업들의 자유체제라는 이상과 대비시켰다. 독점 자본주의는 정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자본가 계급이 산업화 이전 시대의 귀족적인 형태의 사회구조가 남긴 잔재에 영향을 받아, 자유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제적 경쟁을 허용하지 않고 독점을 실시하는 데로 전락하기 때문에만 가능했다. 명분은 동일한 반동적 집단에 봉사하는 집단의 민족주의적인 선동에 의해 주어졌다. 그러나 슘페터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이와 반대의 추세이므로 자본주의 체제가 보다 민주적으로 됨에 따라 독점 구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구식의 지배계급이 뒤로 물러나게 됨에 따라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전투적인 본능'은 그 중요성을 상실하고,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경향도 점차 과거의 일로 될 것이다.
슘페터의 제국주의 이론이 지니는 약점은 오늘날 너무도 명백하다.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에 대한 그의 대안은 전적으로 자유시장의 법칙에 의해 운영되는 자유 방임 경제의 자유주의적 유형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공동체를 희생시키면서 사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는 독점적 구조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1918년의 조건 속에서 이러한 묘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화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의 결과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슘페터의 이론은 관념적인 형태로나마 경제활동과 이윤이 자유시장 경쟁의 법칙에 따르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와, 독점과 착취에 근거한 제국주의 체제 사이를 근본적으로 대비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것은 평화적인 교역에 기초한 정상적인 자본주의와 독점적 기회를 이용하려 애쓰는 '약탈적 자본주의'를 구분한 막스 베버의 견해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도로 사회집단의 행태에 대한 슘페터의 사회 심리학적 설명은 어떤 점에서 프로이드를 연상케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에 만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슘페터는 인간의 유형이나 어떤 사회 체제에서의 인간행태의 특수한 형식에 주어진 체제적인 특혜에는 관심을 쏟았지만, 특정집단의 경제적 이익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그의 견해로는 역사의 과정을 결정하는 참된 요인은 전자이다. 게다가 그는 자유무역과 제국주의를 분명하게 가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전반에 많은 '자유무역 제국주의 free-trade imperialism'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유지되기가 어렵다. 슘페터가 비제국주의적인 것으로 분류했던 많은 현상들이 오늘날 1914년 이전의 20년 동안에 있었던 미국의 경제적 팽창주의처럼 '자유무역 제국주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계사적인 시각에서의 제국주의에 대한 슘페터의 분석은 매우 뛰어난 업적이다. 그의 뛰어난 점은 사회내의 특정집단, 특히 지배계급의 전형적인 행동양식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그는 자본주의 체제나 비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이 어떻게 제국주의적 팽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자 했던 근대의 사회학적 이론에로의 길을 마련했다. 슘페터의 이론이 여러모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근대의 제국주의에 대한 최근의 여러 해석들에서 여전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을 방해하는 정치적 요인을 보다 강조하는 로스토우 Walt W. Rostow와 같은 사람들이나,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권력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는 지배계층에게서 나타나는 제국주의적 경향을 본래의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유인들이 오랫동안 작용하지 못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는 분명한 형태로 계속 존재할지도 모른다.
제2장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
1.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의 근원은 19세기의 부르주아 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저술에서 각기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은 조만간 정지될 것이고 따라서 이렇다 할 경제적 성장이 없는 '정체 상태'를 초래하리라는 이론은 19세기초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 예컨대 밀 John Stuart Mill에게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종종 그것은 정체의 위협이 최소한 일시적으로나마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해 회피될 수 있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열의 사상이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었다. 예를 들어 막스 베버에게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처음에는 자본주의의 팽창이 주로 경제적인 '자유 지역'의 존재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가, 결국에는 제국주의를 강경하게 지지했다.
완전한 정치적 무지와 고지식한 낙관주의만으로는 외견상 평화적인 경쟁의 시기를 겪은 부르주아 문명국의 불가피한 팽창주의적 무역 정책이 지금 어떤 지점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그 지점에서는 세계의 경제적 지배에서 차지할 몫이 얼마이고, 거기에 수반하여 국민과 특히 노동 계급에게 이용될 수 있는 경제적 개선의 범위가 얼마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힘에 의해서 뿐이다.
"다수 대중의 표준적인 생활이 생계수준 - 사회의 한 구성원에게 필수적인 것으로서 자동적으로 규제되는 수준 - 이하로 떨어진" 그 당시에, 헤겔은 식민주의 현상을 부르주아 사회가 두 계급(이 용어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었지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과 관련시켜 생각했다. 그는 산업화의 진전이 사회를 하층 계급과 소수의 부유 계급으로 양극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부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시민 사회는 그리 풍족하지 못하다. 즉, 그 자체의 자원은 극빈과 빈곤한 하층 계급이 생겨나는 것을 억제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시민 사회의 내적인 변증법은 시민 사회 - 적어도 특정한 시민 사회 - 가 그 한계를 벗어나 시장을 찾고, 그리하여 과잉 생산된 상품이 없거나 또는 그밖에 대체로 산업이 뒤떨어진 지역에서 필요한 생존 수단을 찾게끔 몰아간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식민화는 이미 사회가 두 계급으로 갈라지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헤겔의 철학적 저작에 깊이 정통했던 마르크스는 신기하게도 헤겔의 이런 특이한 생각을 찾아내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자유 무역의 시대이자 구식의 식민주의가 몰락하던 시대에 글을 썼다. 그가 관찰한 분야는 초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이었으며, 그는 식민주의가 초기 자본주의의 특수한 현상으로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근대적인 의미와는 아주 다르게, 나폴레옹 3세의 개인적인 통치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마르크스는 당시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전기 식민주의의 독점적 관행은 전능한 '세계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이데올로기 The German Ideology"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고립된 개인들이 자신의 활동을 세계사적인 행위로 확대하면서 그들에게는 낯선 힘 아래, ...즉 점점 더 거대해져서 결국에는 세계시장이 되는 힘 아래 더욱 더 속박되었다는 것은 경험적 사실이다." 이전의 경제학자들처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어떤 일반적 개념들로 환원될 수 있는 본질적으로 폐쇄된 체제로서 해석하고, 그리하여 앞으로의 자본주의의 발전이 논리적으로 연역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산업자본주의의 범세계적인 팽창이 불가피하며 객관적으로 볼 때 진보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는 시대에 되진 사회 경제 체제의 붕괴를, 부르주아 사회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필연적인 단계라고 주저 없이 말했다. 그는 확대된 경제적 영역에 찬성했으며, 이리하여 제국주의도 역시 반대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세계사의 불가피한 단계로서 인정했다. 그는 세계의 미개발된 지역으로 자본주의를 확장하는 일이 많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컨대, 역사적 관점에서 영국이 인도를 정복한 것도 그것이 동양적 전제주의와 결합된 통치와 생산의 방식을 말살하고 근대 산업의 기초를 닦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아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제국주의에 관한 후기 마르크스주의 이론 가운데 한 가지 주제 - 그러나 매우 중요한 주제 - 만이 마르크스 자신에게서 발견된다. 즉, 그것은 해외 시장이 경제 위기를 완화하고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실 - 일반적으로 제국주의 - 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그의 예언의 기본적인 타당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그는 세계의 주변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이 전체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해 부차적인 중요성만을 가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국가와 미개발 지역 사이의 관계에서 보여지듯이, 후진국에서 혁명적 잠재력을 발견한 것은 근본적으로 후기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공모로 이루어졌다. 마르크스의 견해로는 결정적인 과정은 산업 발전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에서 일어나야 했다.
우리는 1890년대의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와서 강조점이 변한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 능력과 소비 능력간의 근본적 모순이라는 가설에서부터 출발해서 최초로 제국주의적 팽창 현상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 해외로 팽창하는 현상은 모순의 결과였다. 그러나 엥겔스도 그러한 상태가 순전히 과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해외 시장이 초기에는 위기를 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자본의 집중과 생산 증대를 가속화시켜 나중에는 위기를 더욱 첨예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엥겔스는 점점 심각해지는 일련의 위기의 끝에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이며, 제국주의는 이 과정을 저지해주기는커녕 사실상 그것을 재촉할 것이라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확고하게 고수했다. 1894년,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여기 또 하나의 굉장한 역사적 아이러니가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지만, 그것이 일단 정복당하고 나면, 자국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부산물이라는 생각은 몇몇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예컨대 아우구스트 베벨 August Bebel은 1892년에, 세계는 이미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반면 생산은 국민적 필요를 훨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붕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훨씬 더 낮추려는 고용주들의 노력은,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계속해서 감소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만연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부르조아 사회는 이런 내적 모순으로 인해 멸망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도, 제국주의는 여전히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전될수록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제국주의의 중심적인 중요성을 무시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유럽 강대국들의 제국주의는 당시에 모든 정치적 논의의 초점이 되어있었고, 늘어나는 군비 지출과 미정복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돌진하는 것이 그 시대의 질서이던 때였으므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설명이 요구되었다.
처음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제국주의를 식민주의의 직접적인 연장으로 보고, 또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조차도 그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특징을 지닌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현저하였다. 특히 제국주의에 대한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은 그것이 장사에 해로운 것이라고 비난하는 자유 무역의 전통과 흡사했다. 카우츠키 Kautsky역시 제국주의가 '경제적인 필연성'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확장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와 그 반대편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만들어 냄에 따라 좌익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한 견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견해는, 조직적인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존재함에 따라 사회는 증대하는 노동자들의 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강제수단을 점점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선 권력 투쟁은 단지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억압하는 방향이거나 수단일 뿐이다. 이런 생각은 특히 로자 룩셈부르크의 초기 저작에서 나타나고 있다.
만일 세계 정치가 [이것은 원래 "중국이"라고 되어 있다] 위협적인 갈등의 현장이 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국가들을 자본주의에 개방하는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대륙으로 떬겨져 그곳에서 폭발하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유럽적 적대관계의 문제이다. 오늘날 유럽과 다른 대륙에서 보이는 무장한 적들은 자본주의 국가와 후진국의 이열횡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비슷하게 선진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결과로 특히 전쟁에 말려든 국가들이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적 팽창은 일차적으로 계급투쟁의 반영인데, 계급투쟁은 자본주의가 성숙 단계로 발전해 감에 따라 더욱 더 첨예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네틀 Nettle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초기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다른 것들의 위에 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행동의 통일, 총체성을 의미했고,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억압의 첨예화를 의미했다." '제국주의'의 실제적 개념은 처음에는 전혀 이런 의미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 용어가 사용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거의 '군국주의 militarism'와 동의어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일찍이 1899년에 자본가들의 관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군국주의는, 첫째 다른 '민족' 집단에 대한 경쟁에서 '민족적' 이익을 방어하는 투쟁의 수단으로서, 둘째 금융 산업 자본의 배치 수단으로서, 셋째로 국내의 노동자 대중에 대한 계급지배의 도구로서 필요 불가결하게 되었다. ...군국주의는 식민주의, 대체로 보호주의와 권력 정치...세계적 군비 경쟁...식민지 강탈과 전세계에 대한 '세력권'의 정책...국내 문제에서는 민족 침략이라는 자본주의 정책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론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논쟁적 저의를 지니고 있고, 전체적으로 정치적 선동을 의도하는 일종의 제국주의 현상학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의 제국주의 해석은 현재까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인 어법에 영향을 끼쳐 왔다. 제국주의는 특정 국가의 영토 안이든 밖이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모든 해방 운동에 대한 억압 및 반동과 동일시되었다. 군국주의는 또한 일차적인 소비 능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군국주의는 시장의 포화상태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회적 생산의 일부를 흡수하고 또 그럼으로써 경제적 성장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몇 년 후에 로자 룩셈부르크는 체계적인 제국주의 이론에 착수했는데,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데 순수한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의 효시는 루돌프 힐퍼딩 Rudolf Hilferding이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뒤에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1928-9년 사이의 헤르만 뮐러 Hermann Muller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1910년 그는 "금융 자본론 Das Finanzkapital"을 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909년에 씌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많은 카르텔과 산업 복합체를 가진 1914년 이전의 독일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자유 무역의 단계를 넘어선 발전의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부수물로 취급되었다. 슘페터의 제국주의 이론과 힐퍼딩의 그것은 매우 대조적이다. 슘페터는 카르텔이나 보호주의나 독점 자본주의가 주로 정치적 요인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결코 자본주의 그 자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힐퍼딩은 독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진화에서 필연적인 단계라고 주장한다. 그는 거대한 콘쩨른의 발생, 트러스트와 기업합동, 보호주의, 덤핑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등과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현상들이 은행이나 '금융 자본'의 지배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기술한다.
힐퍼딩은 금융 자본 지배하의 자본주의는 개별 기업가들이 상호 경쟁하고 있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금융 자본은 자유가 아니라 지배를 추구한다. 그것은 개별 자본가의 독립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종속을 요구한다. 아울러 무질서한 경쟁 상태를 우려하고 경쟁이 보다 고도의 수준에서 재개될 수 있도록 조직화를 요구한다. 이것을 성취하고 그 지배를 유지,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관세 정책에 의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해외시장을 정복할 국가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다른 국가의 이해와 상충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인 상업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해외에서 금융 이익을 주장하고, 보다 유리한 공급 조건과 유리한 상업 조약을 확보하기 위해 약소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국가는 세계의 어느 곳이든지 개방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리하여 전체 세계는 금융 자본의 배출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자본은 팽창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식민지를 획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힐퍼딩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팽창주의는 민족 관념과 인종적 이데올로기를 도입하여 제국주의적으로 곡해함으로써 이념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사실적으로 기술했다. "오늘날의 이상은 자국을 세계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가의 이윤을 향한 충동만큼이나 무한한 노력이다. 자본은 세계의 정복자가 되며, 새로운 국가와 부닥칠 때마다 그것은 새로운 도약점으로서의 새로운 영역을 얻는다." 그러나 힐퍼딩에 다르면, 이 모든 것은 경제적 필연성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추진을 머뭇거리게 되면 금융 자본의 이윤은 감소되고, 경쟁력은 약화되며 마침내 보다 작은 경제 지역은 보다 큰 지역의 속국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생각은 이후의 논의, 특히 산업 국가의 경제발전과 제3세계 경제 발전 사이의 격차가 증대되는 문제에 대한 논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힐퍼딩은 이 문제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점에서 수정을 가하기는 했지만,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도식을 고수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1. 모든 종류의 제국주의적 팽창(자본 수출, 해외 시장의 획득, 새로운 지역의 개방, 군비 정책 등)은 자본주의의 확대를 가속화시킨다.
2. 팽창주의적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는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적다. "자본주의가...급속히 팽창할수록, 번영의 기간은 길어지고 위기는 단축된다."
이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창한 공황 이론의 중대한 변형이었다. 그들은 10년마다 일어나는 불경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결국 자본주의는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1914년까지 일어난 사건의 진행은 이러한 예언을 입증시켜 주지 못했다. 사실 1896년 이래로 경제 성장과 번영의 기간이 거의 계속되었다. 힐퍼딩의 주장은 "극동 지역의 개방과 캐나다, 남아프리카, 남미의 급속한 발전이 1895년 이래로 짧은 불경기의 기간을 거치고도 자본주의가 그렇게 놀라운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장기적으로는 반대의 진전과정을 예측했다. 경기 후퇴의 시기는 금융 자본의 세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금융 자본의 세력 증대는 힐퍼딩에 의하면 사회주의에로의 직접적인 서곡이었다.
완전한 금융 자본은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최고 단계를 의미한다. 그것은 유력 자본가의 독재를 완성시킨다. 동시에 그것은 한 국가에서 자본가들의 독재가 다른 나라의 자본가의 이해와 점점 더 양립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의 자본의 지배는 금융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면서도 또한 그에 대항해 싸울 것을 요구받는 대중의 이해와 더욱 더 상충하게 된다. 대립되는 이익들이 격렬히 충돌하면서 대자본가의 독재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로 변형된다.
약간 구태의연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강력하고 논리정연한 이론이며, 1차 세계 대전에 대한 정확한 예견을 포함하여 중요한 통찰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힐퍼딩의 제국주의 분석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다. 어쨌든 그는 주로 독일의 산업화라는 특수한 현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쉔크론 A. Gerschenkron과 스위지 Pau A. Sweezy에 따르면, 제국주의를 금융 자본의 지배로서 이해한 힐퍼딩의 해석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에서 과도기적 단계, 즉 은행이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하는 기간에는 적용되는 것이지만, 완전히 성숙된 자본주의 경제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힐퍼딩의 저서가 나온 지 몇 년 후인 1913년에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 축적론 Die Akkumulation des Kapitals"을 펴냈다. 그녀는 이 책이 마르크스의 근대 자본주의 발전이론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상투적이고 논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다룬 그녀의 초기 저작들과 달리, 이제 그녀는 제국주의의 일반 이론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자본 축적론"은 자본주의 국가의 식민지적 종속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이미 언급한 초기 저작과는 반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녀의 이론이 지닌 약점은 단순한 과소소비 이론에 의존할 뿐 아니라, 자본 재생산에 관한 마르크스의 일반 도식에 고지식하게 집착하는 데 있다. 게다가 그녀의 주장은 종종 정치적인 전술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붕괴라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왜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그녀는 마르크스의 자본 재생산 이론을 수정함으로써 해답을 찾고자 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발전, 특히 '폐쇄 체제'내에서의 자본 축적 과정을 서술했는데, 계속적인 자본 축적은 자본주의에 의하여 아직 그리 심하게 착취되지 않은 지역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러한 지역들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다시 말해서 대중의 구매력이 제한된다면, 잉여 가치의 투자 자본으로의 전환은 前자본주의적 사회구조를 착취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생산의 형식과 법칙은 전 세계를 생산력의 저장고로 흡수하려 한다. 착취하기 위해서 생산력을 점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자본은 전 세계를 약탈한다. 그것은 모든 수준의 문명과 모든 형태의 사회 등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필요하다면 무력도 사용하여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획득한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물질적 요소라는 문제는 생산된 잉여가치의 물질적 형태에 의해 해결되기는커녕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자본은 실현된 잉여가치를 생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질과 양을 고려하여 무제한적으로 생산 수단의 이권을 획득하고 점차적으로 전 세계를 보다 완전하게 포섭해 버리는 것이 필연적이게 된다.
이리하여 해외 시장은 단순히 배출구로서가 아니라, 산업국가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였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와 달리, 이로부터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뿐 아니라 성숙 단계에서도 경제적인 처녀지에 의존한다고 추론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본 축적 과정이 거대한 규모에 이르지도 못했을 것이고 실로 조금도 지속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아주 문제점이 많다고 여겨지는데, 로자 룩셈부르크는 그것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국내의 자본주의적 교역은 기껏해야 국민 생산에 포함된 가치의 양 - 소모된 불변자본, 가변자본, 잉여가치의 소비부분 - 을 실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화를 위해 충당된 잉여가치의 다른 부분은 다른 곳에서 실현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전체의 잉여가치의 실현은 비자본주의적 생산자와 소비자에 달려 있다. "그리하여, 자본과 자본 축적을 위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조건은 잉여가치를 구매하는 비자본주의적 구매자들의 존재에 있으며 이들의 존재야말로 자본주의적 축적이라는 문제에서는 이 정도로 결정적이다."
마르크스의 정의에 의하면 잉여가치는 자본가들에게만 생겨난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의 소비 능력이 증대된다면 국내 시장이 '소비되지 않은' - 즉 재투자할만한 - 잉여가치의 수익성있는 재투자에 대하여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급속히 성장하는 해외 투자 현상에 현혹되었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녀가 내린 결론은 오늘날에도 화제가 되듯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녀는 저개발국이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며 잠정적인 구제 수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살펴 본 것처럼, 완전히 성숙된 자본주의는 모든 면에서 그것과 병존하는 비자본주의적 계층과 사회 조직에 의존한다. 그것은 단순히 추가적 생산을 위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자본은 자유로운 축적을 위해서 전세계의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모든 지역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없이는 영위될 수 없다. 사실, 압도적으로 많은 자원과 노동력이 전자본주의적 생산의 범위 속에 있음을 생각하면...자본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러한 지역과 사회 조직으로 진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는 계속적으로 팽창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과정은, 정복될 수 있고 자본주의적 식민지 권력의 경제적 영향권으로 흡수될 수 있는 전자본주의적 사회와 지역이 있는 한에서는 가능하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답은 자본주의가 그 발전을 위한 배경으로서 비자본주의적 사회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자본주의 그 자체의 존재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동화시킴으로써 진행된다는 변증법적 갈등에 있다." 일단 '자유지역'이 고갈되면 자본주의는 발전의 최후적인 한계에 도달할 것이고 붕괴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처럼 다소 기계론적인 결론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상에서 기대되는 만큼의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그녀의 정치적 입장은 독일 사회민주주의 정통파 마르크스주의 노선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었다. 이들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르조아 체제가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거의 자동적으로 노동계급에 자리를 내어 주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발전을 분석하여, 이 시기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객관적 조건이 자본가들과 산업화된 국가 사이에 점점 더 격렬한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점을 믿게 되었다.
자본주의 국가가 고도로 발전해 가고 비자본주의 지역을 획득하고자 점점 더 불꽃 튀기는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제국주의는 비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침략과 경쟁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보다 심각한 갈등 속에서 무법성과 폭력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비자본주의 문명을 격렬하고 무자비하며 철저하게 파멸시킬수록, 그만큼 급속하게 자본주의 축적이 딛고 선 지반을 모두 잘라 버리게 되는 것이다.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발전을 연장시키는 역사적 방법이지만, 그것은 또한 자본주의를 즉각적으로 종결시키는 확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이 실제로 이런 극단 - 제국주의에로의 단순한 경향은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를 파국의 시기로 되게 하는 형태를 저절로 취한다 - 으로 치달릴 게 틀림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여기서 식민지 주민뿐 아니라 특히 본국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녀는 군국주의 - 일반적으로 간접세에 의한 군비의 축적 - 의 역할을 자본축적의 부수적 수단으로서 주목한 최초의 인물이었는데, 그녀 자신도 이 점의 중요성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다. 방위비가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부가적 방법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은 후기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답변확정되었다. 그런데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 축적이 구사회구조를 희생시켜 자본주의 체제를 확대시킴으로써, 그리고 국내의 노동계급에 대한 압박을 증대시킴으로써 가속화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자본은 비자본주의적 국가와 사회의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장악하기 위한 대외정책 및 식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점차 군국주의를 채용한다. 똑같은 군국주의가 자본주의 국가내에서 비자본가 계급으로부터 구매력을 전용하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단순상품 생산자(직공 등)와 노동계급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영향받는다. 전자에게서는 생산력을 빼앗고 후자에게는 생활 수준을 억제함으로써, 그들의 희생 위에서 자본의 축적은 최고의 힘으로 고양된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그리하여 상대적이긴 하지만 노동계급의 상태가 점점 열악화될 뿐 아니라 이전의 중간계급은 자취를 감추게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다. 다음의 음울한 구절은 보다 사실적인 예언인데, 1914년 이전의 말기에 잘 들어맞고 있다.
자본이 군국주의를 통해 국내나 국외에서 비자본가 계층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노동계급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낮출수록 세계 무대에서 자본축적의 역사에 대한 영향은 나날이 커진다. 그것은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재앙과 격동을 일으키고, 그리하여 이러한 조건하에서 주기적인 경제적 파국과 위기로 축적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
그러나 자본 자체가 만들어 낸 이러한 자연적인 경제적 난국에 도달하기 전에라도 국제적인 노동계급이 자본의 지배에 대해 항거하는 것은 필연적이게 된다.
그리하여 로자 룩셈부르크의 제국주의 이론은 폭력수단으로 제국주의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의 사멸의 고뇌를 단축시키기 위해 노동 대중, 특히 산업 국가의 프롤레타리아에게 혁명적 행동을 호소하는 데서 절정에 달한다. 이러한 생각은 제3세계 국가에서의 마르크스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로자 룩셈부르크는 제국주의를 일시적이나마 자본주의가 좀 더 생존할 수 있게하는 현상으로 보았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팽창주의적 특성의 필연적인 결과였으며, 더욱이 소수 자본가계급에 의한 자본축적을 지속시킬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이었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일 뿐이었다. 자본주의가 전세계로 팽창하는 한, 그 체제의 자기 파괴적인 매카니즘이 저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끝나자마자 자기파괴적 매카니즘은 번져나간다. 그녀에 의하면, "제국주의는 아직 남아있는 세계의 비자본주의 지역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쟁하는 자본축적의 정치적 표현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러한 입장을 1916년에 발표한 그녀의 유명한 주니어스 팜플렛 Junius pamphlet(1768-72년간 영국 내각의 정책에 대한 공개장을 익명으로 발표한 사람의 필명인 Junius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기서는 로자의 익명의 논문을 가리킴; 옮긴이)인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위기 The Crisis in German Social Democracy"에서 더욱 설득력있게 정식화시켰다. 그녀는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최후의 단계에서 고도의 성숙된 모습인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한 자본주의적 열망은 전 세계를 자본주의적 생산국가로 변화시키고, 시대에 뒤지고 전자본주의적인 사회와 생산수단을 불식시키며, 지구상의 모든 부와 생산수단을 자본에 종속시키고, 모든 지역의 노동 대중을 임금 노예로 전환시키려는 경제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무력과 강탈과 파렴치한 모든 방법으로 전 세계를 제압한 자본주의의 야만적인 승리의 과정에서 하나지 밝은 면이 있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의 최후의 전복을 위한 전제조건을 창출시킬 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세계 지배를 확립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세계 혁명이 뒤따를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당대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에 당혹해 했다. 그녀의 견해가 기초하고 있는 경제적 논의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했다. 그녀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세계 혁명 이전까지는 분명히 오랜 수명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오토 바우어 Otto Bauer는 이 점에서 그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레닌은 그녀의 제국주의 이론에 많은 것을 빚지고 있지만, 그의 나중의 저작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그녀가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에서 저개발 국가들의 전략적 역할에 주목한 점을 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녀의 견해는 의심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살펴 볼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은 한가지 점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생각으로부터 일종의 후퇴를 의미한다. 즉, 그는 중심국 산업 자본주의의 내재적 경향을 재차 강조하였던 것이다. 레닌의 유명한 저서인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원제는 그냥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 The Last Stage of Capitalism")는 1916년 봄에 스위스에서 집필되었는데, 주로 힐퍼딩과 홉슨의 저작에 기초하고 있다. 부하린에게서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의 저작도 많이 이용되었다. 레닌은 자본주의가 식민적 종속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로자의 가설에 대해 강력한 반론을 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국주의를 '최고의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의 일 형태라고 부르는 한 그의 견해는 로자의 견해에 아주 가깝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그것을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최고의 성숙된 형태"라고 말했던 것이다. 레닌의 팜플렛은 공산주의 세계에서 聖典적인 지위에 올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주로 독일 사회민주주의 내의 사회 국수주의적 social-chauvinistic인 경향에 반대한, 동시에 가장 발전된 산업 국가에서 혁명이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제한된 이론적 중요성을 지닌 논쟁적인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레닌은 제국주의가 혁명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고 자본주의 사멸의 고뇌를 연장시키는 단계로서 서술했다. 그의 저작의 의미심장한 제목은 사실상 로자로부터 빌려온 것이지만, 주장은 주로 힐퍼딩과 홉슨의 논리를 따른다. 그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라는 가살에서 출발한다. 이 단계의 자본주의는 자본수출, 모든 종류의 정치적 지원을 받는 경제적 침투, 강제적 합병과 제국주의 전쟁 증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팽창하려고 한다. 레닌은 엄밀한 의미에서 식민지와, 직접 간접의 정치 경제적 침투 수단에 의해 대산업국가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으나 명목적으로는 독립적인 '반식민지적' 지역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았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로 정의하는 데 포함되는 다섯가지 특징을 꼽았다.
1. 생산과 자본의 집중은 매우 높은 단계로 발전해서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점을 창출한다.
2. 산업 자본과 더불어 은행자본의 등장, '금융자본'의 기초 위에서 금융과두체제의 형성.
3. 상품 수출과 구별되는 자본수출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4. 세계를 자기들끼리 분할하는 국제적인 독점 자본가 연합의 형성.
5. 자본주의 강대국 간의 전 세계의 지역적 분할이 완성된다.
여기에서 저개발지역에 대한 강제적 자본수출은 잉여가치의 배출구 - 홉슨에게서처럼 - 일 뿐만 아니라 이윤율의 저하를 저지하는 수단으로 등장한다.그러나 레닌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상황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인 팽창은 경쟁을 심화시켜서 이윤율은 더욱 빨리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의 결말은 아마도 제국주의 전쟁에 의한 자본주의의 자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단계로 설명했다. 그는 1차대전이 이러한 상황의 직접적인 산물이며 자본주의의 붕괴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생각했다.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는 직접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생산의 사회화를 초래한다. 즉,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의지와 의식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내려 새로운 사회 질서 속으로 집어 넣는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 경쟁에서 완전한 사회화로의 과도기적인 질서이다." 사실 레닌은 독점 자본주의가 경제성장의 일시적인 증대를 가져올지도 모르며, 그리하여 파국적인 계급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그는 제국주의가 독점 자본주의에 초과 이윤을 제공하며 그 덕분에 자본주의는 일시적으로 노동계급의 상층부를 매수하고 설득하여 사회국수주의 social chauvinism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에 의하면 "제국주의는 노동자들 사이에 특권층을 만들어 내고 그들을 광범위한 프롤레타리아 대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크와 공통되는 레닌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단계는 해외 영토의 분할이 완성되면 끝나게 된다. 동시에 세계가 소수의 부국과 거기에 종속된 다수의 빈국으로 점차 분할됨에 따라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의 분쟁은 점점 더 첨예화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레닌은 홉슨을 따르고 있는데, 그는 점점 더 자본 수출과 '이자표 clipping coupons'에 의존하는 '고리대국가 usurer state', 즉 배당금을 받는 금리 생활자의 발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레닌은 그러한 자본주의 그 자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반박하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대체로 자본주의는 이전보다 훨씬 급속하게 발전, 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일반적으로 더욱 더 불균등하게 될 뿐 아니라, 그 불균등성은 특히 가장 자본이 풍부한 국가들이 몰락할 때 명백해진다." 아울러 그는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제국주의를 "과도기에 처한 자본주의 또는 보다 정확하게 말해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했다. 그는 경제발전의 불균등성보다는 자본주의 진영의 '쇠퇴'를 더욱 강조했는데, 전자는 스탈린과 신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답변확정되고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었다.
물론 이것은 오산이었다. 레닌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유동성을 경시한 반면 당시 자본주의 체제의 몇몇 특징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한 사실에 주로 의존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토 바우어는 일찍이 1913년 이전에 잘못된 희망에 대해 경고했다. 레닌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에서 강조점을 정치적 차원(면)으로 옮겼다는 것은 실로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점에서 그는 로자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이론가들과 달랐다. 초기 단계에서 그는 로자 룩셈부르크와는 대조적으로 제3세계의 식민지 민중들과 동맹의 가능성을 보았다. 반면 로자 룩셈부르크는 그 당시에 많은 논문을 통하여 민족주의는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이며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이미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제3세계의 민족주의를 고무하는 것이 레닌에게는 식민지체제를 혁명화하는 첫째가는 방법이자 자본주의와 싸울 수 있는 믿음직한 무기로 여겨졌다. 레닌은 1917년 11월 8일의 유명한 '평화에 대한 법령 Decree on Peace'에서 민중들의 자결권을 특히 식민지 민중에게까지 확대하고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혁명적 무기로서 사용하였다.
물론 레닌이 식민지 민중들의 해방운동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론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레닌이 1920년의 제2차 코민테른 세계 총회에 제출한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 Theses on National and Colonial Questions'의 초고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는 거기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와 모든 식민지 민족 해방운동과의 긴밀한 연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세계의 정치적 상황은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로 대치되고 있다. 세계의 정치적 발전도 필연적으로 한가지 초점 - 소련에 대한 세계 부르조아들의 투쟁 - 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을 둘러싸고, 한편으로는 모든 국가의 진보적 노동자들의 소비에트 운동과, 다른 한편으로는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세계제국주의에 대한 소비에트 체제의 승리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식민지와 피압박민족들의 민족해방운동은 불가피하게 뭉치게 된다.
똑같은 맥락에서 레닌은, 금융자본과 제국주의의 대변자들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앞선 소수의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한 세계 대다수 민중의 식민지적, 금융적 노예화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부르조아 민주적인 문귀의 허위성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코민테른회의는 "유럽의 자본주의는 주로 그 힘을 유럽의 산업 국가로부터 얻기보다는 그 식민지에서 얻고 있다"고 선언한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이 점에 대한 레닌의 전략은 스탈린에 의해 답변확정되고 계속 발전되었다. 스탈린은 1923년 4월의 러시아 공산당 12차 회의에서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제국주의의 먼 배후인 동방의 식민, 반식민 국가들을 고무시키고 혁명화하여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제국주의를 강화시키고 우리들의 운동의 힘을 약화시킬 것인가." 이런 식으로 아주 우연하게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미래에 대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의 핵심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옮겨졌다. 그리하여 1924년에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a)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금융자본을 소유하고 세계의 대다수 민중을 착취하는 소수의 문명국 진영이며, 또 하나는 다수를 접하고 있는 식민지와 종속국가의 피압박 피착취 민중의 진영이다.
(b) 금융자본에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식민지와 종속국가는 제국주의에 대한 거대한 예비지이자 매우 중요한 힘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
(c) 식민지, 종속국가의 피압박 민중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혁명적 투쟁만이 그들이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
(d) 가장 중요한 식민지, 종속 국가는 이미 민족해방운동의 길을 택했으며, 그것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e) 선진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 운동과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이해는 이 두 형태의 혁명운동이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에 대한 공동전선을 형성하도록 요구한다.
(f) 선진국에서의 노동계급의 승리와 피압박 민중의 제국주의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은 공동의 혁명전선을 형성하여 강화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식민지 민족운동과의 동맹은 그러한 민족운동이 프롤레타리아운동이 아니라 부르조아 운동일 때에도 주변부에서 자본주의를 전복할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히 선언되었다. 제국주의에 대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개념의 이러한 변형은 오늘날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그것은 레닌 이론의 중요한 측면들이 뒤로 밀려 났음을 의미했다.
1920년대에 소비체트 진영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자본주의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주의가 그 식민지적 기반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이제는 역으로 적용되었다. 즉, 자본주의는 그 종말에 다가가고 있다는 암시와 더불어 제국주의는 시대에 뒤진 것으로 언명되었다.
동시에 정치적 측면, 즉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적대관계에 의해 야기된 전쟁이 새롭게 강조된 반면,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순수하게 경제적인 동요 요인은 보다 덜 강조되었다. 1924년에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불균등한 발전의 법칙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가피성의 법칙은 이전보다도 오늘날 더욱 강력하게 남아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은 얼마전까지 이 주장을 고수해 왔다. 20차 소련 공산당대회(1956)에 이르러서야 상이한 사회 체제간의 '평화공존'론이 선언되었다. 이것은 적어도 장기적 평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은 더욱 첨예한 갈등과 전쟁을 초래하리라는 이전의 주장은 소리없이 잊혀졌다.
20세기 중반 이래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의 수준은 명백하게 저하되었다.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라고 주장하는 톰 켐프 Tom Kemp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들 Theories of Marxism"에서 소비에트 이론가들의 추론은 순간적인 전략적 요구에 너무 많이 순응해야 하는 여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소련 공산당이 파시스트와 나찌즘을 치명적으로 오판한 것도 어느 정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후기 단계에 널리 퍼졌던 경직된 제국주의 이론의 결과였다.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인 파시즘에 이어 곧 프롤레타리아의 승리가 올 것이며, 파시스트가 권력을 잡은 것은 노동계급에 대한 '사회 파시스트 Social fascists'의 배반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승리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데 대해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한편 1920년대와 30년대에 실질적으로 제국주의 연구에 기여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사회주의 진영에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오이겐(예뇌 Jeno) 바르가 Eugen Varga의 업적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바르가는 여러모로 레닌의 견해와 달랐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아야 했고 그의 결론은 항상 수용되지 않았다. 대체로 말하여 그의 해석은 레닌의 해석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수정부분들을 지적하였다. 이들 수정 부분은 기존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분석에 정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는 경제조직의 국가자본주의적인 형태가 늘어나는 데 주의를 기울였는데, 그것이 여전히 주기적인 공황을 겪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준다고 믿었다. 그는 국가자본주의의 본질이 "사회화되는 과정에 있는 생산과 사적 취득 사이의 모슨을 얼마간 극복하고, 가능한 한 최고로 독점 이윤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관심인 개별 자본가의 사적 이익에 대하여 계급으로서의 부르조아의 이익 혹은 지배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선언하였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늘어남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지며, 국가개입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위기 요인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의 고유한 요소인 경제적 공황의 영향은 수요를 인위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바르가는 1927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키일 Kiel 회의에서 힐퍼딩이 발전시킨, 서구경제가 '조직화된 자본주의'라는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는 견해를 명확히 거부했다. 즉, 그는 원칙적으로 당시의 자본주의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닐지라도 죽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하여 세부적인 수정에도 불구하고 바르가는 '자본주의의 쇠퇴'는 약화되지 않고 계속되며, 이것은 상당한 정도 식민지 민중의 '반제국주의 혁명' 때문이라는 스탈린주의적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했다. 1929년의 세계적 경제 공황은 그의 견해를 완전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자본주의가 그 공황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자본주의의 쇠퇴를 촉진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계급간의 긴장을 증대시켜 대규모의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의 몇가지 새로운 측면에 주목하면서도 그는 원칙적으로 여전히 정통파였다. 1947년 - 그는 잠시동안 '자아비판'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 에 그는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는 금세기 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와 똑같은 것이며 그 고유한 법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스탈린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식민제국의 붕괴는 결국 자본주의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으로 입증되었다. 1945년 이후의 사태는 그러한 해석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의 독점적 성격을 강조하는 레닌의 해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되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 state monopoly capitalism' 이론은 식민지의 독립이라는 시기적 조건하에서 고전적 레닌주의 이론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제는 경제문제와 - 특히 - 군국주의의 기능에 국가의 활동이 증대됐다는 점이 주로 강조되고 있다. 즉, 이 두 가지 요인은 자본주의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식민지의 비중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취해졌던 것인데, 정통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에게는 국가독점과 군국주의가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가 진전된 명백한 징후로 보여졌다.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은 산업국가와 저개발 국가와의 관계를 기술하는데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결코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에 스탈린주의적 제국주의개념은 2차대전 이후로 이전의 직접적이고 야만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지배형태가 '정치적 영향력'과 더불어 순수한 경제적, 기술적 통제라는 보다 교묘한 형태로 대체되었지만 실제 상황은 이전과 꼭같다는 이론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실례는 무수히 많다. 그것은 원대한 정략적 목적에는 기여하지만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과는 거의 무관하다. 1969년 5월 31일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 Franfurter Allgemeine Zeitung"지에 보도된 그해 5월의 모스크바 공산당회의에서 사용된 노동신문을 예로 들 수도 있다. 그것의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제국주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주권을 제한하는 경제적, 군사적 조약을 강요한다. 제국주의는 자본수출, 불평등 무역관계, 가격과 환율의 조작, 외상판매와 이른바 원조의 다양한 형태 등을 통해 그 국가들을 착취한다."
'제국주의'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 엄밀성을 잃게 되고 '자본주의'와 단순한 동의어로 되어 버린다. 서방국가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행위는 국제적 금융자본이 서구 산업국가에서 활동하든지, 다른 저개발 지역에서 활동하든지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낙인찍힌다. 그러한 접근의 과학적 가치가 아주 보잘것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논의는 제3세계국가들에서 점차 보편화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에 유용한 이념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2.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의 모택동주의적 변형
1930년대 이래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기존의 공식적인 해석은 제국주의에 대한 모택동주의 이론이 형성되면서 중요한 경쟁상대를 맞게 되었다. 이 이론은 소련에 의해 직접, 간접으로 통제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마르크스주의 교리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왔으며 지금도 계속 그러하다.
레닌주의와 대조적으로 모택동주의는 이론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실천을 항상 강조해 왔으며,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사상이 특별히 정교하지는 않다. 모택동주의의 교리는 원래 레닌과 스탈린이 주장한 노선을 따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그리 엄밀하지 않으며 피상적이다. 대개의 학자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비교해서 독창성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포겔 Karl A. Wittfogel같은 몇몇 학자들은 독자적인 모택동주의의 교리 같은 것은 없다고 부정한다.
사실 모택동이나 다른 지도적인 중국 공산주의 이론가들의 주장에서 체계적인 제국주의 개념을 끌어내기란 어렵고, 특히 전반적으로 그것을 간추려 놓은 형태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1937년의 논문 '모순론 On Contradictions'에서 보듯 모택동은 기본적으로 레닌과 스탈린의 공식을 따랐다.
자유경쟁 시기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발전될 때 기본적인 모순관계에 있는 두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의 계급적인 본성이나 사회의 자본주의적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러나 이 두계급 사이의 모순은 심화되고 독점자본주의와 비독점 자본주의 사이의 모순이 생겨나며, 식민지 권력과 식민지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고, 불균등한 발전에서 생겨난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은 특히 첨예화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의 특별한 단계인 제국주의 단계가 생겨난다. 레닌주의는 제국주의 및 프롤레타리아혁명시대의 마르크스주의이다. 왜냐하면 레닌과 스탈린이 그 모순들을 정확히 설명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론과 전략을 정확하게 정식화시켰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대한 당시의 해석을 상당히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모든 중요한 점에서 직접적으로 레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국주의 권력과 식민지 사이의 증대되는 모순에 대한 언급만이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특수한 입장을 보다 강력하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모택동주의의 출발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출발점과 다소 비슷하다. 그러나 그 후에는 강조점이 분명하게 변화한다. 동구권의 공식적인 교리는 모든 상황하에서 제국주의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초래한다는 이론을 조심스럽게 누그러뜨린 데 반해 모택동주의에서는 그것이 본질적인 교리로서 유지된다. 모택동주의는 전시공산주의로서 생겨났기 때문에 항상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은 모택동주의의 뚜렷한 특징이 되었다. 모택동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을 해방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데 반하여, 정통파 공산주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는 전쟁은 예외적인 것이거나 혁명적 격변의 부산물로 생각된다. 공식적인 러시아의 교리와 비교할 때 중국의 교리는 중국에서의 공산주의의 승리와 제국주의의 종주국에 대한 저개발국의 승리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훨씬 더 강조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중인 1935년에 毛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괴물과 같은 제국주의가 생겨난 이래로 세계의 사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중국 민중들은 끝까지 적에 대항하여 혈전을 치룰 영웅적인 정신을 갖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 失地를 회복하려는 결의와, 세계의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꿋꿋이 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국제적인 협력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국제적인 협력은 오늘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혁명적인 투쟁을 위해 필요하다. 선조들이 말한 것처럼 "춘추전국시대에 정의로운 전쟁은 없었다" [이것은 "맹자"에서 인용한 것으로 봉건적 투쟁의 시기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적용되는 것이며, 정의로운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피압박 민족과 피압박 계급 뿐이다. 민중들이 압제자들에 항거하여 일어난 세계의 모든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다......모든 정의로운 전쟁은 서로 지원해야 하며, 불의의 전쟁은 모두 정의로운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의 모택동주의적 변형은 우선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권력의 억압에 대항한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모택동주의의 견해에 따르면, 대중 봉기와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공산주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은 이 과정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다. 모 자신이 승인한, 1962년 10월 8일의 "북경리뷰 Peiking Review"에 게재된 사설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식민지 민중의 해방 운동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혁명적 격동은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을 떨게 만들고 세계의 혁명적 민중들을 기쁘게 한다......오늘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의) 민족해방혁명은 제국주의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모순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하여 모택동주의는 제3세계 국가에 끼치는 서구국가의 모든 형태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할 뿐 아니라 - 그 자체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 - 식민지 종주국에 대항한 민중의 폭력혁명만이 제국주의 지배를 타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제국주의적 지배를 저개발 국가의 지배계급과 해외자본이 대중을 착취할 목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보았다. 최근에는 소련도 착취하는 국가의 대열에 들어갔다.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보수화되고, 경쟁적인 두 사회체제간의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한, 중국 공산주의는 러시아적 원형과는 더욱 더 멀어졌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소련을 미국 자본주의의 공범자에 지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새롭고 더욱 위험스러운 제국주의의 변종으로서, 다른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엔가 무력에 의해 격퇴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소련과 그 위성국의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발전의 시기에 적합한 독재적 방법을 사용하는 호전적인 공산주의의 모습을 가진, 그 나름대로의 변형에 더욱 더 의존하고 있다.
모태동주의 교리에서 이론적 정밀성의 결함은 정열적인 투쟁 정신에 의해 보충된다. 엄밀한 분석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에 의해 주로 대체된다. 이 제국주의 이론이 거대한 중국 민중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국내에서 이용하려던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의아하게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이 여러 해 동안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 제3세계 국가들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 선전은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해 전식민지 민중과의 동맹이라는 이론적 가설에 실제적 현실성을 부여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서련의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제국주의자들과 제휴하고 있으면서도 낡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공식을 중얼거리며 경화된 관료적 지성의 제물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는, 공식적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북경의 계속적인 비판을 헛된 것이라고 무시해 버릴 수는 없다. 중국의 이데올로기는 보편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대신 대중에게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3세계와 산업국가에서 혁명적 행동에 전념하고 있는 집단에게는 특히 매력적이다. 사실 중국의 이념은 동구나 서구의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이념보다 제3세계의 상황에 더 잘 들어맞는 것 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미 혁명적 전설이 된 체 게바라 Che Guevara의 생애를 언급하거나 보다 정확하게는 피델 카스트로 Fiedel Castro가 중소의 반제국주의 전략을 결합 실천하여 성공한 기술을 언급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는 소련의 원조에 의존하면서도 중국의 전술에 따라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뤄나갔던 것이다.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의 모택동주의적 변형은 행동에 대한 강조, 강력하게 확립된 구조를 지닌 산업국가보다 제3세계에서 먼저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과 더불어 '뉴레프트 New Left'에 상당한 매력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이것의 실례는 수없이 많다. 거의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농업경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재벌인 미국과일상사 United Fruit Company에 의한 각료의 충원을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60년대 초 미국학생들이 벌였던 대중시위를 상기할 수도 있다. 광범위한 간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베트남 전쟁중에 베트민 Vietminh(베트남독립동맹; 옮긴이)을 지지한 뉴레프트의 감정적인 유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외에 서독에서 활동하는 '적군파 Red Army Fraction'는 서독에서의 자본주의 질서에 대항하는 무장투쟁이 제3세계 국가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투쟁의 일부라는 이유로 테러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 집단의 테러기술과 작전은 남미의 투파마로스 Tupamaros의 도시 게릴라 전략을 직접적으로 본뜬 것이다.
제국주의 이론에 대한 모택동주의적 해석이 어느 정도까지 전쟁을 보편적인 해결책으로 간주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소련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毛는 제국주의자들, 즉 서구 자본주의의 지위가 아주 취약하다고 생각했다. 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모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주의자들은 종이호랑이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류의 주장들이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전쟁 -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아 그것은 세계전을 의미한다 -을 염두에 두고 있는 냉혈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틸레만 그림 Tilemann Grimm은 모택동주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모든 피압박민중의 혁명전쟁은 정당하며 지원받아야 한다.
2. 제국주의 세력의 외형적인 강성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이 전쟁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3. 적은 '전술적으로는 위험'하지만 '전략상으로는 보잘 것 없다.'
4. 세계의 모든 혁명세력의 동맹은 제국주의를 격퇴시키는 필수조건이다.
5. 원자탄과 모든 제국주의자 및 반동주의자들은 '종이호랑이'이다.
6. 최후의 승리는, 사람들이 대체로 말하듯 우주론적으로 확실한 문제이다.
모택동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은 여기서 완전히 정치적 행동 강령으로 변형되었으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입장과 비교하여 볼 때 인식론적인 개념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상실했다. 모택동주의 이론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역사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기여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살펴볼 제3세계에서의 제국주의 해석에 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쳐왔다.
제3장 잠정적 평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서술했던 관점들을 정리하고 일종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앞에서 우리는 홉슨, 슘페터의 저작에 나타난 고전적 부르조아 제국주의 이론과 힐퍼딩, 로자 룩셈부르크, 레닌이 상술했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 이론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입장이 발전해 온 과정에서 이론적으로는 보잘 것 없으나 실천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모택동주의를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에는 홉슨과 슘페터, 다른 한편에는 마르크스주의적 저자들을 놓고 볼 때, 이들의 다양한 이론은 대체로 산업 자본주의가 발전한 특정 시기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 이 시기의 경험이 자본주의 체제 일반에 반드시 전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914년 이전의 시기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였는데, 이같은 경제성장은 후발국가에서 카르텔, 트러스트, 고율의 보호관세 및 대은행의 경제적 지배 등과 같은 독점자본주의의 특징들을 수반하였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와 비교될만한 현상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상당히 변화된 형태로 존속되고 있다. 뚜렷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이론들에 암묵적으로 가정된 중간계급의 소멸이 예측된 형태대로는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금융자본에 의한 지배는 훨씬 거대한 규모의 자본집중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체제는 1918년 이전에 제국주의를 비판한 부르조아 비평가나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이 추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다원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자본주의는 1929년에서 31년 사이의 세계경제위기와 파시즘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존속해 왔으며, 이전의 식민지 지역의 해방이 경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차원에서는 거의 완결되어 가는데도 별다른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제국주의의 타도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붕괴, 혹은 - 레닌이 생각했던 것처럼 - 재기 불능의 쇠퇴를 초래할 것임에 틀림없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예견은 아직도 증명이 되지 않았으며, 적어도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제국주의 이론은 그것의 논리적 일관성 때문에 아직도 상당한 매력을 끌고 있다. 실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제국주의 이론은 과학적인 엄밀성과는 거리가 먼 모택동주의의 형태로, 혹은 산업국가와 저개발국가 사이의 간격이 점점 확대되어간다는 점을 강조하는 제3세계 반식민주의의 형태로, 아니면 앞으로 살펴볼 서구 신마르크스주의의 다양한 형태로 인기를 얻고 있다. 더구나 다양한 형태의 이들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은 제국주의에 관한 서구의 비공산주의적 견해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이 아무리 독단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서구에서 공통분모로 쉽게 환원시킬 수 없는 여러 입장들을 숱하게 보게 되는데, 이것들 모두는 제국주의의 원인과 본성에 관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관념의 승인 여하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서구의 많은 신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레닌주의 이론을 더욱 정교화시킬 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의 붕괴가 더 이상 당연시될 수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비공산주의적 학자들은 - 은연중에나 명시적으로나 - 홉슨과 레닌 모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에는 레닌의 이론이 일방적이라고 서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홉슨과 레닌 두 사람 다 사실을 왜곡하여 제국주의를 그릇되게 묘사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 랜즈 David S. Landes는 '경제적 제국주의의 본질에 관한 몇가지 고찰 Some Thoughts on the Nature of Economic Imperialism'이라는 논문에서 경제적 요인은 제국주의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집단의 경우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랜즈에 따르면 제국주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그것은 "사실의 - 중요하긴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 일부만을 설명"할 뿐이기 때문이다. 지배자나 피정복자 양편 모두에 경제적인 동기는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국주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유사하게 제국주의 시대사에 대한 탁월한 전문학자인 윌리암 랭거 William L. Langer는 "사업가는 영토획득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군부나 관료계급은 거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인용에는 근데 서구 제국주의 이론의 핵심적인 특징 -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주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일반적인 해석의 틀 안으로 경제적 요인을 흡수해버리려는 노력 - 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여러 이론들도 각기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다양한 사상 유파로 구별될 수 있다.
제4장 현대 서구의 해석들
1. 극단적 민족주의와 권력정치 현상으로서의 제국주의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의 정치적 변종들은, 비록 그 강조점이 옮겨지기는 했지만, 서구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대단한 신뢰를 얻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 이성을 쫓는 강대국의 이해보다는 점차로 민주화되고 있는 산업국가에서의 민족주의라는 대중운동에 비중이 두어진다. 물론 이런 운동은 강대국들 사이의 적대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조장하는 데 한몫을 했다.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근대 제국주의 지배의 추진력으로서 대중적 민족주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광범위한 학자들이 제국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찍이 1935년에 윌리암 랭거는 영국 제국주의를 기본적으로 "유럽의 영역을 초월한 민족주의의 구체화"로서 기술하였다. 근대 제국주의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 민족적 열광이나 호전주의는 확실히 중요한 추진력이었다. 대중들은 모국의 위대한 미래와 경제적이익이라는 막연한 전망에 매혹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가들 쪽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뤄야 하는 해외개척에 대중들만큼 깊숙히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부르조아와 어느 정도 광범위한 대중들이 공유한, 강력한 해외정책에 대한 민족주의적 열광이 없었다면, 아마 지배엘리뜨들은 정부가 제국주의 정책을 수행하도록 설득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정책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규모로 진행되었고 강대국들 사이에 참예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종속지 관리 비용과 강대국 간 경쟁에 의해 계속 늘어나는 군비지출로, 새로 획득한 식민지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몫은 모두 탕진되었다. 정치가들은 이런 실정을 잘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인 여론은 군사적 분규를 무릅쓰고서라도 정치가들이 제국주의적 정책을 계속 펴나가도록 압력을 가했다.
서구사회의 발전과정 중에서 19세기에 이르러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적 전체주의 democratic totalitarianism로 타락하게 되는데, 상당수의 학자들은 근대 제국주의가 이 시기에 발생한 민족주의적 대중운동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는 "전체주의의 기원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에서 제국주의의 인종적 이데올로기와 제국주의정책의 反자유주의적 anti-liberal 구조는 파시즘의 전조라고 논하면서,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사고방식의 이데올로기적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흡사하게 게오르그 리히타임 George Lichtheim은 제국주의란 기본적으로 경제적 혹은 기타의 이유로 제국주의적 팽창에 관심이 있는 집단에 의해 어느 정도 조작된 극단적 민족주의의 산물이라고 해석한다.
운동으로서의 제국주의 - 혹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제국주의 - 는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밀착하게 되었다. 이 말은 거꾸로 될 수도 있다. 즉, 민족주의는 언제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제국주의로 전환될 수 있다. 대중적 애국심은 제국주의적인 운동에 봉사하게 되면서 체계적으로 타락해갔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뿌리깊은 저항을 하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데이비드 필드하우스 David K. Fieldhouse는 초기 저서 중 비교설명서인 "식민제국들 The Colonial Empires"에서 이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근대제국주의란, 그 어느 때보다도 기괴한 파시즘의 형태를 띠었던 민족의 대중적 광기의 산물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한 흐름에 동조하여 대중의 여론에 부화뇌동했던 자들은 사업가나 은행가가 아니라 바로 정치가들이었다. 자본가들은 경제적으로 건전한 프로젝트이기만 하면 장소가 전통적 산업국가든 해외 지역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투자하려 했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대중의 민족주의적 광기에 대해 배출구를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를 느꼈다. 이리하여 '아프리카 침탈'에서 절정에 달하는 범세계적 팽창과정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현상이었다. 즉, 자본가들은 이용만 당했을 뿐 식민 지역 획득을 위한 열광적 경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두말할 필요없이 1870년대 이래로 유럽의 민족국가에서 격화되어 가던 근대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못된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그 고전적 시기인 1880년 이후에 경제적 요인, 특히 산업국가에서 놀랄만큼 중가되었던 잠재력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가공할 만한 팽창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민족주의적 충동은 종종 그것을 창출시켰던 조건으로부터 독립되어 의당 제국주의의 추진력이 되었다. 일차적으로 민족주의적인 현상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 이론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은 이 정도로 피상적이며 구체적으로 논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특수한 내용을 민족주의적인 팽창 계획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영제국'이나 '대독일제국' 등의 외침은 -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 제국주의를 유발한 여러 가지 원인을 은폐하고 있는 공허한 공식임을 알게 된다. 결국 제국주의를 민족주의가 악화된 형태라고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전체로서의 제국주의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 즉, 이러한 민족주의의 근원 자체가 연구되지 않는 한 그것은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다.
강렬화된 민족주의의 일 형태로서의 제국주의라는 이론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민족주의가 행한 정치적, 사회적 기능을 연구하는 데 특수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 '대영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열광은 사회 통합의 한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흥 중간 계급은 그것을 이용하여 아직도 보수적 엘리트에 의하여 대체로 지배되고 있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제국의 경우는 정도가 더욱 심했다. 독일에서는 부르조아가 보수적인 귀족과 '국제주의적'인 노동계급 사이에서 자신의 입장을 통합적 민족주의로서 표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신흥 중간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제국주의는 근대화의 이념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노동계급으로부터의 가능한 경쟁을 차단함과 동시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 이런 동기로 인해 특히 1880년에서 1918년 사이에 걸쳐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 권력 정치 power politics라는 관점에서 근대 제국주의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역사를 자기주장과 헤게모니를 위한 강대국들 사이의 끊임없는 경쟁의 구체화로서 보는 랑케의 역사 개념에서 유래된다. 이런 해석은 윌리암 랭거의 대작에서처럼 외교사에 의거하여 제국주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고전적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로빈슨 R. Robinson과 갤러거 J. Gallagher의 최근의 저서에서 약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제국주의 정책을 주로 권력 정치와 전략의 견지에서 해석하고 있다. 사실 로빈슨과 갤러거는 정치적 경쟁이 제국주의적 과정을 고조시키는 경향이 있는 요인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저자들이 대영제국의 경우를 들어 보여주듯이, 고전적인 권력정치와 같은 동기는 실제로는 제국주의의 '당국자 정신 official mind'에 현저하였다.
제국주의를 국제체제 내부에서 경쟁이 격화되어 나타난 형태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학을 체계화시키려는 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이론들의 부활은 제국주의적 팽창에 이바지한 정치학의 다른 측면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고, 외교사만을 위주로 한 전통적 접근에 좌우되었다. 이런 유형의 해석은 최근 들어 바움가르트 W. Baumgart가 영국 및 프랑스의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강조하였다. 그가 세기의 전환기에 발생한 제국주의의 본질을 명료하게 지적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바움가르트의 견해에 의하면, 제국주의란 일차적으로 범세계체제의 틀 안에서 강렬화된 강대국 정책의 일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세력의 유지 및 획득이 사회변동의 결정적 인자로서 보여진다. 이런 신랑케적인 개념이 지니는 잇점은 오늘날의 권력 정치적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전성기였을 동안의 고도로 복합적이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그것의 설명적인 가치가 적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경향이 과연 일반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왜냐하면 세력을 유지하고 증대시키려는 욕구로부터 생겨나는 강대국의 경쟁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 번식적인 역할을 하거나 혹은 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국주의의 가공할 만한 동태적인 힘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이론들은 고작해야 여러 가지 요인 중 한가지 요인에 불과한 것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내부적, 주변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제국주의적 과정에 가속효과를 미치긴 하지만 그 자체에서 제국주의가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세력의 증대에 대한 충동이 제국주의적 과정의 특수한 원인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이 지니는 약점은 명백하다. 권력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동기들은 간접저깅고 비공식적인 제국주의적 침투의 다양한 형태가 무용하다고 판명될 때에야 비로소 현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는 정치가나 외교관들이 거의 항상 스스로의 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라기보다 상황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제국주의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신랑케적인 제국주의 이론은 적어도 제국주의적 과정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만은 설득력이 거의 없다고 결론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2. 객관주의적 이론
두 번째 그룹은 제국주의를 진보된 서구문명이 비교적 낙후한 제3세계의 토착문화에 충격을 가하는 데서 불가피하게 생겨난 객관적 과정이라고 해석한다. 즉, 제국주의는 서구문명이 전세계에 걸쳐 장기적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최종단계라는 것이다.
헤르베르트 뤼티 Herbert Luthy는 특히 경제이론가들이 제국주의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데 반대하면서 이 관점을 강력히 논술하였다. 즉, 그는 식민화과정과 그 최종적인 제국주의적 단계를 근대적 기술에 기초한 범세계 문명의 진화에서 필연적인 단계로서 해석한다. 식민화는 '박애주의적인 교육제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소한도 여러 지역에서 제3세계의 민중을 유럽인화시키려던 교육사업이었다. 뤼티는 前식민지 민중들 자신이 이런 세속화 과정에서 빚어진 근본적인 영향을 원상태로 돌리고 싶어하지 않으며 과거에 식민지였다는 점에 대해 윤리적 자기비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루가드 卿 Lord Lugard의 시대에 영국의 식민지 정책은 가능한 한 토착민의 사회구조와 문화를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결국 이 정책은 실패하여 퇴조하였다. 대조적으로, 뒤늦기는 했지만 프랑스의 무자비한 동화 정책은 성과가 있었던 듯하다. 뤼티는 프랑스의 식민화야말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고대적 사회질서에 대한 서구문명의 승리 - 이른바 서구의 잉여 에너지를 대표하는 수천의 식민개척자, 탐험가들에 의해 진행된 과정 - 라고 본다. 이러한 잉여 에너지의 폭발은 케케묵어 사라져가거나 화석화된 비유럽 세계의 정치사회 질서를 산산조각내어버린, 진정한 원동력이었다. 서구 산업국가의 경제적인 이해란 침략적인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이것과 거의 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서구 강대국이 배치한 물질적 힘과 그것이 창출한 결과 - 유럽에서 온 소수의 침략자와 탐험가들의 공격을 받아 거의 저항도 못해보고 굴복해버린 제3세계 - 사이의 기묘한 불균형"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그 어디에서도 저항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지닌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방어할 가치가 있는 자유나 독립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거나, 혹은 어떤 지배자와 다른 지배자 사이의 차이에 관심을 가진 민중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 오놀날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게끔 해준 것은 바로 식민지 개척자의 공로이다.
이리하여 전식민지 문화가 지니는 터무니없는 약점은 식민화와 제국주의를 유럽강대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의 견지에서만 배타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데 대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해외영토에 힘의 공백이 생겨 '일반적인 약탈과 해적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점차로 혼돈된 상황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것 말고는 어떤 선택의 가능성도 남겨지지 않았던 장면에서만 생겼다. 이리하여 식민지화는 단순히 피정복민을 착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즉, 그것은 일차적으로 교육과 문명화의 작업이었다. "식민 정책이 단순한 힘의 행사를 넘어 내적인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 곳 어디에서나 그것은 그 임무를 최종적인 해방을 목표로 삼는 교육 작업으로서 간주하였다." 뤼티는 제국주의가 풍부한 토착문화를 야만적으로 파괴했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한다. 유럽세계의 질서가 붕괴했던 이유는 식민지 민중이 저항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럽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비유럽세계에게는 일반적으로 식민제국들의 시기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피에 얼룩진 역사 속에서는 거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였다."
이런 주장들은 서구의 정책에 대한 명백한 변명이다. 현대의 일부 연구가들은 제국주의야말로 제3세계가 고통스럽게 벗어나려고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벗어나기 못하고 있는 저개발의 상태를 광범하게 창출해냈다고 본다. 그런데 뤼티는 이런 주장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 식민주의에 대한 그의 분석은 유럽인들이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에서 유럽 우위의 물질적, 정치적, 윤리적 기반"을 스스로 파괴시켜 버렸다는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다. 제3세계 해방운동에 관해서는 그는 그것이 "변화를 원하는 민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주인으로 자처하거나 성급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반란"이라고 간단하게 언급한다. 그러나 이런 비평에 내포된 도독적 경향은 그릇된 것이다. 그 '반란'은 불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과정의 단순한 가속화일 뿐이었다. 즉, 그것은 제3세계의 민중들이 유럽지배자의 보호에서 효율적으로 벗어나 자기 나름의 문화를 창조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뤼티는 식민주의 시기와 그 최후 단계인 제국주의 시기의 객관적인 역사적 결과는 감상에서 벗어나 평가되어야 하며 어떤 점에서는 토착민들에게도 유익했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정당시하고 있다.
데이비드 랜즈 David Landes도 이와 유사한 시도를 하였는데, 그는 제국주의의 본성을 특정한 경우에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것의 설명은 '장소와 상황을 초월한다'고 주장한다. 랜즈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나는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적 해석을 정력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그러한 해석은 실로 중요한 인과관계를 조명해 줄 수도 있지만, 실제의 사실에 부딪칠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 "국내의 사업가는...투자하여 부자가 되는데 혈안이 된 탐험가, 국수주의자, 정치가들보다도 식민지 개척의 타산성에 대한 환상을 훨씬 적게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 요인은 도처에서 작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식민개척자뿐만 아니라 식민지 민중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제국주의적 팽창의 주도권은 본국의 권력과 자원 혹은 외세를 - 흔히 민족적 위신에 호소함으로써 -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식민개척자, 탐험가, 정치가 등 공동체의 주변집단에 의해 장악되었다. 사실 제국주의는 힘 - 그것이 정치적이건, 군사적이건, 문화적 혹은 경제적이건 - 의 불균형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다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지배하게 되는 곳 어디에서나 일어났다. "제국주의는 단순히 힘의 불균형에서 생겨나는 공통의 기회에 대한 다양한 반응으로서 보아야 할 것처럼 생각된다. 그런 불균형이 존재했던 때와 장소에서는 항상 그것을 이용하려고 든 사람들과 집단이 있었다." 그 힘이 서로 균등하지 못한 강대국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불안정하다. 약한 쪽에서는 열등함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물질적인 면에서 불리하게 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것이 수반하는 윤리적인 굴종 때문이다. 한편 강한 쪽에서는 언제나 자국의 안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국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런 설명방식은 세기의 전환기에 신랑케주의자들이 발전시켰던 정치적 제국주의론과 여러모로 흡사하다. 그러나 그것의 기반은 훨씬 더 광범위하며 새로운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랜즈가 힘의 불균형에 언급할 때, 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가 권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실체의 역사적 추진력을 이루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자원의 총합을 가리킨다. 이런 정의에는 간접적인 - 문화적이건 경제적 혹은 기술적이건 - 지배 형태나 오늘날의 세계에서 산업국가와 저개발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과 같은, '영향력' 있는 속박들도 포함된다. 랜즈의 논의는 세계의 산업화된 지역과 저개발 지역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제국주의적 종속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국가들이 제국주의에 관한 한 결백한 상태를 되찾았다고 느끼는 경향과 반대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편 랜즈의 정의는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실체의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 결국 '힘의 불균형'이란, 근대 제국주의에 대한 해석이 그 테마를 보편적인 견지에서 정의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붙어 다니는 동어반복적인 공식 가운데 하나이다.
3. 사회경제적 이론
서구의 제국주의 이론은 대부분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자체의 필연적인 단계로서가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가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 충격을 가한 데서 생겨나는 이해의 결합과 특정한 사회구조의 결과로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해석들의 대부분은 슘페터의 고전적 논문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정상적인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해외영토를 착취하는 데 기반을 둔 '약탈적', 독점적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막스 베버의 논의에서 유래된다. 이리하여 제국주의의 참된 원천은 금융자본과 수출지향적 산업의 경제적 이익이라기보다 민주주의의 진전에 위협을 느끼는 집단의 정치적, 사회적 이해이다. 물론 이 집단은 흔히 중공업 부문이나 제국주의적 착취에 특히 관심을 가진 다른 부문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제국주의가 시대착오적인 지배형태와 사회구조의 특수한 산물이며, 그리하여 근대의 공리주의적인 산업사회에서는 '격세유전적'인 경향에 해당한다는 슘페터의 주장은 지금 논의중인 사상 유파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데, 이 학파는 사회 심리학적인 주장에 반대하여 보다 순수하게 사회학적인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다. 자유주의적 모형의 자본주의 산업 사회에서는 본질적으로 세계주의적이며 국제적 교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 레닌의 가정과는 반대되는 - 주장이 선뜻 부활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서구 유형의 다원적 산업사회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과를 용서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논자들은 원리적으로 서구의 입헌민주주의가 모든 제국주의적 경향을 소멸시켜 나갈 수있으며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 배출구나 투자기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케인즈는 홉슨의 주장을 발전시켜 민주주의 국가가 제국주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길로 서구산업사회의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현실적인 사태를 지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의 정신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조건의 철저한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상가들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다. 이들 중 한 사람이 한나 아렌트인데, 그녀는 모든 형태의 근대적 전체주의를 고발하고, 그 뿌리가 19세기 말의 제국주의적 행위와 이데올로기에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슘페터와는 다른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슘페터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란 결국 산업사회에까지 존속된 前민주적 사회구조의 잔재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다소 조잡하고 단순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윈스로우 E. M. Winslow는 제국주의가 서구산업사회의 봉건적이고 군국주의적인 태도의 잔재에서 기인한다고 기술했다. 그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산업강대국에 의한 비공식적이고 온건한 세계지배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전통적 위계질서 구조가 폐지되었더라면 무력적 팽창과 해외 지배 체제로서의 제국주의를 초래하였던 특정한 자극요인은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견해는 상류 부르조아는 물론이고 과거에 저질렀던 제국주의적 무절제의 모든 책임에 대하여 자본주의 그 자체를 용서해 주는 경향이 보다 적은 사상가들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다. 그들 모두가 발테르 슈츠바하 Walther Sulzbach처럼 피상적으로 논하고 있지는 않다. 슘페터의 또다른 추종자인 슐츠바하는 위스로우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현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슐츠바하는 제국주의가 근대 민족주의의 특수한 산물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의 기원이 지금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지만 전제적인 유럽국가에 현저하였던 호전적 태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침략적이고 포악하며 호전적인 본능을 지닌 제국주의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사회구조의 이데올로기적인 잔재를 일소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문제에 대한 서구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슐츠바하나 윈스로우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예컨대 월트 휘트먼 로스토우 Walt Whitman Rostow는 그의 잘 알려진 저서인 "경제성장의 단계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의 이 저서는 근대 사회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역사 발전이론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의도된 것이었다. 로스토우는 어떤 단계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제국주의적 팽창 및 전쟁을 초래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박하지 않는다. 산업사회는 초기단계나 보다 성숙한 단계에서나 해외의 경제적 기회에 눈독을 들여왔다. 로스토우에 의하면,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은 근대 산업사회의 발전에서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질 뿐이다. 실제적으로 근대 산업사회는 제국주의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마르크스주의적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한편 로스토우는 경제성장에서의 현저한 불균형이 군사력의 현격한 차이와 결합될 때, 국지적이거나 전세계적인 성격을 띤 침략정책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의 견해에 의하면 제국주의적 팽창은 산업자본주의에 특유한 것이 결코 아니며 일반적으로 비경제적, 특히 정치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로스토우는 슘페터와 마찬가지로 산업화 이전 시기부터 상층부의 사회적 지위에 있었던 집단의 정치적 역할과 같은 전통주의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한편 성숙한 자본주의적 소비 사회에서는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으며 레닌의 견해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자본주의는 존속하기 위해 제국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식민주의는 실제적으로 사멸하고 있는 반면, 서반구, 서부유럽, 일본 등지에서 자본주의는 경이적인 급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이 이론은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와 결합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경제적 지배형태를 어느 정도 만큼이나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분류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언급하고 있지 않다. 로스토우의 제국주의관은 한정적인 것이고, 자본주의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제국주의를 초래할 것임에 틀림없다는 비난에 대항하여 근대적 형태의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임이 명백하다. 한편 로스토우는 그와 대립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의 탄력성을 항상 과소평가해 왔으며, 다소 저개발된 해외 영토를 착취할 필요 없이 현상적으로 확대할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서구의 이론가들은 제국주의가 유럽의 산업국가에 제공했던 경제적 가능성은 자본주의 그 자체의 성장에 상당히 중요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발달에 없어서는 안될 조건이었다는 마르크스주의의 견해 - 에릭 홉스봄 Eric Hobsbawm이 최근의 저서에서 신중하면서도 자극적인 용어로 제출한 견해 - 에 공감하지 않는다. 알버트 이믈라 Albert Imlah는 "팍스 브리태니커의 경제적 요소들 Economic Elements in the 'Pax Britanica'"에서 영국경제는 풍부한 해외자원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헤어날 수 있었고, 제국주의적 팽창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앞질렀다는 점을 수긍한다. 또한 사울 S. B. Saul은 서구의 주도적인 산업강대국인 영국이 제국의 안팎에서 창출해냈던 외연적 세계무역체제가 다국적 경제체제 및 세계무역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두 저자는 제국주의 정책에 의한 해외경제 기회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성장 사이의 필연적 연계를 전혀 가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논의된 모든 견해는 제국주의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을 보다 일반적인 사회발전의 이론 - 이론의 眞僞 여부를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대 이론 grandiose theory에 탐닉하기 보다는, 실제로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 정책의 배후에 있었던 행동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발전 이론 - 의 틀 안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4. 자유무역 제국주의 이론
서구 제국주의론의 발전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혁은 무엇보다도 비공식적 제국주의 informal imperialism의 개념이다. 공식적인 지배를 확립하는 데 선행하거나 수반되는 혹은 공식적 지배를 필요없게 하기조차 하는 비공식적 제국주의 지배형태가 무수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서구의 제국주의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보다 근접하여 갔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제국주의가 일차적으로 특정한 발전단계에 이른 자본주의 체제의 기능이며, 이리하여 그것이 그 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족국가의 힘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족주의적 현상이 아니라는 전제에 항상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비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극히 다양한 종류의 - 특히 경제적인 - 비공식적 영향력이 제국주의식의 종속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국주의적 세력이 식민지 주변부에서 언제나 정치적 권력의 실제적 사용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체로 제국주의 집단이 위기에 처한 경우에 중심부 권력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리하여 공식적인 정치적 지배는 제국주의적 종속의 정상적 형태가 아니라 가장 특수한 형태로서 나타날 뿐이다.
이 방면의 선구적 연구는 로날드 로빈슨과 존 갤러거의 "자유무역 제국주의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인데, 이제는 하나의 고전이 되었다. 이들의 저서는 '자유무역 제국주의' 이론을 영국 제국주의의 전통적인 연대기와 대립시키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 맨체스터 자유주의 Manchester liberalism(콥던 등 맨체스터 학파의 자유방임주의)의 反제국주의는 이전 제국의 상당부분에 자치정부를 승인해주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전통적 견해는 맨체스터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구식민제국의 해체시기가 지난 후, 1880년대 초반에 질적으로 새로운 신제국주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았다. 로빈슨과 갤러거는 이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대신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이 19세기 초부터 게속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식적' 지배와 '비공식적' 지배를 포함하여 지배방식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국 제국의 영토 확장 자체가 제국주의적 팽창과정을 꾸준히 추구해 왔음을 입증해 준다. 사실 빅토리아 시대의 제국주의는 대체로 1810년 이전과 같은 중상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국력을 자국의 무역보호에만 사용하도록 스스로 국한하였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에도 경제적 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할 때는 정치적 지배 형태를 사용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로빈슨과 갤러거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영국의 정책은 가능한 한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통제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따랐다. 전자의 방식을 '반제국주의적'인 것으로 후자의 방식을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이름붙인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이든간에 영국의 이권은 꾸준히 보호되고 확장되어 왔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로빈슨과 갤러거는 '비공식적 제국'의 이론을 발전시킴으로써 공식적인 영토적 식민지 지배에 의해서만 제국주의를 정의하던 전통을 결정적으로 타파하고 그대신 비통치적 성격의 제국주의적 요인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빅토리아 시대의 팽창의 진정한 원동력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연안의 정박지 몇 군데에 비공식적 통제를 행사하는 데 만족하였다. 정치적인 방법은 주로 폐쇄되어 있던 시장을 서구의 경쟁적 자본주의가 표면상 자유롭게 작용하도록 개방시키는데만 사용되었다. 대개는 경쟁적 팽창의 비공식적 방법에 우선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 초기부터 영국은 위협당할 우려가 있는 경제적 이권을 보호하는 데 공식적인 제국주의적 지배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언제나 그 방법에 의존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흔히 "무역은 하지만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자유무역 제국의 정책을 요약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비공식적 통제를 하면서 교역을 하고 필요하다면 지배하면서 무역을 한다"로 보아야 한다.
이 이론이 지니는 주요한 의의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말해서 시장지배와 부합되는 경제적 팽창방법을, 헤게모니나 간접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일체의 간접적 방법의 사용을 포함하여 여타 형태의 간접적 영향 못지않게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또한 그런 방법들은 대체로 최후의 수단일 경우에만 정치적 힘에 호소할 뿐 직접적으로 정치적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영국의 해외 팽창에서 정치력은 간혹 사용될 뿐이고,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영향력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1880년 이후 후기 단계에서 공식적 식민지 지배로의 전환은 일차적으로 유럽 강대국 사이의 경쟁이 격화된 탓이었다. 경쟁의 격화는 중심부 권력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낡은 유형의 '비공식적' 제국주의 지배를 지속시켜 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비공식적 제국'의 이론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여러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근대 서구의 제국주의 이론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는 고립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던 다양한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 요소들이란 특히 개인적으로 야심에 찬 탐험가, 사업가, 투기꾼들에 의해 촉진된 - 이전에는 거의 주목되지 않았던 - 해외 팽창과정, 급속히 발전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동태적인 팽창, 1880년대 초기부터 본국 국민 대다수의 민족주의적 열정에 의해 지원받았던 고도로 제국주의적인 공식적 영토 팽창의 단계 등이다. 그리하여 이 이론은, 주변부에 대한 무력 행사에서 기인된 18세기 이래의 지속적인 해외 영토획득과 1914년 이전 20년간의 열병과 같은 팽창주의를 설명하는 데 잘 들어맞았다.
새로운 개념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팽창과 비공식적 헤게모니나 공식적 식민지 지배에 의한 정치적 팽창이 동일한 과정의 두가지 측면이라고 보는 데 있다. 로빈슨과 갤러거의 관찰에 의하면, 빅토리아 시대 중반에 "상업적 침투와 정치적 영향력의 결합은 영국에 가장 잘맞는 경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것은 대체로 의식적으로 계획된 작용이었다기 보다는 영국의 경제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생겨난 자동적인 과정이었다. 정치가들은 언제나 직접적인 식민지 지배를 확장시키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였다.
로빈슨과 갤러거는 영국이 무역과 해외투자로 지배적인 경제적 지위를 이룩했던 지역이 '비공식적 제국'과, 정치적 권력기구로 뒷받침되었던 좁은 의미의 공식적인 제국주의 지배에 복속되었던 식민지 및 지배지를 구분한다. 이런 정의에서 '비공식적 제국'에는 우선 직접, 간접으로 식민지라고 불려질 수 있는 전지역과 근대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개발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제국주의 세력의 영향권에 분명하게 속해 있는 한은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남미의 국가들이 그러한데, 저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지역은 대규모 해외투자의 우선적 지역으로서 1810년 이후 영국의 비공식적 제국주의 활동에 극히 중요한 활동무대가 되었다. 로빈슨과 갤러거는 비공식 제국주의의 일차적인 도구 중에서 본국의 기술적 이점이 발휘될 수 있는 강력한 무역관계 제도 - 대규모 해외투자에 의한 주변부 경제 침투, 토착의 지배집단 및 이익 집단을 중심부와 제휴하도록 설득하는 과정 -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공식적 권력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특히 영국 상업이나 혹은 자유무역 시대의 서구무역 일반에 대해 해외 영토를 개방시키는 문제일 때 특히 그러하였다.
로빈슨과 갤러거에 의해 정식화되었던 자유무역 제국주의 이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 첫째로 콥던 Cobden과 같은 자유무역의 주창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제국주의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의 고저적 교의가 비공식적 제국주의와 단순하게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른 비평가들은, 비공식적 제국주의적 팽창 방법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명될 때는 언제나 영국의 정책은 항상 정치적 압력, 정치적 영향력 및 영토지배에 의존하였다는 주장을 논박하였다. 특히 플랫 D. C. M. Platt은 영국의 무역업자나 투자가들은 대체로 본국의 정치적 도움에 의존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외지역에서 영국의 상인이나 은행가, 공채소지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정치적 수단의 사용이 요청되었을 때, 영국정부는 오히려 그것을 아주 꺼렸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플랫에 따르면, 이것은 특히 라틴아메리카에 적용되며 이리하여 1820년 이후로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하여 '비공식적 통제'를 행사했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과 다른 몇몇 학자들은 로빈슨과 갤러거가 발전시켰던 '지속이론 continuity theory'에 도전했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서 영토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1880년대의 제국주의적 팽창은 상이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배러크라프 Geoffrey Barraclough는, 특히 일반적인 유럽적 관점에서 볼 때 제국주의적 팽창이 전혀 새롭고 훨씬 더 침략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음을 주목하고 있다.
1880년대까지 영토확장의 주도권은 대개 본국 및 주변부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 집단에게 있었다. 정부는 대체로 상업적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배려해주었다. 그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칙허장을 주고 보호하였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표면에 나서지 않고 뒷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제 입장은 점차 역전되어 관련지역에서 자국민들의 직접적인 상업적 연계가 무시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 영토를 병합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 독점권으로 이윤을 얻으려는 사업부문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병합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國旗 이래에서 무역을 Trade follows the falg'이라는 구호는 적지않은 좌익 논자들이 그 타당성을 논박했으나 점점 인기를 끌게 되었다. 당장은 해외 영토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다고 할지라도 조만간에 수지맞는 식민지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해외영토를 획득하도록 강요받았다. 즉, 해외영토가 지니는 경제적 잠재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떠한 손실이 있더라도 해외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후대를 위해 권리의 경계를 명백히 한다"는 로즈베리 Rosebery의 표현에는 先買權을 가진 영토획득을 지지하는 중류, 상류 계급 내부의 강한 합의가 반영되어 있다. 이리하여 '비공식적 제국주의'의 개념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정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약간 조심스럽게 그것을 다루어 보기로 하자. 그것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경제적 잠재력이 각기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시장관련과 제국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인가 하는 물음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데 있다. 이 점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데이비드 랜즈는 토착민이나 노동계급의 착취를 초래하는 종속의 형태가 모두 제국주의인 것은 아니라고 주의를 주었다. 즉, 그런 두리뭉실한 정의는 진지한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곤 한다는 것이다. 그대신 그는 제국주의를 공식, 비공식의 정치적 통제와 명백하게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한다. 즉, 그에 의하면, "제국주의적 착취는 자유로운 매매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고용하거나 또는 자유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재화를 점유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여 제국주의적 착취는 비시장적 강제 non-market constraint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비공식적 제국주의'나 '자유무역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다소 약식으로 사용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
5. 사회적 제국주의 이론
'비공식적 제국주의'의 이론은 제국주의를 좁은 의미의 식민지 지배로 파악하던 이전의 정의를 대치함으로써 이전의 논의를 폐기하고 제국주의 이론의 발전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미국의 학계에서 비공식적 제국주의나 자유무역 제국주의는 특히 윌리암 애플맨 윌리암스 William Appleman Williams와 월터 라페버 Walter LaFeber에 의해 답변확정되었다. 이들은 미국의 제국주의를 북미대륙 정착에서 시작하여 대서양과 태평양 너머에 있는 국가들의 '문호개방'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함께 지속된 연속적 과정으로서 다룬다. 1898년과 1900년 사이에는 공공연한 제국주의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그것은 특히 1896년의 경기 후퇴와 이에 따르는 경제공황의 불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전의 正道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 나름의 반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그 이래로 미국은 기술적으로 우월한 미국 경제의 생산물과 자본에 전세계를 개방시키려는 의도아래 일관되게 자유무역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했다.
한스 울리히 벨러 Hans-Ulrich Wehler는 미국의 경험에서 연역된 이러한 연구들과 특정한 행태 유형 -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집단과 지배계층은 미국의 경제와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혁명을 피하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를 하고 있다는 윌리암스의 공식 - 을 이용하였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벨러는 비스마르크의 식민지 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것은 로빈슨과 갤러거에 의해 기술된 '비공식적 제국'에서 유추된 것이지만, '불균등한 경제적 성장'의 개념과 결합되어 있고 주로 근대경제이론의 성과에 의존하고 있었다. 벨러는 자유무역시기에의 해외팽창 방법과 1880년 이후의 직접적 제국주의의 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것일 뿐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근대 제국주의는 본질적으로 1873년 이후의 '대공황' 시기에 유럽 산업국가의 경제 성장이 중단되고 동요된 결과라고 해석한다. 주기적인 공황을 경험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경제에는 새로운 해외시장이 공급되어야 경제공황의 시기에 계속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팽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전체 사회 체제가 위협을 받는다는 '이데올로기적 합의'가 생겨났던 것이다.
이런 해석의 바닥에 깔린 제국주의의 개념은 전통적 이론보다 더 넓기도 하고 더 좁기도 하다. 제국주의 정책의 원인을 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찾는 한, 그 개념은 보다 좁은 차원의 것이다. 벨러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산업혁명 이래로 세계경제 발전의 근본적인 불균형과 산업국가에서의 경제성장의 극심한 파동으로 초래된 결과이다. 벨러의 용어 중에서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모든 형태의 팽창을 망라하는데, 심지어는 자유로운 시장의 공식적 지배에 따라서만 팽창할 때조차도 거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그는 체계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일차적으로 저개발국의 시장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면 여하튼 제국주의의 전형적 형태로 본다. 벨러는 이 정도로 그 용어를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것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그는 제국주의를 "서구의 산업국가들이 특수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산업화의 압력하에서, 여러 부문의 우월성 덕분에 세계의 미개발지역에 대해 확장시켜 온 직접적, 공식적인 혹은 간접적, 비공식적인 통제의 종류들"로서 정의한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탄력적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역사적인 자료들에서 깊이있는 통찰을 끌어내기가 어렵다. 더욱 면밀히 분석하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로간된 설명력이 있는 유형으로 결합되지 못한 다수의 제국주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점 - 예컨대 경제 및 기술의 우외가 제국주의로 귀결되어야만 하는가, 혹은 정치적 영향력이 시장지배를 기반으로 한 종속관계를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는 관계로 변화시키는 데 작용해야 하는가, 또 한다면 얼마만큼이나 작용하는가 등등의 문제 - 이 모호하고 미해결된 채 남아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벨러가 경제적 요인의 객관적 중요성에 관해서 아주 애매하게 표현한다는 사실이다. 때때로 그는 제국주의적 팽창 - 단순히 비공식적인 수출의 촉진이든 다소 직접적인 식민지 지배의 확립이든 - 이 일종의 경기 순환 정책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이런 관점에서 논리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데 주저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침체기에 본국의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관점에서 볼 때, 해외 식민지의 확립이 단기적으로는(실로 언제라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특히 독일에서 제국주의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집단들은 종종 큰 이득을 보지만(항상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제국주의는 경제적으로 결코 수지맞는 사업이 아니었다. 이리하여 벨러의 이론이 경제적 요인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부분적으로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또 부분적으로는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옮겨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면 제국주의 정책의 주요한 원동력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제국주의적 통제로써 얻게 되는 객관적인 경제적 이익에 있지 않고, 미래에 그러한 이익을 얻으리라는 주관적 기대에 있음이 판명된다. 벨러 자신도 근대 산업사회의 경제적 성장에서 식민지적 영토의 개방은 부수적으로만 중요할 뿐이었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순수한 경제적 설명은 경제적 자료에 의거하여 논의되면 오류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이미 윌리암스가 제시했던 보조이론, 즉 불균등 경제성장의 결과 독일 사회의 지배계급들 사이에는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팽창정책의 필요에 관하여 '이데올로기적인 합의'가 나타났다는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 이 견해는 제국주의 정책의 방법과 목적에 관해 당시의 광범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불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벨러에 따르면, 지배계급은 무슨 수단에 의해서든 경제적 팽창을 요구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회질서가 침해당하고 혁명이 발발하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국주의는 경기순환에서 변화를 완화시키고 경제적 성장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고안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지배 엘리뜨들이 아래로부터 발생하는 저항요소에 대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추구했던 전략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벨러는 부수적인 경제적 요인에 개의치 않고 근대 제국주의를 '사회적 제국주의 social imperialism', 즉 기존의 엘리뜨들이 산업화의 결과 실질적인 변동을 겪고 있는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정의한다. 여기에서 객관적인 위협은 주관적인 공포와 서로 뒤엉켜 있어 떼어놓기가 어렵다. 벨러는 이 이론을 비스마르크의 식민정책사 속에서 세부적으로 확정지으려 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비스마르크가 공식적인 식민지 정책을 지지했던 주된 동기는 자유주의적인 반대세력을 분열시키고 권력에서 제외시키려는 데 있었다. 단적으로 말해 그의 제국주의는 국내정치에서 연유된 것이었다. 즉, 식민지 획득 정책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그의 목적에 반대되는 모든 정치운동을 탄압하거나 방해하면서, 근대화의 조류에 대항하여 그 나름의 '보나파르트식 독재권'과 보수적 사회구조를 방어하려는 목적을 지닌 '조작된 사회적 제국주의'의 일 형태였던 것이다.
벨러가 제국주의 이론에서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보수적 요소를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사회심리학적인 보조이론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데올로기적 합의'라는 개념으로는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경제적 사오항과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의 정치학적, 사회학적 동기 사이의 이론적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사회심리학적 개념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 팽창 - 그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든, 혹은 그들의 위협받는 사회적 지위를 방어하려는 수단으로서이든 - 에 호의적인 지배계급의 사회심리학적 경향은 종종 그 자체가 객관적인 경제적 요인과는 독립적인 것으로서 단정된다. 벨러가 문제를 보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이다. 이처럼 그의 '사회적 제국주의'이론은 우선 무엇보다도 경제적 고려를 바탕으로 삼고 있는데, 다소 예기치 않게 사회심리학적인 유형으로 변형된다. 즉, 제국주의의 일차적 동기를 본국에서의 특권적 지위를 보강하기 위해 제국주의적 팽창을 촉진하려는 지배계급의 성향에서 구하고 있다. '사회적 제국주의'는 1873년 이후 '대공황' 시기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벨러는 이와 같이 그것을 그 이후의 시기, 특히 1896년 이후의 독일에 적용하고 있다. 그 시기에 이르러 경제적 풍토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였고, 경제성장에 파탄을 일으킬만한 문제는 거의 없었거나 적어도 1873년 당시처럼 중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였다. 궁극적으로 벨러의 이론은 절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각기 상이한 몇가지 설명방식을 애매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어서 논의의 문맥에 따라 이것저것이 불쑥 튀어나온다. 그러나 이론의 핵심은 제국주의는 전통적 사회의 지배엘리트들이 산업사회의 발전과 특히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운동의 성장에 위협받아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행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벨러의 '사회적 제국주의' 이론은 '내생적' 이론, 즉 제국주의적 팽창의 원인을 서구 산업사회 내부에서만 구하는 이론의 가장 급진적 예로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원인들을 일차적으로 객관적인 경제적 사실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에서 구한다. 벨러의 견해에서 볼 때, '사회적 제국주의'는 이른바 전통 사회의 사회, 경제적 구조를 해체시키고 지배게급으로 하여금 상승하는 자본주의의 이익과 밀접히 결합된 노력으로서 견제적인 전략을 추구하게끔 촉진시키는 세속적 근대화 과정의 결과이다.
6. 주변부 제국주의 이론
최근에 이르러 제국주의를 산업국가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사회심리학적 과정의 산물로서 보는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그것은 주로 유럽의 지배 아래 있던 해외영토의 발전에서 연유한다고 보는 일단의 비평가들이 나타났다. 이들에 따르면, 적어도 1880년 이후의 공식적 제국주의 시기에 주요한 추진력을 제공했던 것은 유럽이 아닌 바로 주변부에서의 위기였다는 것이다. 1960년대 초기에 로빈슨과 갤러거도 이러한 견해를 주장했었다. 그들은 초기의 관점을 어느 정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국주의 이론가들은 제국주의의 이유를 찾으려고 유럽을 면밀히 조사하였는데, 그 해답을 그릇된 곳에서 찾아왔다. 모든 것을 작동시켰던 중대한 변동은 아프리카 자체에서 발생하였다."
이 비평가들은 레오나드 울프 Leonard Wolf나 한스 울리히 벨러와 같은 서구의 이론가들뿐만 아니라 홉슨이나 여러 마르크스주의 학파의 이론까지도 '편파적 분석'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토착민과 토착 정치 엘리트들의 역할과 같은 중요한 측면을 무시한 일방적인 유럽 중심의 이론이라는 것이다. 로빈슨에 따르면, 고전적 이론들이 제국주의적 과정의 주요한 구성요소들은 모두 유럽적인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비유럽적 요인들을 무시해버린 한, 그것들은 거대한 착각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비평가들은 그 강조점을 달리하면서도 이전의 정치이론을 어느 정도 부활시켰다. 대체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제국주의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거나 기존의 제국을 확장시키는 문제가 아니었으며, 실제로는 예방적인 합병과정이 누적되고, "소유하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신조에서 이미 확보해 놓은 식민지를 보호하고 안정시키려는 방책이 강구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로빈슨과 갤러거는 저서 "아프리카와 빅토리아 시대인들 Africa and the Victorians"에서 이 새로운 해석에 중요한 기초를 닦아 놓았다. 이 책은 1914년 이전의 40년 동안 유럽 제국주의가 벌였던 '아프리카 쟁탈'이라는 중대한 국면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분석은 쟁탈 과정의 배후에 깔린 동기를 고찰한 전통적 이론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통 그 시대의 정치가의 탓으로 돌려왔던 제국주의의 동기들 가운데 몇 가지를 그들이 '제국주의의 당국자 정신'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찾았다. 정치가는 식민지 획득이 기존의 식민지를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고 국내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대중을 설득시켰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몇몇의 예외를 빼고는 정치가들은 제국주의 팽창을 주저하고 미덥게 여기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기존 제국과 - 무엇보다도 - 인도항로를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지배적인 동기였다. 이처럼 유럽 열강 사이에서 점증하는 경쟁관계가 팽창을 촉진시키고, 특히 비공식적인 지배를 공식적인 지배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자극제였다. 그러나 '거대한 계획'같은 것이 세워져서 이루어진 경우는 극히 희귀했다.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행위는 일반적으로 제3세계 지역 내의 위기에 의해 촉발되었다. 제3세계 지역은 토착 엘리트와 제휴한 비공식적인 제국주의 침투의 영향으로 그 기반까지 흔들려 각축하는 유럽열강이 개입할 위험성을 창출하였다.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정치가들은 원래 이전의 정치가들에 못지 않게 제국주의적 팽창을 불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곳까지 포함하여 여러 지역에 대하여 팽창정책을 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방향이 다소 빗나갔다. "그 답은 첫째로 아프리카 내부에서 일어났던 민족주의적 위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이전의 수십년 동안 유럽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했다. 아프리카 내부의 위기가 유럽 내부의 경쟁관계와 서로 얽혀있다는 것은 이차적인 이유일 뿐이다." '주변부적'요인(필드하우스 Fieldhouse가 도입한 용어)과 아울러, 결정적인 원인은 정치적인 것이고 경제적 원인은 부차적일 뿐이었다. 로빈슨과 갤러거는 "단일한 결정적 이유라는 관념에 바탕을 둔 어떠한 제국주의 이론도 아프리카 분할이라는 복합적인 역사적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주장한다. 1880년대 이래로 경제적 팽창은 영토적 팽창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즉, 경제적 논의는 대체로 기정사실화된 영토 획득을 정당화하려는 뒷궁리로 나온 것이었다. "소위 새로운 제국주의 논의는 이미 일어난 사실의 전후사정을 정당화했던 것이지 그것을 발생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이런 입장은 최근 데이비드 필드하우스 David K. Fieldhouse의 "경제학과 제국 1830-1914 Economics and Empire 1830-1914"에서 발전되어 체계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책에서 전통적인 '유럽중심적' 이론은 식민지 내부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변부적 제국주의'이론에 의해 공식적으로 부저오딘다. 전통적인 이론들은 식민지 시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실제사건을 통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는다. 국내무역이나 세계무역을 팽창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해외시장이 필요하다는 경제적 이론과 이와 유사하게 해외투자를 해야 자본주의가 존속할 수 있다는 이론 등을 반박하기 위해 통계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필드하우스는 제국주의 정책이 보호무역론자의 방책에 따라 실시되면 국내무역에만 이익이 있을 뿐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대부분의 경우 중심부 강대국들은 자국의 식민지와의 교역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런 교역은 제국주의 전성기에는 실제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해외투자 기회의 필요에 관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투자와 영토확장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었다는 것은 논의하지 않고,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유럽 산업국가가 전세계로 팽창해 나가는 거대한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식민지적 팽창이 그처럼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초기 저작에서는 정치적 제국주의 이론을 좇았던 필드하우스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새로운 접근방법에 비추어서 그것을 수정해 왔다. 위세 prestige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치가들은 제국주의 팽창에 대한 거창한 계획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보통 그것은 경쟁국들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 실제적인 혹은 가정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지책이 누적되어 생겨난 문제였다. "그리하여 제국주의는 호전성 때문이 아니라 불가피한 변동의 시기에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로 '당국자 정신'의 경계심에 의해 생겨났다." 특히 프랑스 제국주의의 경우 "식민지는 잉여의 산업가가 아닌...호전주의자들과 전통적으로 투쟁적인 신분들의 모험심과 호전성에 대하여 안전판을 제공했다."
한편 유럽에 의한 비공식적인 영향의 낡은 형식을 잠식시키거나 파괴시키고 공식적인 식민지 지배의 확립을 필수적이게 하였던 제3세계에서의 사태에 결정적인 중요성이 부여되었다. 제국주의는 일차적으로 산업국가가 발전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부의 불만족스런 조건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공식적인 지배의 확립은 "외적인 자극에 대한 중심부 강대국의 반응"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제국주의의 원인을 중심국 자체의 경제적 혹은 여타 과정에서 찾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용어로 표현된 원리는 필드하우스가 보완한 논의에서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게 된다. 거기에는 그 주제에 관해 대단히 가치있는 관찰이 담겨져 있다. 그는 '주변부 제국주의'를 성격이 판이한 두가지 주요 형태로 구분한다. 하나는 식민 정착자들이 수행하는 '亞제국주의 sub-imperialism'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무역 식민주의의 시기에 전형적인 방식으로 유럽인과 토착 엘리트가 다소 비공식적인 제휴를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사라지면서 그 귀결로 생겨난 '공식적 제국주의'이다.
'亞제국주의'에 관해서는, 그것이 지구상에 서구문명을 전파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기는 어렵다. 영국의 식민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불란서의 경우 - 자발적으로 그리고 종종 본국 정부의 명시적인 희망을 어기면서 - 무자비하게 영토획득을 감행했던 자들은 백인 정착자, 상인, 군인, 외교관들이었다. 세실 로즈 Cecil Rhodes와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 British South Africa Company가 했던 역할은 그 좋은 예이다. 여기에서 필드하우스는 갈브레이스 John Kenneth Galbraith가 제시한 '광포한 개척자'라는 고전적 개념에 언급하고 있다. 주변부의 토착민들과의 국지적 갈등 - 백인 식민주의자들이 일으켰든, 혹은 원주민 스스로가 무기를 들었기 때문이든 - 은 제국주의자들이 '법과 질서'를 회복시킨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영토 통제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만들었다. 식민지 영토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뚜렷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그리하여 만성적인 불안정은 제국주의 지배의 점차적 확대를 초래하였다. 보통 본국 정부는 이런 발전을 크나큰 우려나 심지어는 극도의 불만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였다. 그러나 대개 주변부의 '아제국주의자들'을 통제할 수는 없었고 결국에는 거의 항상 그들의 행동으로 생긴 결과를 재가해야만 했다.
필드하우스는 주변부 제국주의의 두 번째 형태, 즉 토착 엘리트와 유럽인 사이의 초기적인 제휴 형태가 붕괴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권력의 공백을 메꿀 필요로부터 생겨나는 식민지 지배를 중시한다. 주변부에서의 '민족주의적' 위기는 1882년 이집트의 경우처럼 토착체제를 전복시키고 몇몇 유럽 강대국에 의한 직접적 권력장악을 야기시켰는데, 필드하우스는 주변부에서의 이러한 민족주의적 위기가 유럽에 의한 다양한 종류의 침투에 기인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침투 자체가 제국주의적이었다는 견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필드하우스는 로빈슨과 갤러거와는 달리(이들의 견해는 다른 점에서는 그의 견해와 가깝다), 주로 경제적이고 문화적이며, 정치적 지원이 없이 지속된 낡은 방식의 비공식적 식민주의와, 1880년 이후 시기의 '새로운 제국주의'를 상당히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다. 구식민주의는 우선 무엇보다도 공식적인 정치적 지배를 확립시키지 않고 제3세계를 서구산업체제와 경제적으로 통합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 1880년 이후의 '새로운 제국주의'는 거대한 규모의 직접적 지배를 확립시켰다. 필드하우스는 이처럼 후기 단계의 유럽팽창을 경제적인 원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한다. "유럽의 경제적 필요가 표출된 것으로서 볼 때, 영토적 제국주의는 대개 당치도 않은 것이다." 한편 유럽 경제의 객관적인 필요와 거의 관계가 없었던 특수한 경제적 이익이 주변부에서의 '사태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가능한다.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을 기초로 하여, 필드하우스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망라하고 유럽의 변화무쌍한 해외팽창과정을 단 한번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제국주의 이론을 고안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경우 주변부에서의 상황은 어떤 틀을 구성해주는데, 그 안에서 전통적인 유럽중심적 설명방식은 상당히 그럴싸하게 된다. 필드하우스는 중요한 경제적 이권이 제국주의적 팽창과정에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식민지 권력으로 하여금 식민지 지배에 개입케 하고, 많은 경우 직접적인 영토적 지배를 확립케 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의 경제적 과정이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본국의 경제적 동기와 해외영토 팽창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단호하게 부인한다. 즉,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주변부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고 '현지에 있는 백인'이나 토착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드하우스 자신도 다소 공식적인 영토지배나 제국주의 지배의 확립보다 보통 비공식적인 경제적 침투가 앞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그는 특수한 경제적 이해가 작용하였다는 점을 인정 - 이것이 그의 일반 이론이 갖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필드하우스의 견해에 의하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팽창률의 현저한 증대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압력이 강화되었다는 이유로 설명할 수 없고,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이 주변부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오히려 토착사회가 겪을 위기(부분적으로 유럽의 비공식적인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침투에 기인)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변부적' 설명은 1880년대부터 제국주의가 계획에 따라 펼쳐진 정교한 과정이 결코 아니었음을 설명해 준다. 제국주의는 사실상 주변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일련의 - 대체로 독립적인 - 해결책의 총합이었으며, 그것은 전체로서 돌이켜 보았을 때만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필드하우스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이리하여 경제학과 공식적 제국 사이의 활발한 연관은 식민지에 대한 중심부의 경제적 필요도 아니었으며 사적인 경제적 이권의 요구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제적 혹은 기타의 이유를 가진 유럽의 기업에 의해 주변부에 창출된 2차적인 문제들의 결과였다. 거기에 단순한 경제적 해결책은 없었다. 한편에서 그런 문제들은 유럽 관료계가 '일급의' 국가이익으로 생각하였던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편에서 그것들은 다른 유럽국에 의하여 만족할 만한 무역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차단당하거나 토착정권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약간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경우에도 공식적 병합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은 원래는 경제적인 문제였던 것이 어느 정도 '정치화'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하여 정치적 해결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대로 필드하우스는 유럽 산업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및 기타의 이익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제3세계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는 제국주의의 원인을 첫째, 해외 영토에서의 전통적인 정치질서의 붕괴, 둘째 , 유럽의 경제적 침투로 야기된 정치적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토착민들의 능력의 부재로 본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 이론은 변명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험가, 무역업자, 군인, 총독의 역할뿐 아니라 토착 민중의 역할에 최초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제국주의자들은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종종 그 숫자가 비교적 적은데 비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로날드 로빈슨은 훨씬 짜임새 있는 견해를 폈는데, 최근에 그는 주변부적인 요인을 다원적 제국주의 모델에 관련시켰다. 그가 말하는 다원적 제국주의 모델은 필드하우스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통적인 유럽중심론을 거부한 것이다. 로빈슨의 이론은 서구중심적 설명 이상으로 실제적인 사건들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유럽중심적 설명이 제국주의 팽창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유럽사회에 관한 사고체계를 외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유럽중심론자들은 주변부에서 실제로 무엇이 발생했는가는 고려하지 않고 "제국주의 건설을 유럽의 산업적인 정치경제학의 일 기능으로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제국주의는 유럽과 비유럽의 정치 사이에서 벌어진 상호작용의 산물이었다. 이 두 구성요소가 제3세계의 비유럽적 구성요소 - 토착민의 제휴나 저항 - 와 서로 엇갈린 목적으로 작용할 때, 유럽의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팽창은 제국적인 형태를 띠었다.
로빈슨은, 숫적으로도 지국히 적고 본국의 지원도 확신할 수 없는 백인 식민주의자들이 그런 거대한 제국을 성립시킬 수 있었던 데는 토착 사회집단의 도움이 컸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1820년 무렵부터 1870년까지의 산업제국주의의 첫 단계에서 유럽인들은 영토 지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두 대륙이 유럽의 무역과 기술에 개방될 수 있도록 토착체제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부심하였다. 거의 모든 경우 주변부의 개인 및 사회집단은 오로지 민족적인 이유에서 근대화를 열망하였고, 그리하여 유럽인들과 제휴 -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 할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의 이러한 낙인은 주변부에서 토착 제휴자들의 지위를 잠식해 갔고, 유럽국가의 각축으로 직접적인 식민지 지배의 확립을 가속화시키고 필연화시키는 상황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생각되던 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유럽이 공식적으로 지배하게 된 이후에도 '현지에 있는 백인들'은 토착엘리트와 함께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국 정부가 여전히 인력과 화폐, 정치의 측면에서 제한된 관여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빈슨은 나아가서 1880년 이후 세계의 대부분에 성립된 공식적인 제국주의 지배는 지역사회의 격변으로 이전에 붕괴되었었던 주변부에서의 '제휴가 재구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 그는 또한 주변부적 제국주의를 언급하면서 필드하우스의 입장을 따르기보다는 '외부중심적 접근 excentric approach'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유럽중심적인 요인들이 주변부의 요인들과 결합되어 있는 다원적 모델을 설정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연구에 유익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제3세계 지역을 서구의 산업경제로 합병시키려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역동성과 그리고 각축하는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식민지 소유를 제한하고 공식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권력 정치 과정은 제국주의적 팽창을 야기시키는 토착사회의 내부적 과정과 결합되었다. 로빈슨은 이러한 발전에서 주저없이 주변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실 주변부에서의 위기의 표출은 부분적으로 비공식적인 유럽의 영향력과 자유무역 제국주의 탓도 있었으나 별개의 지역적 원인에서도 비롯되었다. 애초에 유럽 열강으로 하여금 유럽적 모델에 따라 비공식적 통제에서 공식적인 지배로 전환하게끔 한 것도 바로 이 지역적 원인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가들은 이런 발전을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새로운 식민지 행정을 아주 견고한 지반 위에 다지려 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여, 제국주의는 합리적이고 정교하며 짜임새 있는 사업이 아니라, 유럽의 제국주의 수행자나 그 희생자 모두에게 점점 더 어찌할 수 없는, 우연적이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고도로 복합적인 과정이었다.
근대의 제국주의 이론은 어느 것이나 '주변부 학파'의 도전을 받아야 했다. 처음에 이 학파는 - 적어도 필드하우스와 플랫의 경우 - 대개 수세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산업국가와 저개발국가 사이의 관계 및 오늘의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의 장기적인 영향을 이전의 어느 이론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변부론적 접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의 하나는 제국적 합병의 시기와 대상을 결정하는 데 토착제휴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점이다. 둘째로, 그것은 이제까지 그렇게 충분하게 강조되지 않았던 점, 즉 토착제휴자들의 정권이 토착민들의 지지를 상실한 뒤에도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권력을 가진 토착제휴자들의 정권을 유지시킴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 삼았다는 점을 조명해 주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공식적인 제국주의적 팽창을 제한시켰으나, 토착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근대화를 저해시키는 데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 경우 공식적인 제국적 팽창에 의혹을 갖고 그것을 고작해야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던 집단들은 대개 공식적인 식민지 지배보다 간접적인 통제전략을 선호했던 집단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유럽의 제국주의는 제3세계의 정치적 발전을 지체시키고 기타 여러 영역의 진보를 저해시키는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과정의 궁극적인 결과는 오늘의 세계 상황에서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제5장 신식민주의 이론과 저개발 이론
1. 국가 독점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
레닌과 로자 룩셈부르크의 예언과는 반대로, 공식적인 제국주의 지배의 소멸 - 1919년에 시작하여 2차세계대전 후에 갑자기 종결된 과정 - 은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 본질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았다. 분명히 자본주의는 제3세계에 뿌리내렸던 제국주의 구조, 적어도 공식적인 성격을 가진 제국주의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사실 서구는 몇몇 자원에 관한 한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제3세계의 국가, 특히 중동지역의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1974년의 석유위기에 의해 극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그 위기는 또한 서구의 강대국이 제3세계 국가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은 고사하고 이미 정치적인 힘조차 사용할 수 없는 지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제국주의의 시대는 소멸되고 묻혀버렸다.
그런데 서구의 이론가들은 식민지가 독립하고 민주적인 자결을 이룸으로써, 적어도 서구의 산업국가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외 영토를 포기한 것을 끝으로 제국주의는 실질적으로 사라져 버렸으며, 원칙적으로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다소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전의 식민지에 대한 공식적인 독립의 승인이 진실로 제국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독립은 했어도 제국주의의 지배 여파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은 마치 진리의 화신처럼 열렬히 신봉하여 왔던 그들의 기본적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구 진영의 학자들은 관제 여론 조작으로 호된 비판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서구의 신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의 경우는 특히 그러했다. 동구에서는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인 본질에 관한 낡은 공식이 여전히 대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었다. 반면, 서구에서는 잠시동안 그 두가지 관념의 상호관계에 관해 활기띤 논쟁 - 물론 그 논쟁은 명백히 고도로 산만하여, 정확한 용어로 환원시키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지만 - 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선 일단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각기 다르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이론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실제적 발전에 따라 재구성하고, 그리하여 정치적 비판력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목적 때문에 종종 비판적인 이론과 정치적 선동 사이의 구분을 두리뭉실하게 한다. 이 그룹의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최근의 발전에서 식민지 지배를 어느 정도 불필요하게 하는 수많은 장치들을 개발해 내었고, 이러한 장치들은 여타의 수단에 의해 이윤율 저하의 법칙과 자분주의 생산체제의 내적 모순이 점차 첨예화되는 것을 중화시킨다고 파악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적어도 주변부의 저개발 지역을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한다는 의미에서의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하는 데 더 이상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비평가들은 이러한 제국주의를 '후기 자본주의적' 조건 아래에서 독점자본주의의 일관된 전략적 장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특히 모리스 돕 Maurice Dobb과 폴 스위지 Paul Sweezy는 1930년대에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 개입의 증대로 특징지워지는 질적으로 새로운 발전단계라고 적고 있다. 돕은 "자본주의의 발전 연구 Studies in the Developmant of Capitalism"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들의 공통적인 요소는 경제운용에 대한 국가의 일반화된 통제체계를 가진 생산과정과 자본가적 소유권의 공존이다. 국가는 개별 기업의 목적과 동일하지 않은 목표를 추구한다."
스위지와 돕은 엥겔스의 국가 개념 - '이상적인 집합적 자본가 ideal collective capitalist'로서의 국가 -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으며 거기에 특수한 정치적 관점을 부여했다. 우선 국내시장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개인주의적 국가 - 이 개념이 아직 실제적으로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 이다. 한편 군국주의적 정책은 국가 자체를 구매력의 창출자로 전환시켜 비생산적인 군비지출의 형태로 잉여생산의 상당 부분을 계속 흡수한다. 물론 이에 따라 전쟁의 위험은 엄청나게 커진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경기순환에 개입함으로써 경제공황의 해악을 완화시킬 수 있고,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사회적 긴장이 가져올 위험스런 해독을 방지하는 정책을 택한다. 국가 계약에 의하여, 그리고 경제의 국가 통제부분을 확장시킴으로써 제국주의적 자본수출의 기능을 대치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제국주의적 자본 수출은 제3세계에서 민족적 저항의 각성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이미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돕과 스위지는 나찌즘과 파시즘을 해외 대신에 유럽 내부에서 자본 확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려는 시도로서 해석한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조건 속에서 제국주의는 새로운 색채를 띠게 된다. 즉, 주변부 지역에 대한 침투가 거의 중요성을 잃었기 때문에, 제국주의는 세계에서 비교적 개발이 잘된 지역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통제하려는 산업국가들 사이의 경쟁으로 된다. 그러나 탈식민지화가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험을 노정시키지는 않는다. 국가 독점 체제는 끊임없는 외적, 내적 갈등의 대가를 치뤄야 하긴 하지만 다른 수정안과 완화책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 윌리엄 홀가르텐 George William F. Hallgarten의 근대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는 여러모로 돕과 스위지의 견해와 가깝다. 단, 그의 연구는 경제적 원인에 관한 한 훨씬 더 체계적이다. 홀가르텐의 가장 중요한 저작은 1930년 초에 쓴 "1914년 이후의 제국주의 Imperialismus vor 1914"인데, 그는 사망하기 직전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완하여 덧붙이고 '20세기 제국주의의 운명 The Fate of Imperi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홀가르텐의 접근방식은 일차적으로 사회학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데, 지도자 집단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 심리학적 고찰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여 강대국, 특히 영국과 독일의 제국주의적 행위에 책임이 있었던 산업 및 금융 자본의 흑막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데 부심하였다. 그러나 그의 특수한 결론 몇 가지는 실제로 신빙성이 거의 없다. 레닌을 좇아 홀가르텐은 제국주의의 개념을 영토적 합병과 저개발 지역의 경제적 착취로 국한시키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구조가 직접 표출된 것으로서 본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홀가르텐은 제국주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는 둘 다 국내의 노동자와 식민지의 토착민들에 적대적인 전쟁을 의미한다. 이것이 인류의 안정을 해치는 무장한 독점 및 금융자본, 트러스트의 세계인데, 그것은 마침내 백인 전체를 포괄하게 되며 이 힘으로 행동을 개시하게 된다. 유럽국가들의 잉여 공산품과 희소 원자재에 자극되어 제국주의는 이 나라들을 다양한 투기장으로 몰아댄다. 제국주의는 범세계적 과정으로 출범하기 위하여 수천의 금융가 및 상인, 군지도자, 의사, 기술자, 지리학자, 지질학자, 정치와 산업 분야의 전문가, 교사, 선교사까지 포함하여 거대한 지원군과 외인부대를 동원하고 이용한다. 이런 활동의 대상과 희생물은 유럽의 자본주의 열강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모든 나라들이었다. 여기에는 짜르 치하의 러시아와 같이 광대하고 후진적이며 경제적으로 저개발된 나라들, 그 당시의 발칸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처럼 경제적으로 아직 개방되지 않았던 신생국들, 일본, 중국, 터어키, 페르시아와 같은 구동양적 전제군주국들, 인도와 같은 19세기의 중상주의적 식민주의의 희생국들, 제국주의 시대에 획득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등지의 식민지 주민들이 포함된다. 제국주의의 희생자는 백인을 포함하여 지구상의 모든 인종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홀가르텐에 따르면, 중공업과 고도화된 금융이 1914년 이전의 몇십년 동안 국제정치의 주요한 추진력이었다. 또한 그는 1933년에 히틀러가 권력을 계승하게 된 것도 중공업에 주요한 책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파시즘은 제국주의의 특수한 변종이라고 주장했다. 홀가르텐은 제국주의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첫째 단계는 1918년까지의 고전적 제국주의의 시기이고, 둘째 단계는 그 이후부터 1945년까지, 그리고 셋째 단계는 오늘날 두 초강대국 사이의 경쟁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시기이다. 둘째 단계동안 주요 산업강대국들은 한 두 명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결정에 대체로 의존해 있었는데, 그 결과 "그 단계에서 제국주의의 현저한 특징은 대중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말려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전적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반대하여 오늘날의 독점자본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식민지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며, 식민지의 기능은 군비가 대신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의 준엄한 비판은 당연히 미국에 향해져 있는데, 역사상 가장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로서의 미국은 고대 로마의 노예경제와 비교된다. 미국의 군사력은 정치적, 전략적 안보를 최대한 창출해냄은 물론 자본주의를 안정시키고 또 전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바쳐지고 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대체로 전세계 차원의 정치경제적 관점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제국주의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서 홀가르텐은 마르크스주의의 개인주의적인 변형을 고수함으로써 자본주의 그 자체의 팽창적인 경향에는 주목하지 않고, 특정한 기업가나 은행가의 사악한 경제적 이익, 그들의 권력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주목한다. 여기에서 제국주의는 경제구조 그 자체에서 기인된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고도화된 금융과 중공업의 영원한 결탁으로서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홀가르텐의 무의식적인 추론은 여전히 자본주의 경제의 고전적 자유주의 개념의 틀내에 머물러 있다. 말하자면 그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을 뿐이다.
2. 거대독점 지배로서의 제국주의
고전적 독점자본주의 이론을 되돌아 보고 그것을 다국적 기업까지 확장시켜 본다면,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의 발전은 톰 켐프와 같은 학자들의 저서에서 발견될 수 있다. 켐프는 자본주의 체제의 미래에 관한 레닌의 예언이 전적으로 들어맞지는 않았지만, 그의 독점자본주의 이론은 아직도 타당하며 현대 자본주의의 경향을 해석하는 데 가장 좋은 열쇠라고 주장한다. 켐프는 신마르크스주의 진영의 최근의 발전을 완전히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입장이 지니는 현저한 특징은 사회적, 정치적 과정 안에서 정치 체제에 비교적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수위지나 돕, 특히 홀가르텐과는 다르다. 이들은 모두 파시즘의 현상과 그것이 경제적 원인의 탓만은 분명 아니라는 사실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어네스트 만델 Ernest Manndel과 같은 여타의 학자들은 이 점에서는 주로 켐프의 주장을 따랐다. 켐프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중심국과 식민지 사이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는 것을 바르게 지적하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통적인 입장으로의 부분적인 복귀는 신마르크스주의적 논쟁의 새로운 국면, 즉 거대독점 및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의 논의의 이행을 암시한다. 오늘날 제국주의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상적인 집합적 자본가'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바로 그것들이다. 즉, 국가의 권력은 대기업에 의한 경제적 결정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고 독립적인 민족 국가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지배형태는 점차로 폐물이 된다. 켐프의 견해에 의하면, 오늘날의 상황은 우선 무엇보다도 거대 회사들이 국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규정된다.
'다국적' 성격을 띤 기업을 포함하여 거대한 개인 기업과 국가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수립되어, 개인 자본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말하기가 점차 어렵게 된다. 국가는 사적 소유와 상품 생산의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조건을 방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축적 과정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부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켐프는 이런 전제 위에서 제국주의를 일차적으로 오늘의 세계상황에서 금융자본주의적인 국제 기업들 - 특히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 - 의 비공식적인 경제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탈식민지화'라는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석은 이리하여 저개발 이론으로 전환된다. 저개발은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자원들을 지배하는 독점자본주의의 - 유동적이나 아직도 건재한 - 이면인 것이다. 이 이론은 강조점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최근의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일반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광범위하게 답변확정되고 있는 논의는 탈식민지화가 자본주의의 전술상의 변화를 의미할 뿐, 전략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발전도상국이 산업국가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모순의 표현일 뿐이다. 신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산업국가와 발전도상국 사이에 경제적 갈등이 나타나고 그 간격이 좁아지기 보다는 더욱 넓어진다는 사실을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의 기본적인 정확성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여긴다. 그러나 경제적 후진성의 구체적 현상에 대한 분석이 제국주의에 관한 최근의 마르크스주의적 저작에서 점차 현저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는다.
켐프 자신이 솔직히 말하고 있듯이,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신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은 고전적 제국주의의 시기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계속되고 있는 '세계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도를 품고 있다. 즉, 그것은 '노동계급의 정치의식을 일깨우고'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이와 동시에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지닌 독단론에서 벗어나서 마르크스로 돌아가 새로운 이론을 구성해내려는 몇 가지의 시도가 있다. 이런 움직임의 결과는 썩 뛰어난 것은 아니다. 예컨대 크리스텔 노이쉬스 Christel Neususs는 자본의 국제화, 즉 서구 산업국가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세 단계 - 상업적 교환의 단계, 자본수출단계, 다국적 기업에 의한 현재의 경제적 통제의 단계 - 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정식화시켰는데, 경험적 자료와 잘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녀는 이 과정이 위협받아 거꾸로 되었을 때, 민족국가의 지원이 추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해리 맥도프 Harry Magdoff의 저서에서는 강조점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맥도프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필연적 단계이며 특히 - 레닌이 주장했듯이 - 독점단계에서의 자본주의라고 보는 점에서는 고전적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특히 식민지 착취의 기회가 소멸될 때 자본주의가 붕괴되리라는 이론을 부정한다. 그는 또한 제국주의적 팽창이 잉여자본의 과도한 공급 때문에 생겨나며, 해외투자는 이윤율 저하의 법칙을 피하기 위해 추구된다는 견해도 부인한다. 최근의 발전과정은 제3세계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꺼리는 것이 특징인데, 여기에 관해서 맥도프는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결합시킨 새로운 설명 모델을 만들어낸다. 그는 중심부 국가에서의 거대 독점의 상호 경쟁이 결정적 특징이며, 그것의 효과는 정치적인 지원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팽창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맥도프는 경제적 팽창이 투자 부문의 꾸준한 확장과 더불어 독점자본주의의 조건 하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본질적인 특징이며, 그것은 몇몇 고도 산업국가들이 서로 경쟁함으로써 심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아울러 그는 자본주의 사회와 민족주의적 구조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언급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민족주의는 그 체제의 국제주의의 분신이다. 번창하는 자본가계급은 국내시장을 발전시키고 적절한 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에 못지 않게 경쟁하는 민족국가들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해외 상업과 투자의 기회를 안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민족국가의 힘을 필요로 한다.
맥도프는 정부가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가 집단의 압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준 계급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동시에 모든 정부, 적어도 선견지명을 가진 정부는 자본주의와 그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정책을 많거나 적거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는 국가나 자본가 계급의 경제적 기회를 제국주의적 수단에 의해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정치적 요인은 여러 요인중 하나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식민주의의 종언이 제국주의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맥도프의 견해에 의하면, 성숙한 산업사회의 매카니즘과 특히 거대독점 및 다국적 기업의 이익은 제3세계 국가의 중심부 국가에 대한 경제적, 금융적 의존을 최대한 영구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소련의 존재만이 이런 매카니즘의 적용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라들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이전의 중심부 국가에 의한 정치적 행위의 필요없이 과거의 식민지 지배의 형태들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것을 보장하였기 때문이다.
중상주의 시대에 비롯되어 오랜 역사를 통해 성숙되고 심화되어 온 종속관계를 근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역 및 금융이 식민지, 반식민지의 경제와 관련을 맺게 되는 여러 발전단계에서 후자의 경제구조는 점차로 중심부에 부속되는 역할을 하도록 편성된다. 시장의 맹목적인 힘과 군사력의 뒷받침으로 가격의 구성, 소득분배, 자원분배 등은 종속을 계속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주장은, '저개발의 악순환'과 제국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산업사회의 급속한 자본축적을 위해 발전도상국의 빈곤을 영구화시키고 증대시키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참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이론가들의 견해와 밀접하다. 이제 그런 이론들을 고찰해보기로 하자.
3. 제국주의의 산물로서의 저개발
최근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문헌에 나타난 일반적인 특징인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레닌주의적 개념의 부활은 현대의 마르크스주의적 신식민주의 이론과 저개발 이론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된다. 이 이론들은 서구의 근대화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응물로 간주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국주의는 세계의 저개발지역에 대한 거대 독점체 - 물론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여 - 의 통제와 같게 된다. 이 이론가들에게는 독점체가 주변부에서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불균등한 경제적 우월성이라는 비공식적이나 효율적인 무기에 주로 의존하는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들은 제국주의가 이제는 수세적인 위치에 몰려 있다는 것을 때때로 인정하면서도, 제3세계가 식민제국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 당시에 못지않게 독점자본주의에 의해 철저히 착취당해 왔다는 견해를 매우 강조하는데, 흔히는 그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인 듯 주장하기도 한다.
이 이론의 정치적 기원은 명백하다. 주지하듯, 공식적인 소련의 정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의 국가들은, 정식으로 정치적 독립을 승인받은 뒤에도 계속된 전식민지들과의 경제적 연관과 '개발원조' 체제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적 굴레에 불과하며 비공식적인 수단에 의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엔크루마 Kwame Nkrumah는 이것을 '신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최후단계'라는 간결한 공식으로 서술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신식민주의는 '불균등한' 무역관계, 수혜국에 불리한 조건의 자본수출, 무역조건의 인위적 조작, 개발원조 등에 의해 저개발 지역의 민중들을 간접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백인 자본가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주변부의 - 공식적으로는 독립된 - 괴뢰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괴뢰 정부의 도움과 함께 비로소 제국주의는 그 지역을 통제할 수 있었다. 엔크루마는 신식민주의는 제3세계에서 제휴 정권의 부실 경영에 대하여 어떤 대응수단도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제국주의의 최악의 형태라고 서술했다.
신식민주의는 그것을 실험하는 자들에게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개선없는 착취를 의미한다. 낡은 형태의 식민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 권력은 적어도 본국에서는 해외 식민지 획득행위를 설명하고 정당화시켜야만 했다. 식민지에서 지배적인 제국주의 권력에 봉사했던 자들은 반대자들의 폭력적 움직임에 보호책을 찾을 수 있었다. 신식민주의에서는 둘 중 어느 경우도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제국주의 시기에 형성되었던 사회경제구조는 공식적인 식민지 지배가 종결된 후에도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종의 정치적 감시로부터도 면제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전의 식민지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일방적 경제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밖에 엔크루마는 해외사업가들은 제3세계 국가의 근대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가로막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1950년대에 엔크루마는 신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식민주의'를 비판한, 제3세계의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가 유일한 인물은 결코 아니었다. 그의 견해는 수많은 아프리카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서구의 동조자들에게 반향을 일으켜, 서로 강조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저개발을 주제로 하는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저서를 통해 끈덕지다고 할 만큼 한결같이 되풀이하여 나타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국주의가 미친 사회심리학적 영향과, 그 결과 前식민지 민중의 정신구조가 영원히 왜곡되었음을 강조하는 이론가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의 저개발이 식민지와 이전 종주국 사이의 계속되는 종속관계와 제국주의에서 직접, 간접으로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이론가들이 있다. 이 둘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첫 번째 견해가 전형적으로 표출된 것은 프란츠 파농 Frantz Fanon의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The Wretched of the Earth"이다. 파농은 제국주의가 이전의 식민지 민중, 특히 그 지도자들에게 백인의 보호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도록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식민사에서 몇가지 예를 뽑아 식민지 통치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후에도 식민지 민중들이 민족적 동일성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었다. 이런 사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는 수 세기 동안의 정신적, 문화적 '자기소외'의 시대에 생겨난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일격에 끊어버리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前식민지인들의 격렬한 투쟁을 주창하였다. 파농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식민지인들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명확한 문화적 표현이다." 그는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제국주의 이전의 민족문화가 쉽사리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전통과 맞닿아 있는 새로운 민족의식을 창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 그것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유를 위한 투쟁은 민족문화를 그 이전의 가치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니다. 이 투쟁은 근본적으로 다른 일련의 인간관계를 지향하며, 민중문화의 형식이나 내용을 본래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 그러나 아프리카, 아시아의 참된 민족독립국가를 창조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 하에서조차 심각한 심리적 손상이 식민지 민중, 특히 지도자 집단에 작용할 것이므로, 유럽적 모델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파농은 과거의 제국주의가 공식적인 식민주의의 종결 이후에도 오랫동안 제3세계 신생국의 미래에 그늘을 드리웠다고 주장한다.
서구의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영향에 관하여, 공식적 제국주의 지배가 종식된 이후에도 제국주의적 지배는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구조 그 자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바란 Paul A. Baran은 1957년에 간행된 "성장의 정치경제학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에서 식민지 지배가 종식된 이후에도 제3세계에 대한 착취는 줄지 않고, 새로운 차원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속되어 왔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현대적 형태의 제국주의는......그 지배대상으로부터 광범위하고 산발적인 이득을 신속히 수탈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또 다소 시기를 연장하여 그러한 이득의 유입량을 확실히 보장하는 데만 만족하지도 않는다. 제국주의는 긴밀히 조직되고 합리적으로 통제되는 독점적 기업에 의해 추진되며, 지배 대상에 영속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유입물의 유량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즉, 바란에 의하면 저개발국은 점점 더 독점자본의 이익에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 제3세계에서 공식적인 식민지 지배가 종식된 이후에도 전영토가 외국 자본과 이해를 같이하는 '매판정부'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 사실에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외자에 의한 저개발국의 원료 착취와, 이런 나라들에 낭비성이 심하고 부패한 반동 매판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긴밀하게 상호연관되어 있는 측면으로서, 제국주의의 총체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바란은 주변부에서 형성된 사회 경제적 구조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승인받은 뒤에조차 중심부에 기반을 둔 독점자본의 이익에 지속적인 토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조건하에서 간신히 얻은 정치적 독립은 허위에 불과하게 되며, 새로운 지배집단은 구지배집단과 합류하고 제국주의적 이익의 비호를 받는 유산 계급들이 연합하여 전권력을 참다운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찾으려는 민중운동을 압박하는 데 사용한다."
바란의 견해에 의하면, 식민지 시기가 종식된 뒤에도 계속되는 제국주의적 종속은 무엇보다도 주변부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구조를 중심부 열강의 이익과 합치하도록 재생산함으로써 확실해진다. 이것이 개발도상국의 만성적인 경제적인 후진성의 주요한 원인이다. 유럽 독점자본주의의 우선적인 관심은 "저개발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연시키고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란은 현체제의 비합리성은 "그 토대인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경하게 표현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궁핍화 증대와 산업독점가에 의한 자본축적 사이의 대조는 프랭크 Andre Gunder Frank, 잘레 Pierre Jalee, 엠마뉴엘 A. Emmanuel, 아민 Samir Amin, 팔루아 Christian Palloix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 프랭크는 주로 라틴아메리카에 대해서 쓰고 있으며, 그밖의 학자들의 주장은 이전의 프랑스 식민지에서의 경험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프랭크는 제국주의를 특히 미국과 같은 중심부 독점자본의 제3세계 국가에 대한 경제적 침투의 결정적인 최후단계라고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자본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평화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다. 즉,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침투 지역의 경제, 정치 제도를 자본주의 체제와 묶어 놓는 것이다. 흔히 토착 정부 혹은 토착 부르조아는 여기에 협조하게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 "신제국주의와 독점자본주의적 발달은 전체 부르조아 계급을......제국주의적인 중심부", 즉 이경우에는 미국과 "보다 밀접한 경제적, 정치적 동맹을 맺고 의존하도록 만든다."
물론 이런 분석도 라틴 아메리카가 해외 독점자본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독자적으로 근대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국주의 이전의 상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깔려 있다. 또한 거기에는 독점 자본주의가 중심국가에 이익을 안겨주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원료를 착위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자하고 거대독점을 형성시킴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후진성을 영구화시킬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악화시킨다는 고발이 담겨져 있다. 자본주의는 단일경작을 기반으로 하는 원료생산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투자에서 순이익을 계속 뽑아냄으로써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독자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광범한 대중은 더욱 궁핍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 체제는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의 경제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것은 근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저개발'을 창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프랭크에 따르면, 이런 저개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회주의 혁명이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든 라틴아메리카 들의 의무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이러한 이론들은 확실히 상당한 윤리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타당성에 관해서는 견해 차이의 여지가 있다. 우선은 이러한 이론들이 식민지 이전의 상태에 대한 이상화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것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힐난 이상의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프랭크의 제국주의에 대한 정의는 동어반복적이다. 그는 그 용어를 국제 자본주의 체제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즉, 주변부에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형성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부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의 중심부에 봉사할 때라야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 투하된 자본의 국제화는 이른바 라틴 아메리카 경제의 제국주의적이고 신식민지적 성격을 입증해 주는 증거로서는 충분치 못하다. 특히 비공식적인 경제침투에 대해 유럽자본과 그 뒤를 이은 미국자본의 직접적인 정치적 지원은 사실 극히 제한된 범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 자본가의 이익이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근대화를 교묘하게 방해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고 해서 그러한 증거의 불충분이 보완되지는 않는다.
엠마뉴엘, 잘레, 아민 등 '종속'학파의 이론가들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내재적 구조가 제3세계의 근대화와 대립되며,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후진성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하는 데 전념하였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주제가 두드러진다. 첫째는 '불평등한 무역', 즉 산업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각기 수출하는 상품 가격이 불평등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특히 제3세계의 시장에서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다. 그리하여 엠마뉴엘은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교역 조건의 술책은 원료 수출국이 공신품 수출국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제 체제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중심부 국가에 유리한 국제 조직의 조작 탓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
잘레는 '제국주의의 최후의 단계'의 중요한 특징은 "제3세계 경제가 제국주의 체제의 경제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종속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첫째로 거대한 사적 자본 투자에 의해서 제3세계에서 거대한 잉여의 수탈을 가능케 한다. 둘째로 공공의 '개발 원조'에 의해서 저개발 국가의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메꾸어 줌으로써 이러한 일방적 체제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셋째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연결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변부의 사회집단의 영향에 의해서이다. 특히 팔루와는 국제적 분업체계가 개발도상국에 불리하게 산업의 재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국가가 장래성 있는 산업에 진력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성장의 전망이 거의 없고 기술적 수준이 보다 낮은 생산부문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은 둘 사이의 경제적 간격을 영구화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종속'이론의 이러한 측면에 동조하여 아민과 셍하스 Dieter Senghaas는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의 근대적 변형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주변부 자본주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정식화했으나 일관되게 전개시키지는 못했던 해석을 여러모로 따르고 있다. 아민과 셍하스는 주변부에서 발생한 사실은 대체로 근대 제국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지역경제가 세계경제에 부분적으로 연루된 데 불과하며,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구조의 형성을 저해하였다는 사실에 제3세계의 저개발의 원인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국제체제의 이러한 통합 형태는 문제가 되는 저개발국의 요구보다는 중심국의 요구에 부응한 고도의 특화에 특징이 있다. 공식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국가들은 한결같이, 종속되고 지배당하는 주변부 국가에는 불리하고 지배하는 중심부에는 유리한 국제적 분업체계에 좋든 싫든 편입되어 있다. 이것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시대에 제3세계의 경제가 중심부 경제와 통합이 강요되고, 주변부 국가에서 중심부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것과 관련된 정책의 직접적 결과이다. 게다가 '분할하여 정복하는' 제국주의적 정책은 제3세계 국가가 이런 경향에 저항하기 위해 결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도록 작용했다. 그들에게 부과되었던 문화, 정치, 특히 경제의 구조는 대다수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여 독립적인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장애가 되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처음에 선발 산업국가에 종속되었다가 이후에 '자율적인 발전'을 성취했다. 그런데 제3세계 국가의 국제자본주의 체제로의 불평등한 통합은 이와 같은 '자율적인 발전'의 길을 가로막았다. 셍하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자율적인 발전은 본래 자체의 재생산능력을 가지며 종속적인 사회경제적 실체에 의해서는 달성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분업의 기초 위에 선 세계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그러한 종속적인 사회경제적 실체의 통합은 종속되고 변형된 재생산체제(단일경작, 역동적인 경제부문의 외부지향, 주변화 등)로 고통을 당하여 왔다.
이 학파에 의하면, 주변부 자본주의는 외부적 이익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산업화 이전의 재생산 형태와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나 특수한 부문에 국한된 산업과의 공존으로 특징지워진다. 다시 말하여 극도의 빈곤이 대규모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대한 부의 교두보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시대에 행해졌던 제국주의적 침투의 논리적 귀결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심지어 중심부 국가의 정치적 지배가 종식된 뒤에도 종속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침투 기간 동안에 확립된 비공식적 통제수단은 계속하여 작용하였다. 여기에서 형성된 사회경제구조는 그러한 종속성의 탈피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리하여 주변부 국가의 저개발을 영속화시켰다.
위에서 논의된 여러 이론들은 공식적인 제국주의 지배가 종식된 뒤에도 종속관계를 영속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논자에 따라 중요하다고 드는 요인은 각기 다르다. 바란은 자본주의적 중심부의 사회경제 구조가 주변부에서 재생산되는 것을 강조한다. 엠마뉴엘, 잘레, 바란은 결정적 요인을 제3세계 국가와 선진 산업국가 사이의 불균형적인 경제관계에서 찾고 있다. 아민과 셍하스는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는 역동적인 사업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이러한 '종속' 구조가 본질적으로 국제 자본주의체제의 고유한 메카니즘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매우 커서 일단 주변부에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고 중심부 지배집단과 주변부 지배집단 사이의 밀접한 경제적 연결로 다져지면,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적 지배는 제국주의적 지배에 없어서는 안될 필요조건이지는 않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치적 강제수단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그대신 "구조적 폭력을 기반으로 한 종속적 재생산"이 보편적인 현상이 된다. 이런 논의는 다국적 기업의 점증하는 힘에 대한 언급으로 보안된다. 다국적 기업은 정책 - 자본 투자, 범세계적 분업에 기초한 가격고정과 생산 - 과 교묘하게 결합하여 제3세계 국가의 경제를 거의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 잘레와 오코너 O'Connor(그리고 맥도프)가 주장했듯이 대개 미국에 기반을 둔 이런 형태의 새로운 독점자본 조직의 발전은 새로운 '국제적 계급'을 형성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초제국주의'를 창출해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이 효율적인 개발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혹은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의 기능에 관한 동어반복적 진술 이상의 얼마나 크나큰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이 이론들 자체에 따르면, 제국주의 지배를 행하는 것은 익명의 실체가 되었고 더 이상 해명을 요구할 수도 없다. 예컨대 오코너는 '경제적 제국주의'를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나 지역을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것, 특히 위성국의 경제를 희생시켜가면서 토착 경제 자원을 중심부에 유리하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주목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점차로 민족적 성격을 상실하고, 그리하여 일국이 경제적 수단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의미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게다가 실제 다국적 기업의 행위가 언제나 제3세계 국가에 유해한가라는 당연한 질문도 나옴직 하다.
현상황의 문제점은 오히려 반대로 국제자본이 점차로 이런 나라들을 소흘히 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에게 거대 산업국가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더 적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데 있다. 생산양식을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시킨다고 해도 산업국가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 잠재력이 불균형한 것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다. 기존의 사회주의 사회들이 보여주고 있듯, 그들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제국주의적 착취의 기술에서 서구의 경쟁국들에 못지 않게 능수능란하다. 그리하여 저개발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4. 구조적 폭력에 기반을 둔 종속으로서의 제국주의
조안 갈퉁 Johan Galtung은 최근에 이러한 신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사회주의국가들까지 '초제국주의'의 주체와 객체로서 다루면서 공식적인 제국주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주목할 만한 시도를 하였다. 공식적 제국주의 이론은 대체로 제국주의의 실제적인 역사적 표출을 무시하고 제국주의를 "한 조직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지배하는 특수형태"로 정의한다. 갈퉁은 '주변부 학파'의 생각에 의존하여, 제국주의 지배를 복잡한 매카니즘의 결과로서 중심국과 주변국 사이에 생겨나는 구조적 종속의 형태로서 기술하고 있는데, 그 주된 특징은 중심부가 중심부의 지배계급과 매우 흡사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기존질서를 보존하는 데서 이익을 보게 되는 토착 지배계급과의 제휴형태로서 중심부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적 종속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 차이에서 기인하게 되는데, 그 차이는 중심부에서보다 주변부에서 더 크고 중심부에 이롭게 작용한다. 제국주의의 잉여이윤에 매수된 노동귀족계급이라는 레닌의 관념은 여기에서 주변부의 상황에 적용된다.
이 이론에서 식민지 시대에 비롯된 주변부 국가와 중심부 국가 사이의 봉건적 상호작용은 불평등한 무역구조로의 경향을 심화시키는데, 그런 경향은 주변부가 국제시장에서 대체로 원료수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봉건적 관계는 중심국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엘리트들에게 결정적인 이득을 준다. 그리하여 '구조적 종속'의 형태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완전하다면 정치적, 군사적 지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불완전한 제국주의만이 무장한 군대를 필요로 한다. 전문적인 제국주의는 직접적인 강제가 아닌 구조적 폭력에 의존한다."
의례화된 논의이기는 하지만, 갈퉁은 제국주의 지배가 상대적으로 민주적 구조를 가진 중심부 국가와 비교하여 다수 권위주의적인 주변부의 지배유형의 재생산에 기초해 있다고 결론지운다. 이 해석이 유럽이나 제3세계의 실제적인 역사과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주변부에서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의 과정은 '개발 독재' 체제와 결부되어 진행되며, 거기에 중심부 국가들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퉁은 이처럼 불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적 종속의 모델을 현재의 상황이라는 관점에 따라 분화시켰다. 즉 한편으로는 다섯 가지 제국주의 형태 - 경제적 제국주의, 정치적 제국주의, 군사적 제국주의, 문화적 제국주의, '커뮤니케이션 제국주의 communications imperialism' - 를 구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속의 유형을 세련화하여 매개국이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 이리하여 그 모델은 다국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실제적인 적용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나아졌다고만은 할 수 없다. 예컨대 프랑스나 서독은 세계의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과 같은 중심부 제국주의 국가의 매개국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은 고도의 추상성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종속의 매카니즘에 관하여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가정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 갈퉁은 약간 대담하게 오늘날의 국제 조직이 과거에는 공식적인 식민지 지배로 보장되었던 중심국과 주변국 사이의 '불공평한 상호 작용'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엔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서구는 국제적 광장에서 제3세계의 다수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불공평한 상호작용 구조에 의해 생겨났던 '나선효과 spin-off effects'가 모든 경우 산업국가에 틀림없이 유리하다는 갈퉁의이론은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석유와 같은 원료의 생산에 관한 최근의 성과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여튼 서구가 '구조적 폭력'에 의해 모든 상황 속에서 제3세계에 불리한 교역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여기에 서술된 형태의 이론들은 대체로 제국주의의 역사적 표출형태를 무시하고 순전히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띤 공허한 공식이 되어버릴 위험에 빠져있다는 사실로 고민하고 있다. 우리가 보아왔듯 연재 세계 경제의 실제 구조상에 어떤 변동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이론들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들은 오늘날의 국제 질서, 즉 산업국가와 제3세계의 관계에서 가장 아픈 곳의 하나를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 이론들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근대 산업체제의 보편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대부분이 아직도 후진적인 이유를 찾아내는 데 몰두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자,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모두가 똑같이 경솔하게 받아들여 왔던 가정, 즉 시간이 주어진다면 서구 산업주의에 고유한 역동성은 제3세계 국가들을 서구 진영으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자기 만족적인 확신을 혼란시키는 데 한몫을 하였다. 이처럼 저개발 이론가들은 우리가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확대된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하는 눈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국제경제체제의 막연한 자기 규제력에 의존하거나 흔히 구제책이 없다고 가정해 버리고 마는 대신에, 서구 국가로 하여금 당면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할 수 있다면 말이다.
제6장 요약과 전망
근대의 제국주의 이론은 19세기 말에 처음 나타났다. 근대의 제국주의 이론들에 대한 앞의 개괄은 다양한 견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특수한 정치적 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주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어떤 경우 그것들은 서로 쉽게 결합되어서 제국주의적 현상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분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양립할 수 없고 조화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다. 고전적인 형태의 공식적 제국주의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오늘날,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에 관한 부르조아적 연구나 마르크스주의자의 연구 모두에는 주목할 만한 연속성을 볼 수 있다. 제국주의를 해석하는 데 있을 수 있는 광범한 여러 경향들은 홉슨, 힐퍼딩, 슘페터, 레닌 등과 같은 고전적 이론가들에 의해 기초가 놓아졌다. 이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 상황의 전개와 최근의 성과를 참작하여 보다 분화된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전념하였다. 최근의 영국에서의 연구는 새롭고 중요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그것은 한편으로 '비공식적 제국주의'라는 관념을 발전시킴으로써 탐구의 범위 일반을 확대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 '주변부'의 독자적인 역할, 특히 제국주의적 팽창의 성격, 시기, 방향과 깊은 관계를 가졌던 토착 지배계급을 부각시켰다.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은 지나치게 유럽중심적이고 전체 현상을 단일한 요인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유용성을 거의 상실하였다. 소위 주변부의 위기가 비공식적인 유럽침투의 결과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변부에 정당한 비중을 두는 근대적 이론은,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동어반복에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3세계의 저개발 현상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제국주의적 과정이 대체로 '현지에 있는 백인들'과 함께 유럽사회의 주변집단에 의해 촉진되었다는 '객관주의적' 논의는 제국주의가 산업국가의 정책이나 경제구조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는 '내생적' 형태의 이론을 고찰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오랜동안 불신되어 왔던 정치적 제국주의론이 주로 사회학적, 사회 경제적 설명과 결합하여 어느 정도 '복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에는 확실히 '당국자 정신'이 그전처럼 섣불리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제국주의 팽창의 자기 추진 과정을 통제하기에 무력하였던 것이 정치가들의 실상이었다. 제국주의 팽창은 다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시작되었다가 점차 정치가들의 희망과는 대립하여 공식적인 권력의 사용을 요구하였다.
고전적인 경제적 제국주의 이론들은 마르크스주의적이건 부르조아적이건 대부분의 매력을 잃어버렸다. 홉슨이 처음 제기하고 그 뒤 레닌이 자기 이론의 기반으로 답변확정했던 강제적 자본수출의 교의는 이제 전적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힐퍼딩의 이론적 기반이자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의 초석인 금융 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연관에 대한 주장도 전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다. 실제로 중심부의 주요 산업에 의해 촉진되었던 해외투자와 금융제국주의는 항상 제휴하여 작용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 둘의 동일시를 고집한다. 그러나 현대의 연구를 통해서 자유무역 제국주의의 반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슘페터의 믿음 또한 반박되었다.
그 주제에 대한 현재의 연구상태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이론 형태는 전통적 공식을 다소 근대화된 형태로 이데올로기적인 외관만 약간 변형한 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단일한 요인으로 환원시키려 하지 않는 최근의 연구에 의하여 밝혀진 다양한 측면들을 참작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것은 제국주의 지배의 다양함 - 공식적 제국주의 지배, 비공식적 제국주의 지배, 식민지 지배, 기타 - 에 못지 않게 내생적 요인과 주변부 요인의 상호 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의 신마르크스주의 이론과 급진적 자유주의 경향의 논리처럼 불균등하게 발전된 국가 사이의 경제 관계가 단지 국제 시장의 지배에 순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관계를 제국주의적인 것으로서 낙인찍는 대신에, 그러한 관계를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간주하게끔 하는 정치적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러한 모든 관계를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매도해버리는 半공식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경우처럼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복합적인 제국주의적 과정을 분석하는 학문적 방법으로서는 거의 가치가 없다. 즉, 그것은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한편, 새로운 이론은 서구 세계에서 흔히 그렇듯이 제국주의를 과거의 것으로 간주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국주의가 이 세계에 미친 여파, 즉 빈국과 부국 사이의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혼란스런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오늘날에는 그 부담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났지만, 유럽 열강은 공식적인 식민지 지배의 시기에 주변부의 발전을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책임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과제를 심지어 동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부에서의 그러한 발전이 어느 정도나 공식적인 제국주의의 시기에 뿌리박고 있으며, 식민주의가 종식된 뒤에도 잔존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종속의 형태들이 제3세계 여러 지역의 '저개발의 개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근대의 제국주의 이론은 어느 것이나 국제자본주의 체제가 잠재적이건 노골적이건 제국주의적 경향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혹은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은 노골적으로 제국주의적인지 하는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산업국가와 개발 도상국 사이의 경제 성장의 거대한 불균형은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에 대한 모든 공식적인 책임을 청산한 이후에야 더욱 극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처럼 보인다. 몇몇 주요 원료산지는 그렇다 치고 자본주의 국가가 투자 계획에서 제3세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분명히 제3세계보다는 자본주의 국가 자신들에게 훨씬 덜 해롭다. 여러 이론가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들이 아직도 해외 지역을 자본주의의 존속에 필수적인 것으로서는 물론 이윤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3세계의 참된 문제는 생산수단이 공식적으로 사유화되어 있는 국가독점관료계급에 의해 통제되고 있든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제3세계와 산업국가 사이의 불평등한 경제관계를 효율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적절한 세계적 매카니즘이 없다는 데에 있다.
이 시점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즉 애초부터 부르조아 학자나 마르크스주의 학자 모두가 받아들였던, 팽창주의적 기회가 자본주의 존속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다. 사실 근대세계의 문제들은 팽창이 자본주의의 존속에 필수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 사적 자본이 제3세계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것은 산업 경영자들이 산업 플랜트 입지를 선택할 때 주변부의 경제적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이 무엇이든, 연구자의 역사적 분석은 19세기와 20세기 초기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다각적인 국제 경제체제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제국주의는 일차적으로 경제, 군사, 정치의 분야에서 유럽 사회의 과잉 에너지의 결과이다. 즉, 그것은 사회경제체제에 내재해 있던 필연성이 아니었다. 서구산업사회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대단히 우월하였기 때문에 손쉽게 제국적 팽창을 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가속화될 수 있었다. 더구나 실질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산업국가 내부의 사회적 과정, 특히 근대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전통적 엘리트의 투쟁은 제국주의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사실 전성기의 제국주의는 단순히 전통적 유럽 지배계급의 정책에 한정시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주로 성장하는 부르조아에 원인이 있었다.
물론 특수한 경제적 이익이 여러 가지 제국주의적 사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로 대중들은 장래에 해외 영토에서 파생될 경제적 이득에 대해 실제 이상으로 지나치게 기대하였다. 또한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체제의 성장 위기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보는 것도 지지하기 어렵다. 즉, 중심부 경제의 수출 부문은 제국주의에 충분한 비중을 둔 것도 아니었고, 식민지 시장이 국내 경제체제에 비견될 정도로 큰 것도 아니었다. 어떻든 이런 종류의 이론은 주변부로부터의 충격이 행한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다. 마찬가지로 경험적 관찰에 의하면, 제국주의를 '이윤율 저하의 법칙'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이론들도 지지할 수 없다. 투자가들이 이 법칙의 작용을 피하고자 식민지, 반식민지 지역에 자본을 투자하려고 서로 경쟁했다는 주장은 기껏해야 상대적인 의미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해외자본투자는 무엇보다도 우선 순수하게 투기적인 성격이었던 것이다. 투자가들은 대개 독점적 특권이나 별도의 시장 이권을 누리며,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훨씬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계획이나 사업을 편애하였다. 이것은 보통 중심부의 자본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추구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업국가에 의한 해외투자의 거대한 증가는 이러한 투자가 저개발국가로 보내지는 한, 주로 저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재투자로 구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의 이윤율 경향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경향이 장기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한, 해외 영토는 이윤율 저하 경향을 크게 완화시키지 못하였다. 대체로 '자본의 과잉'이 특정한 제국주의적 작용, 특히 공식적인 제국주의에 박차를 가한 흔적은 거의 없다. 그와는 반대로 제국주의적 팽창의 수행자들은 여분의 자본을 충분히 가진 투자가들이 해외 사업에 그 자본을 기탁하도록 설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식민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 투자에 참가하기를 열망하였던 국가들은 금융자본, 즉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밀접한 결합이 기껏해야 초기 단계에 있던 나라들이었다. 대체로 제국주의적 정책에 기여했던 이권의 상호작용은 고도로 복합적이었고 중심부 국가에서나 식민지, 반식민지에서나 특정 사회집단과 분명히 연결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전세계에 걸친 서구 산업열강의 제국주의적 팽창은 결코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었으며 많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 세계의 조건을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이 중요한 역사적 단계의 해석을 가능케 할 이론적 모델을 추구하는 것은 학자들의 과제로 남아 있다.
옮긴이 후기
반식민, 식민으로 점철된 우리의 근대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이론적 인식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세계자본주의와의 구조적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보편화되면서 '신제국주의', '신식민주의' 등의 용어가 흔히 통용되고 있다. 근래에 쏟아지고 있는 다수의 제국주의 관계 서적들이 이러한 사정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책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어느 정도 심화시켜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이론이란 것이 그렇듯이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라난 역사적 토양과 이데올로기적인 계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러한 인식이 결여될 때 어떤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우리의 현실에 대한 그것의 적용도 교조주의적인 오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이론의 경우도 사정은 동일하다. 적지 않은 수의 제국주의 이론서들이 소개되었지만 이들 각각의 제국주의론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비판적인 수용 자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제국주의란 개념의 실체 그 자체가 유령화되어 버릴 뿐 아니라 제국주의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가로막을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터이다. 말하자면 다양한 흐름의 제국주의 이론들에 대한 일종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역자가 천학비재함을 무릅쓰고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몸젠 Wolfgang J. Mommsen의 Theories of Imperialism(Weidenfeld & Nicolson; London, 1980)을 완역한 것이다. 저자인 몸젠 교수는 현재 런던에 있는 독일 역사 연구소 German History Institute의 소장으로 재직중이며 19, 20세기의 유럽 정치사에 관한 저서와 논문을 다수 발표한 바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한 흐름의 제국주의 이론들을 각각의 논리구조에 따라 요령있게 분석, 정리함으로써 제국주의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길잡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아울러 그는 각각의 제국주의론이 지닌 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현대적 의의에 대한 평가도 잊지 않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저자 자신의 비판적 평가에 동의하든 않든 제국주의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섭취하는데 유용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제국주의 이론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이 거의 없는 역자로서는 무지에서 비롯된 오역이 적지 않으리라는 점을 미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질정을 바랄 뿐이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여러 벗들과 선배, 그리고 돌베개의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1983. 10.
백 영 미
출처 : [기타] http://muruu.net/muruu_text/Imperialism.htm